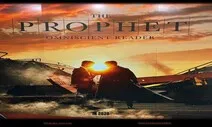우리는 모두 로미오와 줄리엣이다
몬터규 집안과 캐풀렛 집안의 대대로 이어진 원한 관계 속에 탄생한 사랑이야기, <로미오와 줄리엣>. 이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비극 중에서도 현대 세계에서 가장 잘 받아들여지는 주제를 담고 있다. 바로 젊은이들의 금지된 사랑과 사회에 의한 그들의 희생이다. 이념이나 민족 감정, 경제적 이권들, 서로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해 현대 사회는 분열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을 뚫고 솟아나는 사랑의 감정은 그 모든 불화의 무용성을 지적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이다.
우리 사회와 역사가 간직한 풀지 못하는 비극성을 연극 안에서 풀어보려는 작업을 집요하게 펼쳐온 노장 연출가 오태석이 각색·연출한 <로미오와 줄리엣> 역시 그런 의미에서 현대성을 지닌 작품이다. 대립하는 두 집안의 긴 검무 뒤에 영주가 내지르는 이 작품의 첫마디는 이렇다. “또 쌈질이야. 너 짐승 같은 인간들아. 피에 굶주린 그 손에서 당장 그 흉측한 흉기를 내던지고 성난 주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검무와 함께 시작한 공연은 칼바람이 불고 무대 위의 사람들이 모두 쓰러질 때까지 계속된다. 물 흐르듯 이어지는 장면들은 음악과 춤, 리듬과 말로 연결되고 끝내 죽음의 춤으로 마감되는 것이다. 그 사이사이를 스쳐 지나가는 의미심장한 대사들! “도덕도 남용하면 악이 되고/ 악도 활용만 잘하면 도덕이 되지요”, “법이 자네 밥 멕여 주던가. 법 그거 자네 해당 아녀.” 셰익스피어 식의 촌철살인을 우리 어법으로 축약한 대사들이 부담 없이 관객의 귀에 꽂히고 더러는 객석의 추임새를 얻어내기도 한다.
현대 연극이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강한 음악성이다. 문명 세계, 디지털 세계에서 원초적인 몸의 리듬은 우리가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부분이고 현장 예술인 연극은 이것을 관객에게 되돌려준다. 하나의 연극 공연 전체가 강약을 갖는 음악적 체험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굿 또는 제의라 할 수도 있다. 모두 함께 경험하는 약간의 흥분 상태, 그리고 그 속의 은유와 반추들.
이 작품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도 마찬가지다. 배우들은 노래하지 않지만 그들의 대사는 노래처럼 흐르고 그들의 집단적 춤사위는 사건의 결에 뉘앙스를 부여한다. 그 속에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이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작품의 로미오와 줄리엣에겐 이름이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저 가끔씩 꽁지머리 총각, 갈머리집 처녀라 불린다. 이건 무슨 뜻인가? 그건 이 연극의 주인공들이 선택받은 인물들이 아니라 우리 옆집 처녀 총각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보다 더 비극적인 것이 끝내 몰살 당하는 이 마을 사람들의 운명이다. 마치 작가가 이렇게 외치는 것 같다. “우린 모두 공동운명체가 아닌가!”
전통 한복을 기조로 한 이승무(의상디자이너)의 아름다운 의상, 오랜 연습으로 다져진 배우들의 앙상블과 여유가 이 공연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 무대 양편에 자리잡은 조각보를 변형시킨 색색 고운 천들, 무대를 가득 채운 해사한 젊은 처녀들의 웃음이 잔상처럼 남는다. 19일까지 극장 아룽구지.
노이정/연극평론가 voiver@hanmail.net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