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블러디 선데이>(2002)
[토요판] 김세윤의 재미핥기
“패트릭 조셉 도허티, 31세. 제라드 빈센트 도너히, 17세. 존 프랜시스 더디, 17세. 휴 파이어스 길모어, 17세. …(이하 생략)”
희생자 열세 명의 이름을 차례로 읽어 내려가는 시민운동가의 떨리는 목소리. 영화 <블러디 선데이>(2002·사진)의 마지막 장면이다. 이름이 불리는 사이사이에, 감독은 이른바 ‘피의 일요일’(bloody Sunday) 사건 후일담을 자막으로 집어넣는다. “영국군이 총을 쏜 건 정당했다”는 영국 재판부의 판단, 총을 쏜 군인 가운데 처벌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 심지어 총을 쏘라고 명령한 장교에게 여왕이 훈장까지 수여했다는 이야기 등이 열세 명의 이름과 이름 사이, 열세 번의 호명과 호명 사이를 채운다. 1972년 1월30일 일요일. 평화 시위에 나선 북아일랜드 데리시 주민들을 향해 영국군이 무차별 총격을 가한 만행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아일랜드 사람이 아니어도 누구든 피가 끓고 주먹을 불끈 쥐게 되는 라스트 신이다.
“자, 이제부터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필” “네” “이흥기” “네” “윤재호” “네” “박병호” “네” “최원재” “네”….
영화 <변호인>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이름이 불리고 있었다.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선 주인공 송우석(송강호)과 함께하려고 모인 변호사, 아니 ‘변호인’들의 이름이다. <블러디 선데이>의 마지막 장면과 달리 <변호인>의 라스트 신에 넣은 자막은 단 한 줄뿐. 하지만 그 짧은 한 줄이 남긴 여운은 결코 짧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는 부산 지역 변호사 142명 중 99명이 출석했다.”
누가 나에게 <변호인>의 최고 명대사를 꼽으라면 주저없이 대답할 수 있다. 그건 바로 그날의 법정에서 끝도 없이 이어지던 ‘네’라는 한 음절이라고. “할게요. 변호인 하겠습니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바위는 아무리 강해도 죽은 기고, 계란은 아무리 약해도 산 기라, 언젠가는 계란이 바위를 살아서 넘을 기다.” 이 근사한 명대사들 틈에서 ‘네’라는 건 너무 짧고 흔한 말일지 모른다. 하지만 힘주어 ‘네’라고 답하는 게 만만치 않던 시절에 울려퍼진 아흔아홉 번의 ‘네’는 절대 흔해 빠진 말일 수 없다.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결국 그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이름이 불렸는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니오’라고 소리치는 게 죄가 되는 시대. 그렇게 죄인이 되어 혼자 외롭게 앉아 있던 법정. 그 죄인과 함께 자신의 이름이 나란히 불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은 아흔아홉 명. “삶의 의미는 인간이 묻는 것이 아니다. 삶이 우리에게 묻는 것이다. 이 질문에 답하려는 몸부림이, 내가 생각하는 의미있는 삶이다.” 지난 12월7일치 <한겨레> 토요판 칼럼 ‘정희진의 어떤 메모’에서 밑줄 그어가며 외워둔 문장을 빌려 말하자면, 적어도 그날의 법정에서만큼은 제법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아흔아홉 명이다. 그들이 혀끝에 올린 ‘네’는 한 사람의 외로움을 그냥 그 한 사람만의 외로움으로 남겨두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네’였던 것이다.
하지만 <블러디 선데이>의 열세 명은 끝내 ‘네’라고 답할 수 없었다. 자신의 이름을 호명하는데도 응답할 수 없었다. 그들이라고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이 아닌데도 기쁘게 ‘네’라고 대답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이다. 계란이 바위를 살아서 넘는 그 ‘언젠가’의 시대를 살아보지 못하고, 남보다 먼저 바위에 부딪혀 산산이 깨지고 부서진 계란이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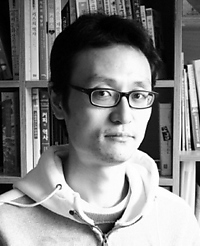 ‘어떤 삶’을 살았는지 증명하는 산 자의 이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증언하는 죽은 자의 이름도 있다. ‘존재’하는 자의 응답이 세상을 바꾸는가 하면, ‘부재’하는 자의 침묵이 시대를 짓누르기도 한다.
<변호인>에서 호명된 이름과 <블러디 선데이>에서 호명된 이름. 아흔아홉 번의 ‘응답’과 열세 번의 ‘침묵’. “안녕들 하십니까?”에 응답하는 1228명, 그리고 앞으로도 응답하지 못할 용산과 밀양과 쌍용의 31명. 지금, 극장에 울려퍼지는 ‘네’의 의미는, 우리가 영화에게 묻는 것이 아니다. 영화가 우리에게 묻는 것이다. 이 질문에 답하려는 몸부림이, 내가 생각하는 관객의 의미 있는 삶이다.
김세윤 방송작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증명하는 산 자의 이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 증언하는 죽은 자의 이름도 있다. ‘존재’하는 자의 응답이 세상을 바꾸는가 하면, ‘부재’하는 자의 침묵이 시대를 짓누르기도 한다.
<변호인>에서 호명된 이름과 <블러디 선데이>에서 호명된 이름. 아흔아홉 번의 ‘응답’과 열세 번의 ‘침묵’. “안녕들 하십니까?”에 응답하는 1228명, 그리고 앞으로도 응답하지 못할 용산과 밀양과 쌍용의 31명. 지금, 극장에 울려퍼지는 ‘네’의 의미는, 우리가 영화에게 묻는 것이 아니다. 영화가 우리에게 묻는 것이다. 이 질문에 답하려는 몸부림이, 내가 생각하는 관객의 의미 있는 삶이다.
김세윤 방송작가
김세윤 방송작가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