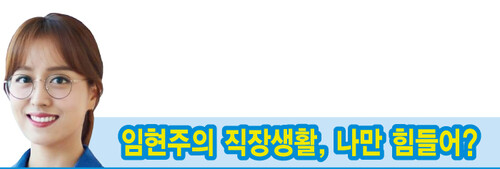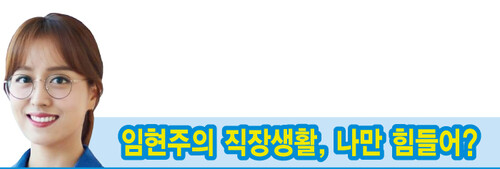‘아부를 못 해서 손해 보는 것 같다.’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지 않았는가. 아부는 적성에 안 맞는다며 아예 포기를 선언하거나 괜한 오해의 소지를 주지 않겠다며 칭찬을 건네는 데 외려 스스로 인색하다고 느낀 경우가 있진 않았는가. 하지만 표현에 인색해서 손해를 보는 건 결국 나 자신이다. 과거에 속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던 나는 직장에서 동료가 이룬 멋진 일이나 성과에 대해 왠지 쑥스러워서, 혹은 아부로 비추어질까 봐 말로 전달하지 않고 혼자 속으로만 감탄하고 격려하곤 했었다. 그런데 표현하지 않으면 누가 그 마음을 알까. 오히려 상대는 내가 전혀 관심이 없고 무심하다고 오해를 하기도 했다.
그렇게 표현에 인색하던 내가 서서히 변하게 된 것은 표현을 잘하는 동료들을 만나면서부터다. 헤어나 의상 스타일처럼 사소한 변화를 알아채고 표현해주는 동료가 고마웠고, 근심이 있을 때 무슨 일 있느냐고 물어봐 줄 때 감동을 받았다. 지나가다가 “그 방송이 참 좋았다”고 한마디 해줄 때는 덕분에 일의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 칭찬을 해주는 상대에 대한 호감이 자연스럽게 올라갔고 ‘나는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하며 상대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사람이 내게 아부를 한다고는 느껴지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그는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하는 칭찬에는 누구라도 수긍할 만한 객관성이 있어 신뢰가 갔다. 표현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서로 마음의 거리를 가깝게 하는구나, 하며 알게 될수록 표현을 지나치게 아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표현을 할 때, 내 기분까지 좋았다.
‘아부와 표현’이 무슨 차이인가 헷갈릴 때는 쇼핑 매장의 점원을 떠올려보자. 당신은 며칠 뒤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다. 오늘은 기필코 잘 어울리는 옷을 골라야 하는 날이다. 이때 옷을 갈아입고 나올 때마다 무조건 예쁘다고 칭찬해주는 점원을 만나면 물론 기분은 좋지만 왠지 신뢰가 떨어지고 물건을 팔려고 이러나 싶어 부담스럽다. 이런 점원은 직장생활에서 ‘아부형’ 사원에 가깝다. 내가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 기획에 단점은 하나도 말해주지 않고 무조건 내 말이 옳다고 하는 사람은 결정적으로 신뢰하기 힘들지 않은가.
반면 어떤 옷이 잘 어울리는지 구체적인 코멘트를 해주는 점원에겐 신뢰가 간다. 객관적인 격려와 칭찬을 잘 해주는 ‘표현형’ 사원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표현을 할 때도 주의할 것이 하나 있다. 세일즈를 잘하는 직원은 고객이 ‘내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까지 여기 있어야 돼?’ 하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별로인 옷의 단점에 대해 날것의 코멘트를 하지 않는다. 대신 더 잘 어울리는 옷이 왜 그런지를 설명하는 데 집중한다. 단점보다 장점을 전하는 데 포인트를 두는 것이다.
아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상대의 호감을 사기 위한 꼼수라면, 표현을 잘하는 것은 가랑비 옷 젖듯 잔잔한 호감을 사며 좋은 관계를 만드는 밑거름이다. 타고나게 능청스러워야 가능한 아부와 달리, 표현은 노력과 관심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런데 가끔 표현조차 조심스러운 경우가 있다. 가령, 이해관계가 없던 상대가 결정권을 가진 관리자가 되면서 ‘내가 하는 표현이나 칭찬이 이제 아부로 비치면 어쩌지?’ 하는 상황들 말이다. 이렇게 칭찬이 조심스러워질 때는 일에 대한 보고와 피드백을 잘하는 것만으로도 상사에게 ‘가까이하고 싶은 표현형 사원’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면 된다.
반면 아부형도 표현형도 아닌, 시큰둥형의 점원도 있다. 이들은 누가 들어오든 나가든 뚱한 얼굴을 하고, 고객이 옷을 입고 나와도 별 반응이 없다. 이럴 땐 괜히 불쾌한 마음이 들어 뒤도 안 돌아보고 매장을 나오게 된다. 나에게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 무심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고객의 요청에는 친절하게 답해주는 점원이길 기대한다. 사든지 말든지 하는 시큰둥한 태도와 기분 좋은 거리를 유지해주는 친절한 무심함에는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하자. 직장생활로 옮겨보면, 일할 의지가 없고 협조도 안 해주는 ‘시큰둥형’ 사원과 자신의 일을 조용히 하면서 협력에는 적극적인 ‘묵묵형’ 사원이라 할 수 있다. 상사든 동료든 어려워서 피하게 되는 타입은 ‘시큰둥형’ 사원이다.
이제부터 ‘나는 아부를 못 해. 그건 내 적성이 아니야’라고 단정하며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하지 말자. 표현과 아부가 명백히 다르다는 걸 기억하자. ‘아부를 해야 하나?’라는 잘못된 부담을 ‘누군가에게 어떤 변화가 있지?’ 하는 질문과 관심으로 바꿔보자. 말로 천 냥 빚을 갚는다면, 표현으로는 천 냥의 호감을 살 수 있는 법이니 말이다.
글 임현주(MBC 아나운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