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경봉 92호가 접안했던 니가타 서항의 모습.
[한겨레 창간 26년 특집, 떠오르는 환동해]
전문가 기고
전문가 기고
북일 특수관계의 현장
일본 니가타는 환동해 경제권의 또 다른 일원 북한과 일본의 특수한 관계를 잘 보여주는 곳이다. 2차 대전 패전후 일본이 ‘인도주의’라는 깃발 아래 장차 일본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 분명한 재일교포들을 북한으로 송환하기 위해 벌였던 이른바 ‘재일교포 북송사업’의 일본측 기점이 바로 니가타이다. 이후 2006년 7월 북한 핵 문제와 납치자 문제로 북일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원산과 니가타를 오가던 만경봉호 뱃길이 끊길 때까지 냉전시대는 물론 탈냉전시대 내내 북일 인적왕래와 물자교류의 대표적인 일본내 거점 구실을 했던 곳도 니가타였다.
재일교포 북송선 만경봉 92호가 처녀 출항한지 꼭 55년이 흐른 오늘날, 니가타는 여전히 북일간 갈등과 협력이 부침하는 현장이 되고 있다. 일본과 북한은 납치자 문제, 미사일 문제, 북한 핵 문제 등을 둘러싸고 벌써 10년째 밀고 당기기를 계속하고 있다. 일본이 ‘특정 선박의 입항금지 특별조치법’을 공포하여 북한 일부 선박의 입항을 금지한 것이 10년 전인 2004년 6월이다.
2006년 7월 북한이 장거리로켓 시험을 강행하자 일본은 만경봉 92호의 니가타 등 일본 내 입항을 금지시켰다. 2007년 이후 연속 7년째 북한과 일본의 무역액은 공식적으로 ‘제로’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다만 지난 3, 4월 북일간 공식, 비공식 접촉을 통해 북한이 일본에 ‘만경봉92호’의 일본 국내항 입항을 요구했다는 것 정도가 작은 변화라면 변화할 할 수 있다.
1959년 니가타-청진간 첫 북송선
일본은 재일교포 북송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는 대신, 일본적십자사라는 ‘대리인’을 내세워 조용히 일을 추진했다. 재일교포 송환을 위한 은밀한 움직임은 1955년 7월 일본적십자사가 제네바의 국제적십자사 본사를 방문하여 ‘재일조선인들은 일본내 소수민족이 아닌(즉 일본국민이 아닌), 국제법 하에 있는 외국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이듬해 1월말 일본의 적십자사 대표는 직접 신의주를 경유하여 평양에 들어가 협상을 벌였다. 1959년 12월 마침내 니가타항에서 북한 청진항을 목적지로 한 첫 북송선(당시에는 소련 여객선 동원)이 출항함으로써 일본의 노력은 첫 결실을 거두었다.
당시 북한으로 떠나기 위해 니가타에 모였던 재일교포들은 도쿄는 물론, 교토, 오사카, 히로시마, 야마구치, 그리고 북쪽으로 멀리 홋카이도 등 일본 전역에 짧게는 1박2일, 길게는 사나흘 동안 열차를 달려 니가타에 내린 사람들이다. 일본은 이들 재일교포들을 일단 니가타적십자사에 마련한 임시 숙소에 며칠간 집단 수용했다가 출항 당일 버스에 실어 항구로 보냈다.
 옛모습을 잃어버린 ‘보토나무 도리’(버드나무 길)
니가타 서항 바로 이 버스가 지나는 길에 일본은 재일교포의 북송을 기념하기 위해 버드나무를 심었고, 훗날 이 길을 한국어 발음을 일본식으로 옮겨 ‘보토나무 도리’라고 불렀다. 추방에 다름없는 사업을 ‘인도주의’로 포장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치밀함은 이처럼 세밀한 데에까지 미치고 있었다.
그사이 니가타에 남은 북일 교섭사의 물증들도 갈등의 역사 속으로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다. 일본이 조성했다는 버드나무길은 현재 니가타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서 컨벤션센터와 전망대의 기능을 겸한 도키메시빌딩 뒤편에 있지만, 이 길의 버드나무들은 이미 베어지거나 사라져 드문드문 남아 있을 뿐이다.
길 한켠에 니가타시가 세운 유래설명 표지판과 이 표지판 바로 옆에 1959년 당시 조총련 니가타현 본부가 세운 목재 푯말이 달랑 서 있을 뿐이다. 과거 성세를 누렸을 것으로 생각되는 조총련 니가타 본부 사무실은 북일 관계가 악화 이후 사무실 압수수색 등 일본의 계속되는 제재 영향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다 문을 닫았다. 낡은 건물은 셔터가 내려진 채 인적이 끊긴듯 을씨년스럽기만 하다.
옛모습을 잃어버린 ‘보토나무 도리’(버드나무 길)
니가타 서항 바로 이 버스가 지나는 길에 일본은 재일교포의 북송을 기념하기 위해 버드나무를 심었고, 훗날 이 길을 한국어 발음을 일본식으로 옮겨 ‘보토나무 도리’라고 불렀다. 추방에 다름없는 사업을 ‘인도주의’로 포장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치밀함은 이처럼 세밀한 데에까지 미치고 있었다.
그사이 니가타에 남은 북일 교섭사의 물증들도 갈등의 역사 속으로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다. 일본이 조성했다는 버드나무길은 현재 니가타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서 컨벤션센터와 전망대의 기능을 겸한 도키메시빌딩 뒤편에 있지만, 이 길의 버드나무들은 이미 베어지거나 사라져 드문드문 남아 있을 뿐이다.
길 한켠에 니가타시가 세운 유래설명 표지판과 이 표지판 바로 옆에 1959년 당시 조총련 니가타현 본부가 세운 목재 푯말이 달랑 서 있을 뿐이다. 과거 성세를 누렸을 것으로 생각되는 조총련 니가타 본부 사무실은 북일 관계가 악화 이후 사무실 압수수색 등 일본의 계속되는 제재 영향으로 자금난에 시달리다 문을 닫았다. 낡은 건물은 셔터가 내려진 채 인적이 끊긴듯 을씨년스럽기만 하다.
 -인도주의와 거리가 멀었던 재일교포 북송사업
니가타를 북한과 특별한 관계로 맺어준 일본의 재일교포 북송사업은 인도주의와는 거리가 먼, 일본의 전후복구 전략 및 대외정책에 따라 철저하고 주도면밀하게 입안되고 실행된 정치적 사업이었다.
6.25전쟁 정전후 북일간 교섭은 의외로 빨리 시작됐다. 1955년 1월이면 이미 일본의 당시 총리 하토야마 이치로(2009년 총리에 오른 하토야마 유키오의 친조부)와 북한의 남일 외상에 의해 대일 관계개선 및 경제교류 의사가 교환된다. 같은 해 10월, 일본 사회당 대표단 방북의 형식으로 북일은 ‘무역촉진에 관한 의사록’을 교환, 상호 교류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인도주의와 거리가 멀었던 재일교포 북송사업
니가타를 북한과 특별한 관계로 맺어준 일본의 재일교포 북송사업은 인도주의와는 거리가 먼, 일본의 전후복구 전략 및 대외정책에 따라 철저하고 주도면밀하게 입안되고 실행된 정치적 사업이었다.
6.25전쟁 정전후 북일간 교섭은 의외로 빨리 시작됐다. 1955년 1월이면 이미 일본의 당시 총리 하토야마 이치로(2009년 총리에 오른 하토야마 유키오의 친조부)와 북한의 남일 외상에 의해 대일 관계개선 및 경제교류 의사가 교환된다. 같은 해 10월, 일본 사회당 대표단 방북의 형식으로 북일은 ‘무역촉진에 관한 의사록’을 교환, 상호 교류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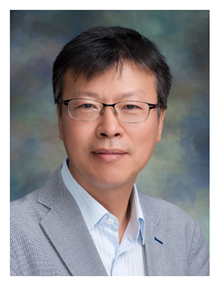 일본의 재일교포 북송사업은 바로 이러한 기류를 타고 실행에 옮겨지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가 이 사업을 추진한 데에는 전후에도 그대로 일본에 남을 수밖에 없었던 약 65만 명의 재일교포를 남한 또는 북한에 송환함으로써 잠재적인 사회불안 요소를 줄이고 전후복구 및 부양의 부담을 남북한에 전가하려는 의도가 작용했다.
박성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sjpark@kmi.re.kr
일본의 재일교포 북송사업은 바로 이러한 기류를 타고 실행에 옮겨지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가 이 사업을 추진한 데에는 전후에도 그대로 일본에 남을 수밖에 없었던 약 65만 명의 재일교포를 남한 또는 북한에 송환함으로써 잠재적인 사회불안 요소를 줄이고 전후복구 및 부양의 부담을 남북한에 전가하려는 의도가 작용했다.
박성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sjpark@kmi.re.kr
버드나무 거리 한쪽에 일본 총련 니가타현 본부 및 니가타현 재일조선인 귀국협력회 팻말이 서 있다.
2006년 7월 일본정부의 만경봉 92호의 니가타 일본 내 입항 금지조처 이후 총련 니가타현 본부 및 조국 왕래기념관엔 경비 한 두명이 지키고 있을뿐 셔터가 내려진 채 인적이 끊긴듯한 모습이다.
박성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