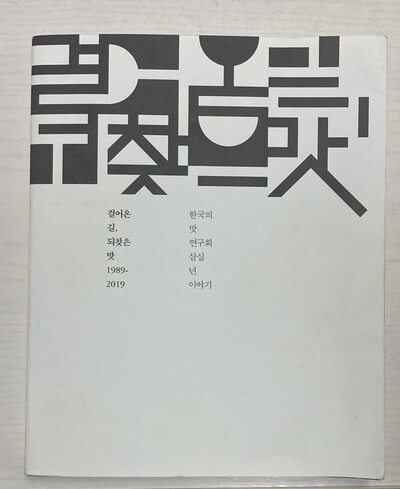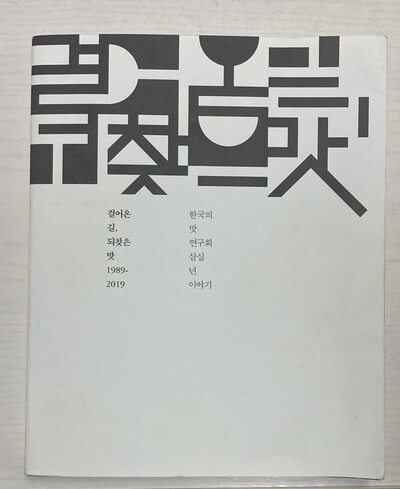잡채의 생명은 뭘까요? 소고기? 시금치? 당면 아닐까요. 얌체처럼 매끈한 당면이 갖은 양념을 바른 채 소고기, 시금치 등과 어우러져 우리 입에 당도하면 감당할 수 없는 쾌감이 몰려오죠. 하지만 우리 조상들이 먹은 잡채엔 당면이 없습니다. 진주 향토 음식인 조선잡채는 콩나물, 죽순, 미나리 등을 버무려 만드는데, 심지어 양(소의 위)이나 천엽 같은 소 내장도 들어갔다지요. 어찌 확신하느냐고요? 최근 출간한 <걸어온 길, 되찾은 맛 1989~2019 한국의 맛 연구회 삼십년 이야기>에 또렷이 고증돼 있습니다.(물론 다른 고서적에도 언급된 내용이긴 합니다만.)
우리 음식의 궤적을 좇다 보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기록물이 적기 때문에 조리법은 고사하고 유래조차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음식사를 연구한 원로도 적고, 원형 그대로 맛을 재현할 전통음식 연구가도 많지 않지요. 이런 이유로 언급한 책은 가치를 따지는 게 송구할 정도로 소중합니다.
강인희 선생의 제자들이 출간한 책 <걸어온 길, 되찾은 맛 1989~2019 한국의 맛 연구회 삼십년 이야기>. 박미향 기자
이 책은 강인희(1919~2001) 선생의 제자들이 연구단체 ‘한국의 맛 연구회’ 30여년 역사를 기념해 발간한 조리서입니다. 이 단체는 88서울올림픽 문화 행사로 기획한 ‘음식문화 오천년’이 계기가 돼 결성되었죠. 당시 행사에 참여한 이들이 자문을 맡았던 강인희 선생께 가르침을 부탁하면서 역사가 시작됐죠.
동아대, 명지대 교수를 역임한 강인희 선생은 한식의 전통을 흥인군 이최응(조선 후기 왕족이자 정치인·흥선대원군의 형) 댁의 종부 김정규, 대한제국 황제인 순종의 두 번째 부인 순정효황후(1894~1966)의 올케 조면순으로부터 전수받은 학자입니다. 이 책엔 다양한 한식 조리법이 등장합니다. 칼국수 같은 익숙한 음식도 있지만, 월과채, 조선잡채 등 낯선 음식도 많답니다. 오래전부터 먹었지만 이제야 더없이 훌륭하다는 걸 깨닫게 된 음식들이죠.
비단 음식만 그럴까요? 잠깐 머물다 가는 여행지, 고향 사람들이나 사는 시골 정도로 취급했던 우리 땅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최근 강 선생 제자들처럼 우리 땅의 매력을 세상에 드러낸 이들이 있습니다. 유명 인사도, 고관대작도, 가방끈 긴 지식인도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에 내몰린 평범한 직장인들. 그들이 요즘 도시가 아닌 소박한 동네를 ‘제2의 일터’ 삼아 머물며 일한다는군요. 이번주 ESC는 그들 얘기를 담아봤습니다.
박미향 팀장 m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