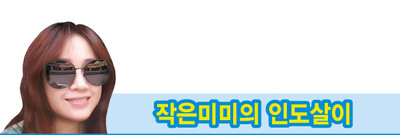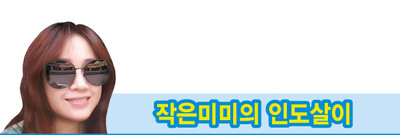작은미미가 인도에서 사용하는 마스크. 사진 작은미미 제공
“살아 있지?” 요즘 부쩍 한국에 있는 가족, 친구들과 생사 안부를 주고받는다. 한국도, 인도도 확진자가 느는 추세다. 인도에서는 몇 주 전 전직 대통령이 뇌수술을 받다가 사망했다. 그가 사망 직전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진단을 받으면서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빠르게 퍼졌다. 하루 9만명, 폭발적으로 느는 인도의 확진자 숫자를 보며 코로나19 확진자 세계 1위인 미국을 따라잡을 날이 머지않아 보이는데, 어찌 된 일인지 길거리엔 마스크를 쓴 사람이 더 준 느낌이다. 몇 달 만에 만난 인도인 친구는 이미 코로나19를 겪었다며 마스크를 아예 안 썼다. “다시 걸릴 수도 있어. 무증상도 있고. 제발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써줘.” “다시 걸릴 수 있다고? 말도 안 돼.” 친구는 안 믿는 눈치였지만 답답해하는 나를 보며 호피 무늬 마스크를 꺼냈다. 예뻤다. 갖고 싶다는 생각에 살펴보니 얄팍한 실크 소재였다. “안에 비말 차단용 소품을 덧대야 할 것 같은데.” “진정해. 난 자연 항체가 있다니까.” 이곳에 있으면 내가 유난 떠는 것 같다.
길거리에서 여느 때처럼 마스크 안 쓴 채 수다를 떨며 사모사(삼각형 모양의 튀김)나 비리야니(향신료에 재운 고기, 해산물 위에 생쌀, 채소 등을 올려 쪄낸 음식)를 나눠 먹는 사람들을 보면 갑자기 그들 사이에 끼고 싶은 충동이 인다. 인도 아저씨가 손으로 버무려주는 감자조림에 식욕이 샘솟는다. 과거엔 꺼린 음식이다. 나에겐 금기된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인도인들에게 질투가 치민다. 말도 안 되는 충동을 이성으로 잠재우며 택시기사에게 물었다. “요즘 인도 사람들 마스크를 잘 안 쓰는 거 같은데, 왜 그러는 거예요?” “코로나, 피니시!” 경제상황 때문에 봉쇄를 푼 것인데, 그걸 이해 못 한다. 죽음의 공포를 초월한 건가? 이것이 코로나19 시대의 인도식 ‘해탈’인가?
하지만 쇼핑몰이나 고급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방독면 같은 어마어마한 마스크나 페이스 방패를 쓴 사람이 많다. 패션 리더 여성들은 인도 전통 의상인 사리와 마스크를 맞춤 의상처럼 하고 다닌다. 마스크 착용도 빈부격차란 게 있는 것인가. 길거리가 주요 생업지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격차, 정보와 마스크의 빈부격차. 이런 게 생사의 빈부격차로 이어지는 것인가.
인도인들에게 죽음이란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새로운 생명을 얻어 껍질을 벗는 과정이라고 한다. 힌두교의 종교관에 따르면 말이다. 이들에게 죽음은 곧 새로운 시작인 것이다. 힌두교에서 세상 모든 것은 창조와 유지, 해체의 과정으로 순환하는 원의 시간관에 따라 움직이기에 죽음은 슬픈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인도의 가장 성스러운 강인 갠지스강은 죽은 자들의 유골을 뿌리는 곳이지만, 동시에 산 자들의 빨래터이자 목욕탕이기도 한 것이다. 죽음과 삶은 이들에게 동등한 개념이다. ‘괜찮아, 코로나19가 뭐라고. 죽는 게 뭐라고. 다시 태어나면 되지. 어차피 결국 누구나 겪을 일, 많은 인도인은 내일 죽을지언정 오늘 한 잔의 짜이(홍차, 우유, 향신료 등으로 만든 인도 전통 음료)를 나눠 마시며 맑은 공기를 마시련다.’ 인도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며 노심초사하던 무렵, 지인의 확진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그와 나는 열흘 전 야외 카페에서 수다를 떨며 커피를 마셨다. 나는 바로 코로나19 간이검사를 했고,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곧 정식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마스크를 안 쓴 채 웃고 다니는 인도인들을 우려의 시선으로 보던 내가 오히려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될 줄이야. 갑자기 92살 할머니가 평생 가장 억울한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했다는 답이 떠올랐다. “막판에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자주 웃는 놈이 좋은 인생이더라.” 인도인들 걱정은 그만하고 그냥 같이 웃으련다. 자연사할 때까지 미친 듯이 웃으면서 살련다. 핑크빛 꽃무늬 마스크를 주문하면서 나는 그렇게 다짐했다.
작은미미(미미 시스터즈 멤버·뮤지션·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