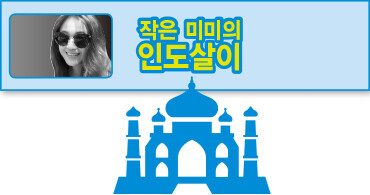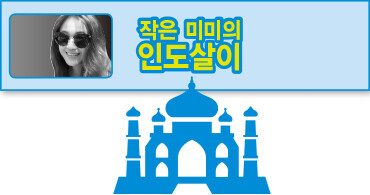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 사진 씨제이엔터테인먼트 제공
2020년 1월31일, 드디어 인도에 <기생충>이 개봉했다. 지난해 한국 개봉 때부터 인도의 영화 관련 플랫폼 ‘북마이쇼’를 들락날락하며 개봉 여부를 체크해온 터였다. 상상을 초월하는 수많은 계층이 살고 있고, 계급 간의 이동이 지극히 어려운 인도.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처음 든 생각은 “인도 사람들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볼까?” 였다. 상류층에만 가사도우미, 운전기사가 있는 한국과는 달리 인도는 중산층 이상이면 누구나 유모까지 고용한다. 수입이 적으면 적은 대로 시간제 가사도우미를 부린다. 인도인에게 육체노동의 외주화는 최상류층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런 인도인들이 과연 기택(송강호)의 마지막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칸 국제영화제와 골든 글로브 시즌이 지나고, 아카데미 후보에 올랐다는 뉴스가 들려도 개봉은 깜깜무소식이었다. 수상 경쟁작이었던 <1917>과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는 벌써 개봉을 했건만 대체 <기생충>은 언제? 드디어 <기생충>의 개봉 예정일이 떴다. 나는 신이 나서 인도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가 종종 주던 소주의 오리지널 병이 궁금하면 보러 가자고!’(난 주로 팩소주로 인도에 소주 문화를 전파해왔다.)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휩쓴 그 날 밤, 나는 극장으로 향했다.
인도인들의 일상에 영화는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쇼핑몰 대부분엔 영화관이 있고 한국의 고급 버전 뺨치는 영화관도 있다. 한국 영화관과 다른 점 몇 가지. 첫째 상영 전 인도 국가가 나온다는 것, 둘째 영화 시작하면 메뉴판을 나눠준다는 것.(인도식 튀긴 만두나 나초 같은 가벼운 스낵부터 초밥에 맥주까지 가능. 영화 상영 도중 음식 배달이 온다.), 셋째 쉬는 시간이 있다는 점이다. 인도 영화의 경우 쉬는 시간까지 정확히 계산해서 편집하니 흐름에 큰 방해가 되지 않지만, 외화는 아주 뜬금없는 지점에서 멈추기도 한다.
그날 객석은 꽉 찼다. 자국 영화가 강세이고 자막을 싫어하는 인도인들인데 말이다. 내가 만든 영화도 아닌데 괜히 웃음이 비실비실 나왔다. 내 오른쪽에 앉은 인도 여성이 나를 보며 묻는다. “너 혹시 한국 사람이니?” “응, 난 세 번째 본다. 재미있게 보렴” “오, 스포일러 하지 마!”
와이파이 구걸 신부터 관객들은 빵빵 터졌다. 이어지는 장면마다 다들 박수를 치며 웃는 모습이 한국 관객보다 봉 감독의 유머를 더 즐기는 듯했다. 제시카송 장면에서는 오른쪽 친구가 아쉬운 듯 말했다. “발리우드 영화였다면 떼춤신이 나왔을 타이밍인데!” 드디어 대망의 초인종 장면이 왔다.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누가 찾아왔는지 다들 토론하기 시작했다. 나는 웃었다. 바로 그 순간, 쉬는 시간을 알리는 화면이 떴다. 나는 감탄했다. 인도의 영화 편집자가 내용을 배려했을 리가 없다. 이건 전반부와 후반부를 완벽하게 동일한 길이로 구성한 봉 감독의 디테일 때문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었다. 나는 ‘봉뽕’에 빠졌다.
2부가 시작되자 관객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웃는 사람도, 토론하는 사람도 줄어들었다. 짜파구리 장면에서 고여 오는 침을 조용히 삼키며 관객들의 한숨과 탄식 소리를 들었다. 마지막 현실로 돌아온 기우(최우식)의 엔딩 신. 해피엔딩에 익숙한 발리우드 팬이었다면 영 찝찝한 결말일 것이다. 오른쪽 친구를 슬쩍 보았다. 그는 얼빠진 표정으로 나를 보며 “디스 이즈 투 머치 포 미(Wow, This is too much for me·이건 내게 너무 과도해!)”라고 중얼거리며 일어났다. 다른 20대 인도 친구는 말했다. “당연히 영화 메시지를 이해하지. 우리 윗세대와 우리는 또 완전 다른 생각으로 살아. 교육이나 시스템으로 계급 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어.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현재 <기생충>은 북마이쇼 영화평에서 93%의 높은 호감도를 보이고 있다. 상영 기간도 개봉관도 늘었고, 영어 더빙판도 나왔다. 더는 인도인에게 한국 영화는 변방에서 온 미지의 어떤 것이 아니다. <기생충> 속 가족들처럼 너무나도 다른 한국과 인도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는 해피엔딩이기를 바란다.
작은미미(미미시스터즈 멤버·뮤지션·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