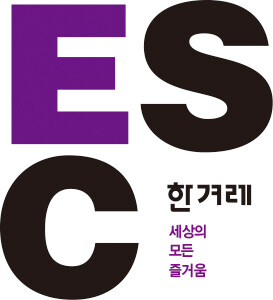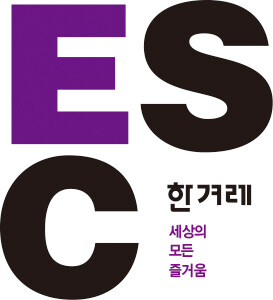며칠 전 대학 친구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이 왔다. 친구는 명리학을 공부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기사를 읽다가, 기사 하단에 쓰여 있던 내 이름을 보았다며 소식을 전해왔다. 몇년 전 쓴 기사가 친구에게까지 가닿았구나, 반가운 마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니 친구는 명리학 공부에 관심이 상당해 보였다. 내가 무신일주(戊申日柱)라고 하자 “금맥을 품고 있는 산이구나” 하면서 언제 바위산에 놀러 가겠다고 농담을 하는가 하면, “신(申)이란 글자는 가운데 뾰족한 바늘이 있지. ‘현침살’이 있어서 네가 기자가 되었구나” 하며 즉석에서 내 사주를 봐주었다.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끼리만 아는 ‘사주 토크’로 길지 않은 안부 인사를 나눈 뒤, 친구는 취미로 명리학 공부를 한 걸 평소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물어왔다. 내 사주를 알았을 때 ‘난 이런 사람이구나’ 정도로 알고 넘어가면 되는지, 좋지 않은 운이 오는 걸 알았을 땐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은지 물었다.
냉큼 답을 줄 만큼 내가 명리학에 정통한 현자는 아니지만, 나는 ‘위안’을 목적으로 명리학을 공부했다. 명리학이 제일 힘이 됐던 때는 백수 시절이었다. 내가 가진 재능은 무엇이고 내 한계는 무엇인지, 지금 힘든 시기가 언제까지 가는지, 이런 것들이 사주 구조를 통해 설명될 때 나는 운명에게 따뜻한 위로를 받는 기분이 들었다. 내가 이래서 힘들었구나, 마음을 다잡기도 했다. 명리학을 통해 나는 지금 인생에서 어디쯤 와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설명을 들으면 지금을 참고 견딜 힘이 났다. 앞으로 무슨 일을 하면 좋다는 말을 들으면 괜스레 에너지가 생겼다.
하루가 다르게 추워지는 날씨로 마음도 춥게 느껴지는 가을이다. 가을의 끝자락이 오면 한해가 다 갔다는 아쉬움과 허한 마음에 만세력을 펼쳐보곤 한다. 곧 겨울이 오지만 이듬해 다시 봄이 오겠지. 계절은 어쨌든 돌고 돈다. 사람들이 사주를 보는 이유는 결국 내 어깨에 쌓인 짐의 무게를 덜고 싶어서가 아닐까. 나 때문이 아니라 운 때문이라고 하면, 거칠고 험난한 시대를 헤쳐나가는 데 위로가 될 테니까.
봄날원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