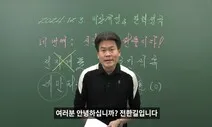<편집자주>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역사적인 해를 맞아 <한겨레>는 독자 여러분을 100년 전인 기미년(1919)의 오늘로 초대하려 합니다. 살아숨쉬는 독립운동가, 우리를 닮은 장삼이사들을 함께 만나고 오늘의 역사를 닮은 어제의 역사를 함께 써나가려 합니다. <한겨레>와 함께 기미년 1919년으로 시간여행을 떠날 준비, 되셨습니까?
식민지 조선에선 쌀값 폭등으로 아사자가 속출하는 와중에 일본 동경에서는 ‘돈까스·카레라이스·오무라이스’라는 ‘화양절충(和洋折衷)요리’가 군부대와 대학을 중심으로 유행하면서 잇따라 관련 음식점들도 문을 열고 있다고 한다. 화양절충 요리란 일본음식(和)에 서양음식(洋)을 접목한 요리를 일컫는데 ‘요쇼쿠’라고도 불린다.
먼저 ‘돈까스’라는 요리는 서양의 커틀릿에서 유래한 일본 요리로 돼지 등심을 2~3㎝ 두께로 넓적하게 썰어 빵가루를 묻힌 뒤, 기름에 튀겨 일본식 소오스, 밥, 배추 비슷한 채소를 채 썰어 곁들여 먹는 음식을 말한다. 돼지 돈(豚) 자에 커틀릿의 일본식 발음인 까스가 합성된 것이다. 쇠고기를 넣어 튀긴 것은 ‘비프 커틀릿’이라고 한다.
카레라이스는 울금과 강황, 향신료 등을 물과 섞어 만든 양념인 인도 음식 카레에 고기와 채소를 볶아 밥 위에 얹은 요리를 말한다. 카레와 밥을 의미하는 영어 라이스가 합쳐진 말이다. 식민지 통치를 통해 18세기 인도에서 영국으로 전해진 커리가 다시 문명개화의 상징으로 일본까지 전파된 것이다.
오무라이스는 채소와 통조림 고기를 잘게 썰어 넣고 중국 남쪽 지방에 사는 오랑캐로부터 들여온 도마도(토마토)라는 감즙을 섞어 밥을 볶은 뒤 지단처럼 계란을 넓게 부쳐 그 밥을 감싼 요리이다. 프랑스어의 ‘오믈렛’과 라이스가 합성된 것이다.
화양절충요리 탄생에는 메이지 유신 이후 일왕의 육식 허용과 서양요리 도입, 단체급식의 영향으로 음식의 서구화가 앞당겨진 점, 서양요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이 이유로 꼽힌다.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 농경사회의 전통과 불교숭상 문화로 육식이 금지되고 채식과 생선 위주의 식단이 장려되던 일본에서 고기를 먹기 시작한 것은 두가지 국가적 목표, 즉 부국강병과 문명개화 때문이었다.
메이지 유신을 전후하여 서양인을 만난 일본인들은 그들의 큰 체구에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서양처럼 부국강병을 하기 위해서는 서양인이 먹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일왕을 비롯해 지배층은 육식을 권장했지만 일본 서민들은 어려운 경제적 형편과 입맛 차이로 상층계급이 즐겨 먹는 서양요리를 그대로 먹을 수 없었다.
일제 강점기, 일본으로부터 건너온 돈가스는 대표적인 화양절충요리다.
서구의 것을 따라 배우길 바라는 지배층의 의도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일본식 음식에 가깝게 조리된 화양절충요리가 20세기 초에 등장한 배경이었다. 여자대학에서 서양요리를 가르치고 요리학교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때였다. 대학생들과 군대에 간 청년들 중 서양요리를 먹어본 이가 적지 않아 화양절충요리에 대한 수요는 이미 충분했다고 한다. 오승훈 기자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단독] 김건희 ‘논문 표절 조사결과’ 수령…2월 12일까지 이의신청 [단독] 김건희 ‘논문 표절 조사결과’ 수령…2월 12일까지 이의신청](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131/20250131502311.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