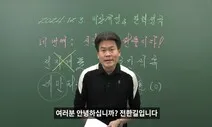<편집자주>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역사적인 해를 맞아 <한겨레>는 독자 여러분을 100년 전인 기미년(1919)의 오늘로 초대하려 합니다. 살아숨쉬는 독립운동가, 우리를 닮은 장삼이사들을 함께 만나고 오늘의 역사를 닮은 어제의 역사를 함께 써나가려 합니다. <한겨레>와 함께 기미년 1919년으로 시간여행을 떠날 준비, 되셨습니까?
이은 왕세자(왼쪽)과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 공주. 한겨레 자료
조선 왕실 이은(22) 왕세자와 일본 왕실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18) 공주의 결혼식이 오는 25일 일본 동경 가스미가우라 이궁에서 열린다. 일본 정부와 조선총독부, 조선 왕실은 ‘일선화합’(日鮮和合)의 상징적인 경사라고 반기지만, 무단통치에 신음하는 조선인들은 허울뿐인 ‘융화’를 내세워 진행되는 정략결혼이라 비판하고 있다.
두 나라 왕실의 결혼이 세간에 알려진 것은 병진년(1916) 8월3일이었다. <요미우리신문>을 비롯한 일본 신문들은 ‘이 왕세자의 경사, 나시모토노미야 마사코 여왕 전하와 약혼하심’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일제히 보도하였다. 마사코는 자신의 약혼 사실을 신문 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돼 충격에 빠졌다고 한다. 사실 이 결혼은 병합 이전부터 이토 히로부미 전 조선통감에 의해 계획돼 이완용과 합의까지 된 사항이었다. 이후 조선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와 궁내대신 하타노 요시나오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 것이 언론에 발표된 것이다.
조선 왕실의 반응은 어땠을까. 이태왕(순종 재위시 태상왕인 고종을 이르던 말)은 “그것은 순전히 조선왕조 오백년의 종사를 안녕히 하기 위함이다. 이 경전(慶典)을 하루속히 거행하여 우리 노모의 쓸쓸함을 위안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궁내부 사무관 곤도 시로스케의 전언도 비슷한 내용이다. 다만 이태왕의 속내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다. “만약 후작이나 백작의 화족(華族)급이었다면 (이태왕 전하께서) 쉽게 동의하지 않으셨을 것”이라며 “황족의 존귀함은 충분히 이해하셔서 종래 각별히 존경하는 마음을 나타내시고 있어 이제 그 한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된 것에 이태왕 전하는 매우 만족하고 기뻐하셨다.”(곤도 시로스케의 회고록)
1916년 두 사람의 결혼소식을 경사라고 보도한 일본 언론. 한겨레 자료
“강도랑 한 식구가 되어서 그리도 감개무량하오?”라는 조선 민중들의 탄식이 나올 법한 대목이다. 사실 두 왕실의 결혼은 일본 법률에 따르더라도 위법성 시비가 일어날 만한 사안이다. 애초 일본 왕실의 제도와 구성에 대한 법률인 ‘황실전범’(제39조)에 따르면 “황족의 결혼은 동족 또는 칙지에 따라 특별히 인정된 화족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일본 황족과 조선 왕족의 결혼은 불가능하였다. 세기의 정략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 일본은 ‘황실전범’의 개정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작년 11월28일에 일본 정부는 “황족 여자는 왕족 또는 공족에게 시집갈 수 있다”는 ‘황실전범증보’를 가까스로 마련하는 촌극을 빚었다.
조선인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결혼 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다. 작년(1918) 12월5일에는 혼인을 인정하는 다이쇼 일왕의 칙허가 발표되었고 3일 뒤인 8일에는 약혼을 의미하는 납채의식이 행해졌다. 11일에는 동경에 있는 이 왕세자의 저택에서 약혼자인 마사코 공주와의 첫 대면도 있었다. 1월2일에는 조선 왕실에서 보낸 혼의품이 다섯개의 큰 고리짝에 담겨 일본 왕실에 도착할 예정이다. 조선 왕실의 미술제작소에서 제조된 장식품, 의류 등이라고 한다.
폭력적으로 지배하되 끝까지 형식적으로나마 합의와 설득을 표방하는 이러한 통치방식은 앞서 문명을 전수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열등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마포 오첨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단독] 김건희 ‘논문 표절 조사결과’ 수령…2월 12일까지 이의신청 [단독] 김건희 ‘논문 표절 조사결과’ 수령…2월 12일까지 이의신청](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131/20250131502311.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