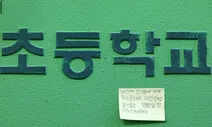연재ㅣ김선호의 우리 아이 마음 키우기
“선생님 배가 아파요.”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많이 하는 말이 ‘배 아프다’는 말이다. 물론 정말 배가 아픈 경우도 있다. 체하거나 장염 등으로 아픈 아이들은 표정부터 다르다. 뭐랄까… 지금이라도 당장 화장실로 달려가야 할 듯한 표정으로 고통을 호소한다. 하지만 고민 및 우울한 순간이 다가와도 그들은 배가 아프다고 말한다.
일단 아이가 몸이 아프다 표현하면 진위 상관없이 보건실에 보낸다. 실제 몸이 아프지 않아도, 마음이 아픈 것도 아픈 거다. 아이들은 마음이 아픈 건지 몸이 아픈 건지 구분을 잘 못한다. 그냥 다 똑같이 배가 아프다. 보건실에 가도 특별한 처방이 있는 건 아니다. 단지 나를 바라봐주는 보건 선생님의 따뜻한 시선이 있다. 어디가 아픈지 찬찬히 물어봐주고, 열도 한번 확인해주고, 배에 따뜻한 찜질을 해주거나 어린이용 소화제 시럽을 준다. 또는 비타민 사탕을 받아온다. 아이들은 그런 단순한 처방을 받고 다시 교실로 돌아와 자신의 병이 호전되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마음도 편안해진다. 이런 처방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회복 탄력성 때문이다.
누구나 심리 회복 탄력성이 있다. 아이들의 심리 회복 탄력성은 어른들보다 훨씬 효능이 좋다. 뭐랄까 이제 방금 만들어진 고무줄 탄성을 지닌다. 조금 전까지 배가 아프다고 말했던 아이가 보건실에 다녀오라는 허락만으로 금방 상황을 호전시킬 만큼 탄력성이 좋다. 덕분에 아이들의 자존감은 한순간에 낮아지지 않는다. 몇번의 실패감이나 우울함 정도로 자존감이 회복되기 어려울 만큼 치명적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심리적 불안, 두려움, 좌절감, 슬픔, 우울 등은 언제든 아이들에게 예고 없이 다가온다. 그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단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회복 탄력성 시스템이 작동하기만 한다면, 금방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다. 어떻게 아이들의 회복 탄력성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까?
의외로 방법은 간단하다. 아이들을 움직이게 하면 된다. 놀이를 통한 움직임이면 더없이 좋다. 꼭 놀이가 아니더라도 일단 움직이게 하는 것도 효과가 좋다. 온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손가락이라도 움직이게 하는 것도 괜찮다. 종이를 접고, 레고를 조립하고, 진득진득한 고무찰흙을 만지작거리는 것도 다 좋다. 가장 좋지 않은 것은 주변 어른들이 아무런 반응도 없고, 더구나 아이에게 움직임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다. 아이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회복 탄력성도 동시에 멈춘다. 크리스토프 앙드레(프랑스 정신과 의사)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한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레퍼토리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도 가지 못하고,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은 채 1년이 되어간다. 이 시간을 집에서 스마트폰만 보면서, 또는 그냥 학습지만 풀면서 움직이지 않은 채 1년이 되어간다. 아이들의 회복 탄력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아주 작은 움직임도 좋다. 우리 아이가 집에서 뭔가 하면서 신체 일부라도 움직이게 해주자. 배가 아프다는 날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김선호 ㅣ 서울 유석초 교사
김선호 ㅣ 서울 유석초 교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