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목적지에 내리지 않고 하늘을 떠돌다 돌아오는 무착륙 비행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코로나19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항공업계가 소비자의 관광욕구를 읽어낸 뒤 내놓은 자구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인천공항에서 시작한 무착륙 관광비행을 다음달부터 김포와 김해, 대구 등 지방공항으로 확대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공항별 하루 운항 편수는 3편 수준이다. 이미 아시아나항공은 인천공항을 출발해 부산, 후쿠오카, 제주를 지나 인천공항으로 돌아오는 상품을 선보였다. 제주항공도 인천·김포공항을 출발해 부산, 대마도 상공을 지난 뒤 다시 부산을 거쳐 인천·김포공항으로 돌아오는 상품을 내놓았다.
해외여행, 면세점에 대한 그리움이 컸던 소비자들은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을 반기는 모습이다. 하지만 기후·환경단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비행기를 해외여행 수요가 없을 때마저 띄우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단거리 항공편을 축소하는 세계적 흐름과도 비교된다.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 운항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는 연간 탄소 배출량의 2% 정도다.
이영웅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은 “최근 정부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무착륙 비행 확대를 하는 것은 엇박자로 비춰질 수 있다. 기후위기 시대임을 고려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헌석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일부 해외 항공사들도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그런 선택을 한 사례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정부가 앞장서서 무착륙 비행을 추진하고 확대한다는 게 문제”라고 했다.
1200㎞ 이동 승객 1인당 탄소배출 비행기 118㎏, 기차 43㎏
비행기, 기차, 자동차의 탄소배출량을 비교해봤다.
유럽환경청은 2014년 지속가능한 교통을 고민하는 단체 ‘혁신적 도시 이동 계획’(TUMI) 자료를 인용해
88인승 비행기는 승객 1인당 1㎞를 이동할 때 285g의 탄소를 배출한다고 분석했다. 자동차는 1.5명이 탔을 경우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158g을 배출하고, 156명이 탄 기차는 14g을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비행기 대신 요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갔다. 그해 영국이 내놓은 온실가스 자료를 보면, 승객 1명이 1㎞를 이동할 때 발생하는 탄소는 국내선 항공기 133g, 장거리 항공기 102g, 기차 41g, 일반버스 104g, 시외버스 27g, 고속열차(유로스타) 6g, 승용차(디젤) 171g 등이었다.
항공기는 높은 고도를 비행할 때보다 이륙할 때 훨씬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 항공기에 싣는 짐이 많아질 수록 탄소 배출량은 늘어난다. 넓고 편안한 비즈니스석 또는 일등석을 이용할 경우 1인당 탄소 배출량은 여러 승객이 다닥다닥 앉은 이코노미석에 앉아갈 때보다 3~4배 많아진다. 대체 교통수단이 애매하거나 아예 없는 장거리 비행보다 기차 등 대체수단이 있는 단거리 비행, 기착지에 내리지 않고 상공을 한바퀴 돌고 오는 무착륙 비행의 탄소 배출을 주로 문제삼는 이유다.
인천~후쿠오카는 편도로 562㎞다. 아시아나항공이 내놓은 인천~부산~후쿠오카~제주~인천 왕복 무착륙 비행거리는 영국 런던에서 스페인 마드리드까지 항공기로 이동(1263㎞)하는 거리와 비슷하다. 교통수단 탄소발자국을 계산할 수 있는
에코패신저(eco passenger)로 이 관광상품의 예상 탄소량을 견줘봤다. 런던에서 마드리드까지 항공기로 이동할 경우 승객 1인당 탄소 118㎏(탄소 외 온실가스까지 합하면 265㎏)이 배출된다. 기차로 가면 1인당 탄소 43㎏을 배출하는 거리다.
해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항공기 이용을 줄이는 추세다. 지난 10일
프랑스 하원은 열차로 2시간30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의 국내선 항공 운항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오스트리아 행정부는 지난해 6월 350㎞ 미만 항공권에 30유로의 고정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스웨덴에선 2017년부터 ‘플뤼그스캄’(항공기 여행의 부끄러움)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비행기를 타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비행기 대신 기차 등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하려는 운동이다.
항공업계 “코로나 시대 경영난 속 찾은 자구책”
항공업계는 해외여행길이 막힌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항공사 매출에서 국내선보다 국제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국제선 운항이 사실상 막히다시피 하면서 찾은 자구책이라는 것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28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항공업계 매출에서 국제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이다. 국내선과 비교해보면 4배가량 차이가 난다. 국제선 운항이 거의 불가능해져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 선택한 해법이 무착륙 비행”이라고 했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7개 국적 항공사에서 8000여명의 승객이 무착륙 비행을 이용했다. 이런 수요가 관련 업계 매출 증대와 고용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항공기 조종사들이 의무 비행시간을 채워야 하는 문제도 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종사들은 90일 안에 해당 기종의 이·착륙을 각각 3회 이상 경험해야 한다. 해당 기종을 직접 운항하지 않아도 시뮬레이터(모의비행장치) 훈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
문제는 항공기 기종별 시뮬레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항공사의 경우다. 이 경우 조종사가 빈 비행기라도 띄워서 비행 경험을 충족시켜야 한다. 또 다른 항공업계 관계자는 “조종사들은 한달에 일정 시간 비행을 해야 자격 유지가 되는데, 시뮬레이터로만 그 경험을 채우긴 어렵다. 안 그래도 항공사업이 바닥 이하로 내려가고 있는데 빈 항공기를 띄울 순 없고, 항공기를 놀리면 정비 비용이 오히려 더 든다.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 승객을 태우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항공기 여행으로 내뿜은 탄소, 나무심기 후원으로 상쇄하기도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기 이용 사이 절충안을 찾으려는 노력도 있다. 승객이 항공편 이용으로 배출하게 된 ‘자신의 이산화탄소’를 환경보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상쇄하는, 일종의 ‘탄소중립 비행’을 하는 것이다.
세계 최대 항공사인 독일 루프트한자는 지난 19일 ‘컴팬세이드’(Compensaid) 플랫폼을 통한 이산화탄소 중립 비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컴팬세이드란 루프트한자가 구축한 디지털 이산화탄소 보상 플랫폼으로, 여행자가 항공편을 입력하면 해당 여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알려주고 상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나무 심기 등 기후보호 프로젝트’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 사용’ 등으로 상쇄가 가능하다. 프로그램 참여 탑승객은 인증서를 발급받아 SNS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수치스러운’ 비행이 아니라는 것을 알릴 수 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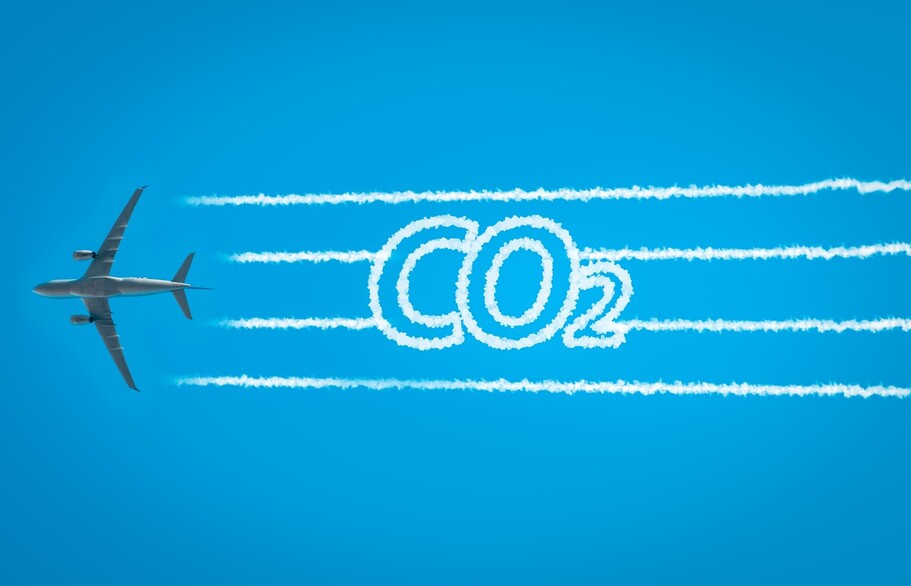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포토] 송도서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시작…74개국 참여 [포토] 송도서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시작…74개국 참여](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3/0828/53_16932051072384_2023082850210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