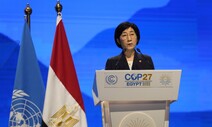덴마크 코펜하겐 제15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회의(COP15) 폐막일인 2009년 12월18일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맨 오른쪽)을 비롯한 주요국 정상들이 회의장인 코펜하겐 벨라센터의 작은 방에 모여 합의문 문안을 조율하고 있다. 연합뉴스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회의(COP15) 폐막일인 2009년 12월18일.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정상 20여명이 회의장인 벨라센터 전시장 구석 작은 방에 모였다. 자신들이 파견한 협약 대표단이 같은 달 7일 회의 개막 이후 이어온 기후협상이 성과 없이 끝나는 것을 막기 위해 나선 것이다. 주요국 정상들이 창문도 없는 창고 같은 방에서 의자가 없어 다 앉지도 못한 채 합의문에 담길 내용을 직접 조율하는 것은 다른 주제의 국제회의나 정상회의에서는 보기 어려운 모습이다.
코펜하겐 기후회의는 2007년 인도네시아 발리 제13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회의(COP13)에서 정한 이른바 ‘포스트 교토 체제’ 협상의 마감시한이었다. 포스트 교토 체제는 선진국들에만 감축 의무를 부여한 교토의정서 후속 기후변화 대응 체제를 말한다. 2012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의 후속 체제가 제때 마련되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은 혼란에 빠질 위험이 있었다.
국제사회는 발리에서 어렵게 타결된 협상 로드맵 ‘발리행동계획’에 따라 2년간 협상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다. 코펜하겐 회의를 두고 ‘지구를 구할 마지막 기회’라는 표현까지 나왔지만, 회의 개막일이 가까워 질수록 국제사회에는 오히려 회의에 대한 비관론이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러다 회의 개막 10여 일을 앞둔 11월25일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202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보다 17% 이상 줄이는 내용의 정책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감축 목표 제시를 거부해온 중국도 다음날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원단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45%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호응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60여명 정도 될 것이라던 정상급 참석자가 100명이 넘을 것으로 알려지고, 회의 초반 잠깐 다녀갈 것이라던 오바마 대통령이 폐막 직전 협상에 참여하기로 하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이란 기대감이 일었다. 이런 기대는 결국 큰 실망으로 바뀌었다.
개도국에도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된 의장국 작성 협상 초안이 공개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은 초반부터 날카롭게 충돌했다. 이 대립은 회의 폐막 4일을 남기고 개도국들이 회의 보이콧을 선언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폐막일을 하루 넘겨 전체 회의에 넘겨진 합의문 초안은 미국과 중국,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개국의 합의를 기초로 마련됐다.
온실가스 배출 대국들이 주도한 합의안이 나왔지만, 포스트 교토협상의 핵심인 ‘2012년 이후의 감축 계획’이 담기지 못했다.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내로 억제하는 목표를 제시한 것이 주요 성과라면 성과였다. 그러나 합의문 작성 과정에 소외됐던 나라들의 반발로 구속력 있는 공식 문서로 채택되지도 못했다. 이에 따라 모든 나라가 합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자 기후협상’에 대한 회의론이 불거지는 계기가 됐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