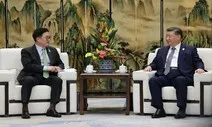[박근혜 정부 2년 진단] ① 국정운영
문고리 권력 키우는 ‘서면 통치’
문고리 권력 키우는 ‘서면 통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1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독대 한번 못하고 떠난 수석도
쌍방향 아닌 선택적 일방통행 소통
세월호 때 ‘대통령의 7시간’ 논란 3인방 안 거치곤 닿을 방법 없어
결국엔 ‘정윤회 국정개입’ 파문
“교체하라” 여론 들끓어도 모르쇠 대면보고를 대신하는 건 서면보고다. 박 대통령의 ‘보고서 사랑’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유명했다. 서울 삼성동 자택 밖으로 잘 나오지 않았던 박 대통령은 집에 있는 팩스로 측근들의 보고를 받았다.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 때 언급한 ‘전화 한 통’은, 보고서를 받아 보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지시할 일이 생긴 뒤에야 비로소 이뤄지는 ‘소통’이다. 박 대통령의 한 핵심 참모는 “대통령이 일단 궁금한 게 생기면 30분이든 한 시간이든 수시로 전화로 자세히 물어본다. 그러다가 관심사에서 멀어지면 오는 전화가 딱 끊긴다. 그 때문에 어떤 이들은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오해하는 일이 종종 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의 ‘전화’는 쌍방향 소통이 아닌, 박 대통령의 선택에 따른 일방통행인 셈이다.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나 정당 대표였을 때는 ‘서면보고’로 상징되는 이런 소통 방식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된 상황에서는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일 불거진 ‘박 대통령의 7시간’ 논란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21회(국가안보실 10회, 비서실 11회) 보고를 받았지만 모두 서면과 전화를 통해 이뤄졌을 뿐 대면보고는 없었다. 세월호 침몰에 대한 첫 대통령 보고는 침몰 속보가 나온 지 40분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국가적 재난이 발생해 현황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해 긴밀하게 소통해야 하는 순간에,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보고서에 매달린 것이다. 참사 발생 8시간이 훌쩍 넘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한 박 대통령이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들을 발견하거나 구조하기가 힘이 듭니까?”라고 엉뚱한 질문을 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가뜩이나 폐쇄적인 청와대의 구조에, 보고서를 선호하는 박 대통령의 스타일까지 더해진 결과가 바로 ‘문고리 권력’의 비대화다.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정호성 부속비서관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절부터 박 대통령을 보좌해온 이재만 총무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을 거치지 않고선 제아무리 ‘측근’이라도 박 대통령과 연락이 닿을 방법이 없다는 게 여권의 ‘정설’이다. 당대표를 지내던 때부터 그랬고, 대통령이 된 뒤엔 더 심해졌다. 지금껏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왕실장’, ‘기춘대원군’이란 별칭으로 현 정부의 2인자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소통 방식의 탓이 크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서면보고’를 고집하며 다른 의견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서를 전달할 수 있는 위치의 비서실장과 3인방의 위세가 막강해진 것이다. 결국 박 대통령의 ‘서면보고’는 지난 2년 정권을 괴롭혔던 ‘불통’과 ‘비선’, ‘수첩’과 ‘밀실’ 등의 단어와 같은 의미이고 ‘박근혜 리더십’의 요체라는 얘기다. 지난해 말 불거진 ‘정윤회씨 국정 개입’ 문건 파문 이후 김 실장과 문고리 3인방을 교체하라는 여론이 커진 것도 사실은 박 대통령의 이런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여전히 이런 요구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의혹을 이유로 내치면 누가 내 옆에서 일할 수 있겠느냐”며 3인방을 감쌌고, 김 실장은 “아직 할 일이 남았다”며 교체를 거듭 미루면서 명예로운 퇴진에 공을 들이고 있다. 비박근혜계로 분류되는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인사는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측근들의 교체를 요구한 것인데, 박 대통령은 ‘측근들이 비리와 사심이 없다’며 본질을 피해갔다”며 “박 대통령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기 싫다는 거고, 지금껏 유지했던 국정운영 방식도 바꿀 뜻이 없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짚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이재명, 연설 중 국힘 고성 지르자 “들을게요, 말씀하세요” [현장] 이재명, 연설 중 국힘 고성 지르자 “들을게요, 말씀하세요” [현장]](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0/3417391597536201.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