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지민 | 전국팀 기자
‘이들은 무서울 정도로 내 일과 남의 일을 나눈다. (…) 상사가 술 먹으러 가자고 해도 선약이 있다고 거부하고, 상사보다 먼저 퇴근하는 일 등은 이제 더 이상 얘깃거리가 아니다.’
누구 이야기일까? 지난 몇년 언론,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숱하게 다뤄진 ‘엠제트(MZ)세대’ 특징 아니냐고? 틀렸다. ‘엑스(X)세대’(1970년대생)에 대한 설명이다. 27년 전인 1997년 1월17일 매일경제에는 ‘엑스세대 ‘나’만 있고 ‘우리’는 없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를 보면, 회사에서 24살 막내 직원이 다음날 마감인 일을 하느라 정신없는 대리를 남겨두고 정시 퇴근하고, 전화가 아무리 울려도 자신에게 온 전화가 아니면 받지 않고, 타 부서 부장이 부탁한 일을 거부하는 모습 등이 나온다. 이어지는 기자의 설명. “엑스세대가 사회에 진출하면서 직장에서 이들과 상사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신세대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다.” 어째 엠제트세대를 다룬 기사나 글에서도 비슷한 평가를 본 듯한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얼마 전까지 ‘90년생이 온다’고 난리였던 것 같은데, 이젠 ‘2000년생이 온다’고 한다. 기성세대 시각에서 2000년대생 세대를 분석한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지난 5~6년, 사무실에 온 90년대생, 학부모가 된 90년대생, 소비자가 된 90년대생 등 여러 관점에서 90년대생을 살핀 책이 쏟아졌다. 함께 일할 90년대생을 이해해보자는 취지로 냈다지만, 당사자로서 공감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이제 새로운 타깃이 된 2000년대생들은 자신들에 대한 평가에 얼마나 공감할까? ‘엠제트세대’라는 규정에 피로감을 느끼는 20~30대도 적지 않다.
그래서 궁금했다. 과연 앞 세대들은 더 앞선 세대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옛 신문기사 검색서비스에서 ‘엑스세대’ ‘엔(N)세대’ 등을 쳐봤다. 1994년 4월7일 경향신문 ‘엑스세대 탤런트 연기력도 엑스(X)’라는 기사에서는 얼굴만 잘생기고 연기에 깊이가 없는 젊은 연기자들을 비판했는데, 언급된 배우들이 이병헌, 이정재 등이다. 젊은 배우가 경력이 쌓인 배우보다 연기의 깊이가 부족한 건 자연스러운 일 아닐까? 그들도 나이가 들고 경력이 쌓이면서 연기력이 늘고 연기에 깊이가 생기지 않겠는가. ‘아날로그식 삶을 거부한다 컴퓨터+인터넷…고개드는 엔세대’ 등 인터넷 소통이 익숙한 세대를 분석한 기사도 수두룩했다. 컴퓨터·인터넷이 스마트폰 등으로 바뀌었을 뿐 분석 내용은 지금과 다르지 않았다.
‘극도의 이기주의로 치닫고 있는 이들이 관리자의 자리에 오를 경우 과연 어떻게 조직을 운영해 나갈지 궁금해진다.’ 첫 문단에서 소개한 기사의 마지막 문장이다. 27년 전 우려와 달리 여전히 조직은 굴러간다.
새해엔 나이를 묻는 일이 많아진다. 나이를 듣고는 “너도 엠제트니?”로 시작해 평소 갖고 있던 손아랫사람에 대한 불만을 “요새 다 그러니?”란 말로 마무리하는 일이 벌어지곤 한다. 그 내용은 1997년 매일경제 기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해하고 갈등을 줄여야 한다며 세대 분석에 나선다. 90년대생, 2000년대생이 오는 게 아니다. 조직에 그저 새 ‘젊은이’가 오는 것이다. 그 자연스러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세대 분석보다 세대 갈등을 줄이는 길 아닐까.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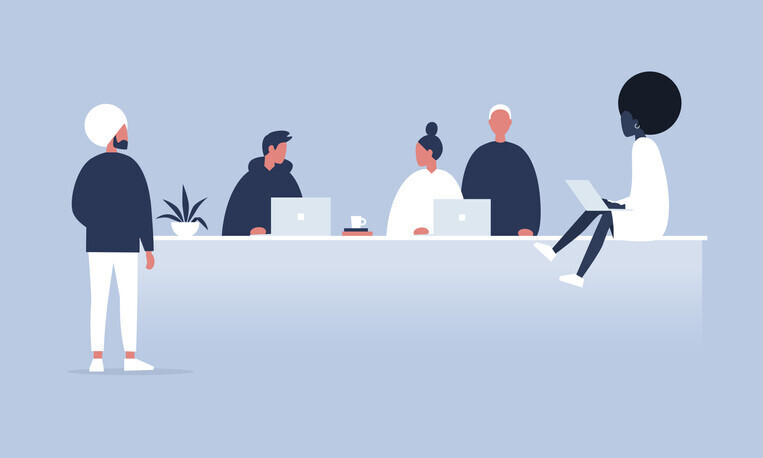

![[슬기로운 기자생활] 나의 뱃살은 누구의 책임인가 [슬기로운 기자생활] 나의 뱃살은 누구의 책임인가](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8/53_17055738623288_20240118503628.jpg)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2/20250212500150.webp)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2715.webp)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3664.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