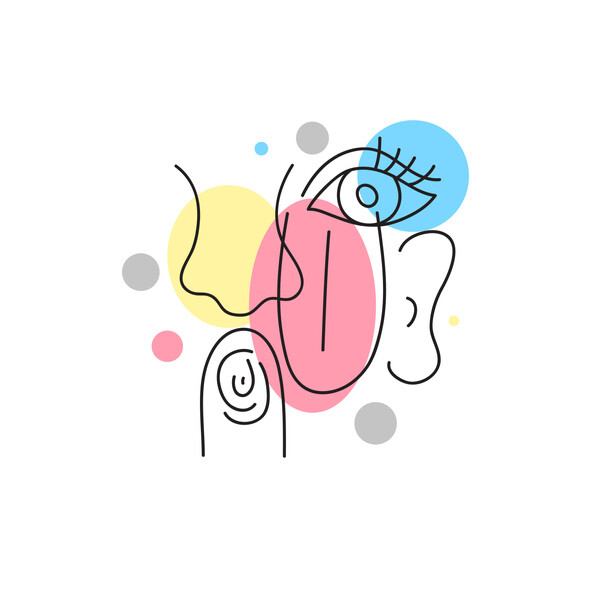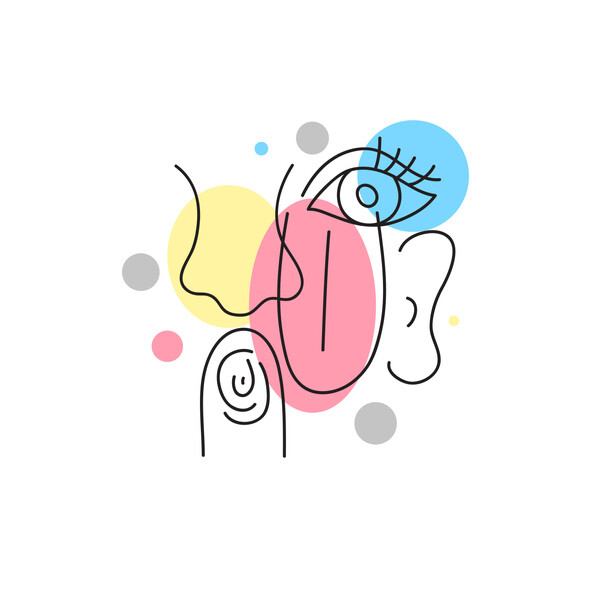김진해 | 한겨레말글연구소 연구위원·경희대 교수
인간은 몇가지 감각기관으로 이 세계의 존재를 알아차린다. 오감으로 불리는 눈, 귀, 코, 혀, 몸을 통해 형태, 소리, 냄새, 맛, 촉감을 알아차린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맡고, 혀로 핥고, 몸으로 느낀다.
잠깐만 생각해 봐도, 오감 중 어느 하나만으로 존재를 알아차리는 경우는 드물다. 여러 감각을 동시에 동원한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을 눈으로 보지만, 그와 동시에 그 사람이 문을 열며 내는 소리를 듣고, 그가 몰고 온 향취를 맡고, 옅은 바람의 진동도 함께 느낀다.
그런데도 인간의 말은 단순하다. 말은 감각을 선택적으로 표현한다. 여러 감각이 함께 작동하는데도 어느 한 감각만을 대표로 삼아 표현한다. 예를 들어 ‘연극을 보다.’ 무언극이 아니라면 연극은 배우의 연기를 보면서 그가 내뱉는 대사를 듣는다. 그런데도 우리는 연극을 보러 간다고 하지, 들으러 간다고 하지 않는다. 영화도 보고 ‘음악’ 연주회도 보러 간다. 반면에, ‘수업을 듣다’는 어떤가. 학생은 교실에 앉아서 선생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의 말을 듣는데도, 수업을 본다고 하지 않는다. 듣는다고 한다. 배움은 듣는 것이다.
감각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다. 혀가 문제다. 눈으로 대상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몸으로 감촉을 느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혀는 다르다. 혀로는 맛을 핥지 않는다. 맛을 본다! 맛을 본다고? 간을 본다고? 혀 어딘가에 눈이 달려 있을지도 모르지.
‘맛을 보다’라는 말을 혀에 올려놓고 굴려본다. ‘맛을 핥는’ 것보다 정겹군. 언어는 얇은 종이처럼 잘 구겨진다. 왜 이런 모양으로 구겨졌는지 모를 때도 잦다. 모르는 것은 모르는 채로 남겨둘 수밖에 없다. 사람이 그런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