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풍모방 여공·노동사 기록
장남수, 만학 뒤 60대 첫 소설집
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소설
“노동자 언어로 딸들 위해 쓸 것”
장남수, 만학 뒤 60대 첫 소설집
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소설
“노동자 언어로 딸들 위해 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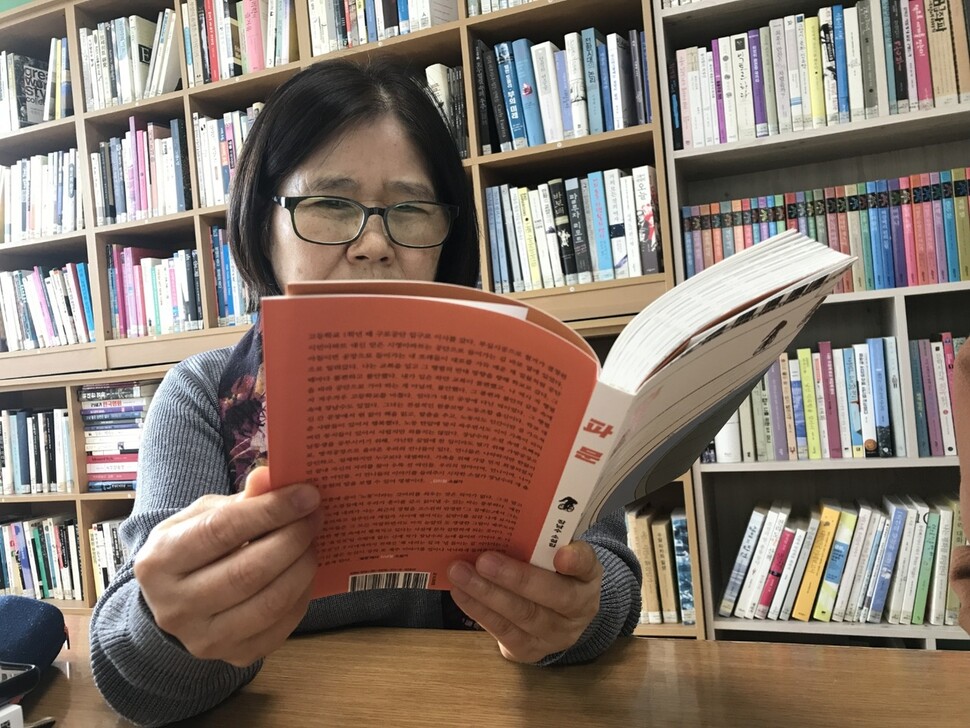
첫 소설집 <파문>을 펼쳐 보는 장남수 작가. 작가 제공

장남수 지음 l 강 l 1만4000원 이 소설집 단편들엔 신진 작품에서 흔히 보는 서사적 배치의 기교나 장치가 그닥 없다. 겨울 다 내어준 논밭처럼 나직한 서술로 속 얘기를 펼쳐 보인다. 독자에게도, 인물에게도 돌부리가 없고 함정이 없다. 악인이 없다. 그러니 복선이랄 것도 없어 보인다. 복선 하나가 아주 버젓이 있긴 하다. 작중 인물들 거개의 이력, 공단의 여공 출신. 주변 인물 여럿도 “촌에는 땅이 없고 도시에는 집이 없”는 70~80년대 도시 공장 노동자들이었다. ‘여공’은 눈에 보이는 사실이 아니라, 여공이 아닌 중년 시절에도 스스로 소스라치며 먼저 감지하게 되는 정체성이다. 근현대를 떠받친 냄새, 그러나 콘크리트로 발라버린 저류의 물소리와도 같다. 이것을 우리 모두 이제 잊거나 혹 부정하며 사는 ‘서민’의 ‘서민성’이라 해두자. 단편 ‘엄마의 빛’의 중년여성 미수는 시골서 혼자 제사상을 차리는 엄마에게 심통이 난다. 장사로 바쁘다는 자매들, 임박해 손님처럼 나타나는 중견기업 관리자인 남동생, 아이들과 미국 가 있는 올케가 아니라, 그러면서도 늘 자신에겐 일찍 와 힘이 되어줬다고 말하는 엄마, 아내 없는 남동생은 다시금 ‘엄마의 아들’이 되고 그런 아들에게 거듭 충실한 그림자가 된 엄마에게 심통이 나는 거다. 공장 경비직을 구해 가족들이 서울 단칸방으로 이사해 갈 때 국민학생이던 미수만 시골에 남겨져 담벼락에나 기대 울었다. 중학교 진학을 못 한 채 교복 입은 친구들을 피해 다니다 열다섯(1972년께)에 삼촌 아이를 돌보는 보모로 상경했을 때도 부모 형제와는 떨어져 살았다. 사촌 아기를 업은 채 갈 데도 아는 데도 없는 미수는 가족의 단칸방 동네를 찾아가곤 했다. 요양보호사로 이번엔 정말 바빠 못 간다고 해놓고서 미수는 또 그 엄마의 시골로 가 전을 굽는다. 그날 ‘옆집 아재’한테 몸이 허청대는 말을 듣는다. 남동생 자식들 교육비 댄다고 엄마가 논을 판 것. 미수는 생각한다. 공장에 다니던 19살 여름, 휴가 맞아 외갓집 제사에 엄마와 단둘이 찾아가던 산길. 차도 없어, 컴컴해 소름 돋던, 해서 엄마 손을 잡고 “두려움 저편의 일상”을 마구 얘기했던 그 길. 노조가 있어 좋고 노조 사무실에 책이 많아 진짜 좋다고, 퇴근 뒤에 학원에 가서 공부도 한다고. 기억이 난다. 그때 엄마의 말과 손길. 이 소설은 엄마와 아들의 사이를 슬피 그려낸 이청준의 소설 ‘눈길’을 떠오르게 하는데, 뜻밖에 듣게 되는 서로 다른 두 갈래의 엄마 얘기로 미수의 마음에 일어난 파문이 그렇다. 엄마의 ‘빚’이 엄마의 빛으로 전이되는 여자와 여자 사이란 게 ‘눈길’과 다른데, 그 다름은 애틋하다. 상투적인 가난의 회고로 처연함이 가능한가, 그게 뭐라고. 하다면 다른 단편 ‘그기 머라꼬’를 볼 만하다. 두 구절로도 부족함이 없겠다. ‘그 엄마’가 ‘그 딸’에게 생애를 구술하는 형식이 소설의 처음부터 끝이다. “…그게 참 미안타. 딸이라꼬 집에서도 일만 시키고 공장에 보내고… 동생들만 안고 서울 가는 부모를 응석도 못 부리고 바라보기만 했제? 내도 다 안다… 니도 부모 속 많이 썩있다꼬? 그기 뭐 니 탓이가, 더러분 시상 탓이지.” “…니가 시퍼런 옷을 입고 가슴에 표 딱지 같은 걸 달고 나오는데 먼 말을 하겠노. 아부지가 빨개이 안 들어가고 한 시절을 넘깄더니 딸이 빨개이 소리를 듣는다 싶고… 유리 앞에서 니가 여기는 밥도 제때 잘 주고 책도 실컷 읽을 수 있고 야근도 안 해서 잠도 실컷 잔다고, 걱정 말라꼬 그리 당돌한 소리를 한 기 내 안 잊힌다… 내도 니 아부지가 울 줄은 생각도 못했다… 니는 그때는 에미 애비 억장 무너지는데도 상글상글 웃더만 와 이제 우노?” 두 단편은 닿아 있고 ‘엄마의 빛’에서 듣지 못한 더 많은 말이 ‘그기 머라꼬’에서 들린다. 이 말들엔 선후가 없다. 여공 출신 중년여성의 가난이 여전할 때의 자존심과 허세(‘물들인 날’), 가난이 덜해졌을 때의 성마른 여유나 오지랖(‘가이드’) 따위도 작가가 몸소 맡은 도시 서민의 냄새다.

원풍모방 노동조합 노동자들이 연행되어 가는 모습. 오픈아카이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archives.kdemo.or.kr/intro/archive) 갈무리

원풍모방 노조 농성 당시. 민주로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minjuroad.or.kr) 갈무리
후기 딸들을 위한 여공의 소설 쓸 결심
노동소설은 읽히지 않는다. 어떤 명칼럼도 “노조”가 제목에 들어가면 클릭 되지 않는다. 그래서는 아니지만, 장남수 작가는 “노동운동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 12일 <한겨레>에 말했다. 이런 뜻이다. “함께 민주화운동을 했던 이들은 총리도 장관도 하고 우리도 내 일처럼 좋아했지만, 40년 동안 우린 늘 그 자리에서 빌딩 청소하고, 때를 밀고… 모험하는 노동을 해요. 이런 이야기까지 기록이나 에세이로는 절대 못 쓰겠어요. 역사는 지식인 중심으로 쓰이고, 소설에 간혹 등장하는 노동자 얘기는 늘 정말 다른 사람이 쓴 먼 얘기 같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서 아는 얘기로 우리 딸들이 읽는 글을 쓰고 싶거든요. 그래야 젊은이들도 어떤 희생들로 민주화가 이뤄진 것인지 아는 민주시민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노동자 소설은 읽혀야 한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피임법 전수하다 체포된 생어, 그가 포착한 ‘새로운 여성’ [책&생각] 피임법 전수하다 체포된 생어, 그가 포착한 ‘새로운 여성’ [책&생각]](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3/0113/53_16735729323161_20230112503877.jpg)
![[책&생각] 괴이하고, 희귀하고, 폄하된 것들을 찾아 [책&생각] 괴이하고, 희귀하고, 폄하된 것들을 찾아](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3/0113/53_16735714488436_2023011250392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