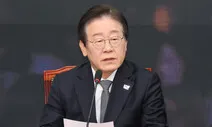한겨레21 916호
[S라인] 런던올림픽으로 가는 아프가니스탄 최초의 메달리스트 로훌라 니크파이
“나라가 평화 되찾고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면 좋겠다”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 인근에는 시민들이 ‘코에 텔레비전’이라고 부르는 산이 있다. ‘코에’는 아프간어로 ‘산’이라는 뜻이다. 산 정상에 TV 송신탑이 있어 이런 이름이 붙었다. 높이 500m가량이지만 이 산을 오르기란 만만치 않다. 카불 자체가 해발고도 1800m가 넘는 고산지대이기 때문이다. 가격한 뒤 ‘미안한 표정’으로 물러서던 그들 주말마다 이 산을 오르는 이들이 있다. 아프가니스탄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들이다. 대표팀의 유일한 한국인인 민신학(40) 감독이 앞장을 선다. 민 감독은 2005년 12월 아프가니스탄 국가대표 감독으로 초빙됐다. 그의 눈에 비친 아프간 선수들의 첫인상은 ‘너무 착하다’였다. “상대를 가격한 뒤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뒤로 물러서더군요.” ‘독기’를 길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주말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산을 오르는 훈련 프로그램을 짰다. 수도 카불 위주의 대표 선발을 전국 10개 주로 확대했고, 체계적으로 대표팀을 관리했다. 그 결과 ‘한 번 차고 물러서는’ 차원이던 아프간 태권도 선수들의 기량은 길지 않은 시간 안에 국제 수준에 도달했다. 그리고 2008년, 베이징올림픽 태권도 58kg 체급에서 로훌라 니크파이는 동메달을 따내며 아프가니스탄 역사상 최초의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됐다. 니크파이는 2012년 런던올림픽에 다시 출전한다. 목표는 금메달이다. 7월2일까지 한국에서 전지훈련을 한 뒤 귀국해 7월5일 런던행 비행기를 탄다. 그와 동료 네사르 아흐마드 바하위는 올림픽 출전이 확정된 아프간 선수 3명 가운데 2명이다. 3천만 명 가까운 아프간 인구에 견줄 때 3명은 매우 작은 수치다. 하지만 1979년 소련 침공 이후 30년 넘게 전쟁에 시달린 나라의 국민에게 올림픽의 의미는 가까이 와닿을 수 없었다. 하자르족 출신인 니크파이는 1987년 카불에서 태어났다. 이소룡의 열렬한 팬이던 그는 10살 때 태권도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본격적으로 태권도 선수로 커리어를 쌓은 곳은 이란이었다. 니크파이는 2000년대 초 가족과 함께 전쟁을 피해 이란에 정착했고, 아프간 망명자팀 소속 선수로 태권도를 익혔다. 니크파이 가족은 2004년 카불로 돌아왔지만 고향은 태권도 선수 니크파이가 기량을 마음껏 펼칠 만한 환경이 아니었다. 매트리스가 깔려 있는 도장도 드물었다. 민 감독은 “대표팀 훈련이 끝나면 차로 선수들을 집으로 데려다줬다. 니크파이는 길가에서 펌프를 발견하면 차에서 내려 물로 배를 채우곤 했다”고 말했다. 지금 니크파이는 아프간의 국민 영웅이다. 아프간 국민은 한국인이 1966년 김기수의 첫 복싱 세계 타이틀 획득 때 느꼈던 감정으로 그를 바라본다. 동메달 획득 이후의 변화에 대해 니크파이는 “처음으로 대통령과 악수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다. 아무도 그에게 올림픽 메달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 자신도 그랬다. 니크파이는 “무엇보다 더 많은 아프간 사람들이 스포츠에 참여하게 돼서 기쁘다. 과거보다 어린이들이 운동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어땠을까. 니크파이는 “전쟁 중에 어린이들이 스포츠를 즐긴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니크파이가 메달을 딴 뒤 많은 아프간 부모들이 자녀를 체육관에 보내고 있다. 스포츠는 오랜 전쟁에 시달려온 아프간 사회를 통합하는 기제가 되고 있다. 바하위는 “태권도를 배우는 여성도 늘어나고 있다. 예민한 문제긴 하지만 더 많은 여성이 스포츠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 정권 시절 여자선수 차별을 이유로 2000년 시드니올림픽 출전권이 박탈됐던 나라다. “재건에 스포츠가 중요한 역할 하기를” 민신학 감독은 “이제 아프간 국민 사이에서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세계 최고의 자리를 겨룬다’는 개념이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따지고 보면 아프간의 올림픽 출전 역사는 짧지 않다. 아프간은 한국보다 12년 빠른 1936년 베를린올림픽에 처음 독립국으로 출전했고, 모두 12차례 대회에 참가했다. 원래 아프간을 대표하는 종목은 레슬링이다. 가장 많은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했고, 니크파이의 동메달 획득 이전 최고 성적도 레슬링(모하메드 에브라히미·1964년 도쿄올림픽 5위)에서 나왔다. 파슈툰족 출신인 바시르 타라키 대표팀 코치는 “아프간 사람들은 매우 강인하다. 그래서 레슬링을 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니크파이나 바하위 같은 젊은 선수는 이런 역사를 알지 못한다. 오랜 전쟁으로 아프간에서 레슬링은 명맥이 끊기다시피 했다. 전쟁으로 무너진 아프간 스포츠의 전통을 지금 흰 도복을 입은 태권도 선수들이 다시 세우고 있다. 니크파이는 “나라가 평화를 되찾고,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면 좋겠다. 재건 과정에 스포츠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태권도 선수로서의 소망”이라고 말했다. 최민규 <일간스포츠> 기자
“나라가 평화 되찾고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면 좋겠다”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 인근에는 시민들이 ‘코에 텔레비전’이라고 부르는 산이 있다. ‘코에’는 아프간어로 ‘산’이라는 뜻이다. 산 정상에 TV 송신탑이 있어 이런 이름이 붙었다. 높이 500m가량이지만 이 산을 오르기란 만만치 않다. 카불 자체가 해발고도 1800m가 넘는 고산지대이기 때문이다. 가격한 뒤 ‘미안한 표정’으로 물러서던 그들 주말마다 이 산을 오르는 이들이 있다. 아프가니스탄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들이다. 대표팀의 유일한 한국인인 민신학(40) 감독이 앞장을 선다. 민 감독은 2005년 12월 아프가니스탄 국가대표 감독으로 초빙됐다. 그의 눈에 비친 아프간 선수들의 첫인상은 ‘너무 착하다’였다. “상대를 가격한 뒤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뒤로 물러서더군요.” ‘독기’를 길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주말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산을 오르는 훈련 프로그램을 짰다. 수도 카불 위주의 대표 선발을 전국 10개 주로 확대했고, 체계적으로 대표팀을 관리했다. 그 결과 ‘한 번 차고 물러서는’ 차원이던 아프간 태권도 선수들의 기량은 길지 않은 시간 안에 국제 수준에 도달했다. 그리고 2008년, 베이징올림픽 태권도 58kg 체급에서 로훌라 니크파이는 동메달을 따내며 아프가니스탄 역사상 최초의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됐다. 니크파이는 2012년 런던올림픽에 다시 출전한다. 목표는 금메달이다. 7월2일까지 한국에서 전지훈련을 한 뒤 귀국해 7월5일 런던행 비행기를 탄다. 그와 동료 네사르 아흐마드 바하위는 올림픽 출전이 확정된 아프간 선수 3명 가운데 2명이다. 3천만 명 가까운 아프간 인구에 견줄 때 3명은 매우 작은 수치다. 하지만 1979년 소련 침공 이후 30년 넘게 전쟁에 시달린 나라의 국민에게 올림픽의 의미는 가까이 와닿을 수 없었다. 하자르족 출신인 니크파이는 1987년 카불에서 태어났다. 이소룡의 열렬한 팬이던 그는 10살 때 태권도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본격적으로 태권도 선수로 커리어를 쌓은 곳은 이란이었다. 니크파이는 2000년대 초 가족과 함께 전쟁을 피해 이란에 정착했고, 아프간 망명자팀 소속 선수로 태권도를 익혔다. 니크파이 가족은 2004년 카불로 돌아왔지만 고향은 태권도 선수 니크파이가 기량을 마음껏 펼칠 만한 환경이 아니었다. 매트리스가 깔려 있는 도장도 드물었다. 민 감독은 “대표팀 훈련이 끝나면 차로 선수들을 집으로 데려다줬다. 니크파이는 길가에서 펌프를 발견하면 차에서 내려 물로 배를 채우곤 했다”고 말했다. 지금 니크파이는 아프간의 국민 영웅이다. 아프간 국민은 한국인이 1966년 김기수의 첫 복싱 세계 타이틀 획득 때 느꼈던 감정으로 그를 바라본다. 동메달 획득 이후의 변화에 대해 니크파이는 “처음으로 대통령과 악수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다. 아무도 그에게 올림픽 메달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 자신도 그랬다. 니크파이는 “무엇보다 더 많은 아프간 사람들이 스포츠에 참여하게 돼서 기쁘다. 과거보다 어린이들이 운동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어땠을까. 니크파이는 “전쟁 중에 어린이들이 스포츠를 즐긴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니크파이가 메달을 딴 뒤 많은 아프간 부모들이 자녀를 체육관에 보내고 있다. 스포츠는 오랜 전쟁에 시달려온 아프간 사회를 통합하는 기제가 되고 있다. 바하위는 “태권도를 배우는 여성도 늘어나고 있다. 예민한 문제긴 하지만 더 많은 여성이 스포츠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 정권 시절 여자선수 차별을 이유로 2000년 시드니올림픽 출전권이 박탈됐던 나라다. “재건에 스포츠가 중요한 역할 하기를” 민신학 감독은 “이제 아프간 국민 사이에서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세계 최고의 자리를 겨룬다’는 개념이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따지고 보면 아프간의 올림픽 출전 역사는 짧지 않다. 아프간은 한국보다 12년 빠른 1936년 베를린올림픽에 처음 독립국으로 출전했고, 모두 12차례 대회에 참가했다. 원래 아프간을 대표하는 종목은 레슬링이다. 가장 많은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했고, 니크파이의 동메달 획득 이전 최고 성적도 레슬링(모하메드 에브라히미·1964년 도쿄올림픽 5위)에서 나왔다. 파슈툰족 출신인 바시르 타라키 대표팀 코치는 “아프간 사람들은 매우 강인하다. 그래서 레슬링을 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니크파이나 바하위 같은 젊은 선수는 이런 역사를 알지 못한다. 오랜 전쟁으로 아프간에서 레슬링은 명맥이 끊기다시피 했다. 전쟁으로 무너진 아프간 스포츠의 전통을 지금 흰 도복을 입은 태권도 선수들이 다시 세우고 있다. 니크파이는 “나라가 평화를 되찾고,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면 좋겠다. 재건 과정에 스포츠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태권도 선수로서의 소망”이라고 말했다. 최민규 <일간스포츠> 기자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