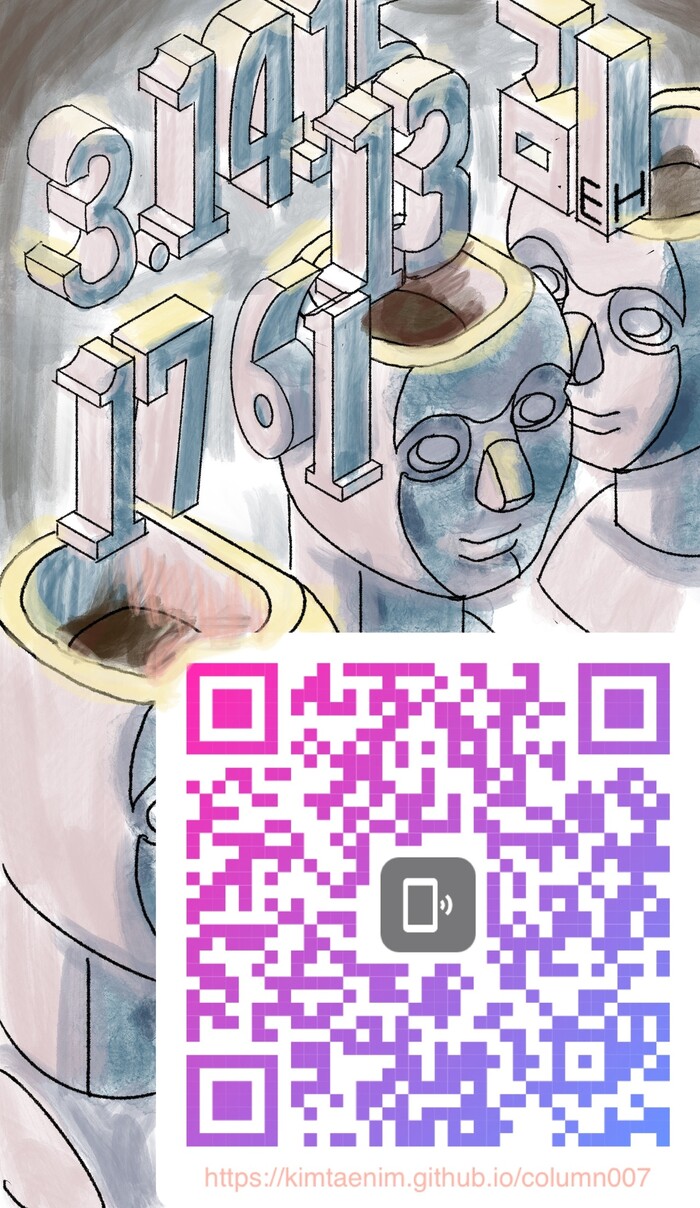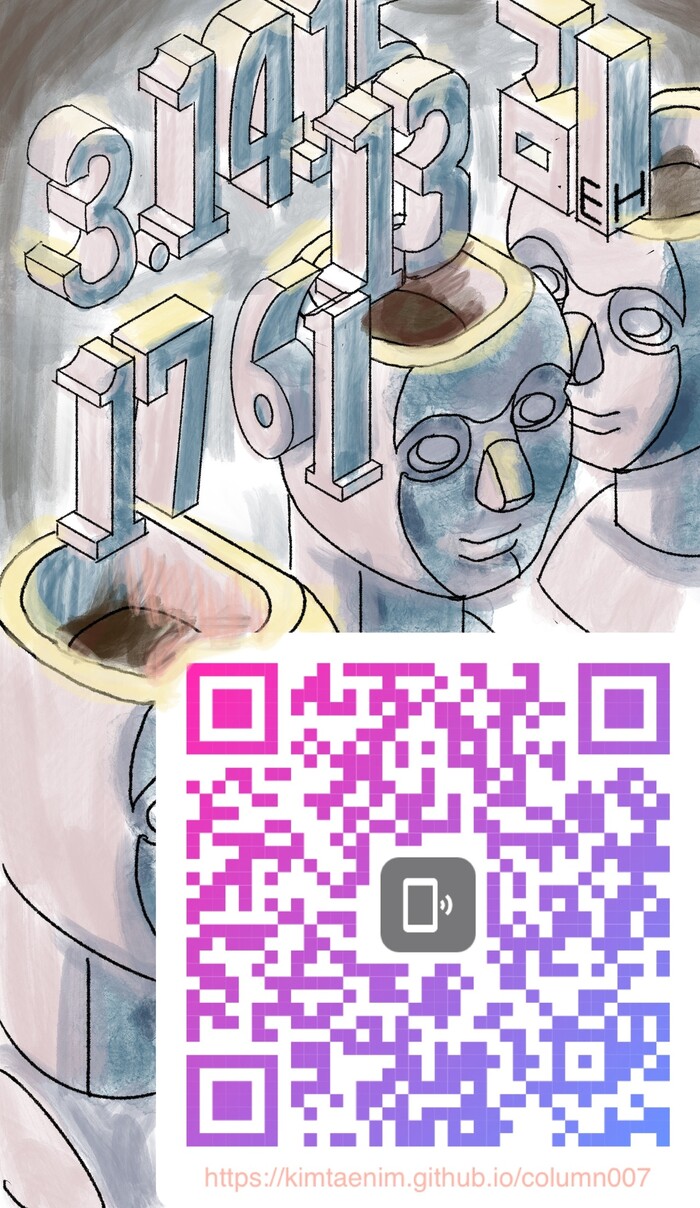아이러니가 있어야 재미있다. 똑똑한 명탐정 이야기는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어수룩한 명탐정은 어떨까. 겉보기에라도 어수룩해 보여야 흥미를 끈다. 애거서 크리스티는 마플 할머니로 체스터튼은 브라운 신부로 독자의 눈길을 끌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기억하는 명탐정은? 초능력 탐정이 사건을 술술 해결하다니 심심한 이야기가 될 것 같다.
그런데 미국의 소설가 데이비드 발다치는 ‘한번 본 일을 절대 잊지 않는 탐정’이라는 설정으로 흥미진진한 미스터리 시리즈를 썼다. 주인공 에이머스 데커는 뇌에 큰 충격을 받은 후 모든 것을 잊지 않는 기억력을 얻었다. 그러나 “이 능력은 축복이자 저주였다.” 어느 날 데커는 집에 돌아와 자기 일가족이 살해당한 현장을 목격한다. “데커는 가족의 처참한 죽음을 언제까지고 아득한 푸른 빛으로 기억할 것이다. 그 기억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데커는 생생한 기억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에 고통을 극복할 수 없었다. 자기 가족을 죽인 범인도 추적할 수 없었다. 형사 일을 그만두고 노숙자가 되어 자기도 따라 죽기만 하루하루 기다렸다. 소설 〈모든 것을 기억하는 남자〉의 첫머리다. 뛰어난 기억력이 사건 해결에 쓸모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방해된다는 아이러니에 우리는 마음이 흔들린다.
기억의 쓸모란? 지난 칼럼에서 나는 기억의 기술을 소개했다.(기억술 게임을 전보다 쉽게 만들어 QR코드로 다시 배포한다) 전에 쓴 다른 글에 비해 인기는 적었다. 예상은 했다. 기억술 이야기를 주위에 하면 사람들은 “그 기술을 익혀서 어디에 쓰냐”고 되묻곤 한다.
옛날에는 쓸모 있는 기술이었다. 경전을 수십 권 외워 인용하고 대본을 보지 않은 채 연설하던 시대에는 그랬다. 손안에 컴퓨터 하나씩 들고 다니는 지금은 아니다. 무슨 일이든 우리는 외울 필요가 없다. 적어도 되고 녹음해도 되고 사진으로 찍어도 된다.
그래도 기억술을 익히면 좋을 때가 있다. 첫째는 숫자를 외울 경우다. ‘촛불(1), 백조(2), 엉덩이(3)’처럼 숫자 열 개에 예약어를 연결해두는 ‘못걸이 기억술’을 소개했다. 이 방법을 확장해 00부터 99까지 백 개의 숫자에 예약어를 만들어 익힐 수 있다. 시험에 잘 나오는 해나 생일이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따위를 외울 때 좋다. 19가 ‘아이쿠’, 42가 ‘가수 싸이’라면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은 ‘아이쿠, 싸이가 한국말 노래 때문에 잡혀갔다’처럼 외울 수 있다.
둘째는 사람 이름을 외울 때다. 앞서 소개한 소설의 지은이 이름은 발다치다. ‘발을 다친’ 사람이 병상에 누워 그의 책을 읽는다고 상상해보자. 주인공은 데커, 몸이 두껍고 체구가 ‘커’ 그렇다. 소설이 재밌으니까 주인공 친구 이름은 재미슨이다. 이 방법은 유머로서는 끔찍하다. 그래도 외우는 일에는 효과가 있다. 다만 “내가 당신 이름을 어떻게 상상해서 외우는지”는 알리지 않는 쪽이 예의에 맞겠다. 나도 어릴 때 ‘태권 브이’라 불리는 일이 지긋지긋했으니.
셋째는 작정하고 기억의 기술을 수련하는 경우다. 기억술을 전문적으로 익히는 사람들은 000부터 999까지 천 개의 예약어로 못걸이를 만들어둔다고 한다. 두 자릿수를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처럼 세 가지로 조합해 여섯 자릿수를 예약어로 만들어두는 PAO시스템이라는 기술도 있다. 공간에 순서를 매겨 못걸이처럼 사용하는 ‘기억의 궁전’ 기억술도 까마득한 옛날부터 이용되던 전통적 방법이다.
끝으로 기억의 기술은 창의력에 도움이 된다. “창의적 아이디어란 오래된 요소의 새로운 조합”이라는 웹 영의 말에 따르면, ‘오래된 요소’가 머릿속에 많을수록 우리는 다양한 조합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 이는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왜 나이 들수록 우리는 창의력이 떨어지는가?
김태권(만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