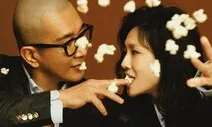▶ 베이비트리 바로가기
우리 아이 세 살 버릇 어떻게 할까요
옛말에 틀린 것이 없다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그렇다. 이 속담 덕에 많은 부모들은 아이에게 꾸중을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다. 그러나 솔직히 답해보자. 정말 세 살 때 보이는 문제 행동 중 어른이 되어서까지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될까? 어른이 된 우리 역시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몇몇 문제 덕분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적어도 우리가 세 살 무렵에 겪던 문제는 아니다. 남들 앞에서도 코를 판다거나, 집안에서 뛰어다닌다거나, 걸핏하면 이를 닦지 않고 자려는 여든 살 할아버지는 상상하기 어렵다.
세 살 버릇 걱정 마세요
유아기의 아이들이 보이는 문제 행동의 대부분은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 아이가 보이는 좋지 않은 모습이란 것이 대부분 발달하는 과정 중에 아직 미숙하여 보이는 문제들이다. 당연히 시간이 가면서 시행착오를 거쳐 교정이 된다.
다행스럽게도 아이들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웬만해선 기가 꺾이지 않는다. 초등학생만 되어도 반복적으로 실패하면 의기소침해지지만 유아는 그렇지 않다. 하긴 아이가 걸음마를 시도하다 몇 번 실패했다고 안 걸으려고 해서야 어찌 걷기에 성공하겠는가? 부모들은 아이가 여러 번 말해도 안 들을 때 답답해하기보다는 오히려 아이가 비판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 비판을 오래 마음에 둔다면 하루에도 수십 차례나 지적을 받고 사는 평범한 아이들은 모두 화병에 걸리고 말았을 것이다.
물론 아이가 화병에 걸리도록 하는 방법이 없지는 않다. 콜롬비아대학의 연구진은 아이들에 대한 부모의 언급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연구를 하였다. 한 그룹은 아이의 잘못에 대해 부모가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비판하였다. 손을 채 깨끗이 씻지 못한 아이에게 “아직 손이 더럽네.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하겠는데.”라고 말해주는 식이다. 다음 그룹은 아이의 잘못을 옳고 그른 판단을 넣어 비판하였다. “그렇게 씻는 것은 제대로 씻은 게 아니야.” 마지막 그룹은 아이에 대해 직접적인 인간적 비판을 하였다. “너는 왜 만날 그런 식이니.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넌 참 문제구나.”
이 아이들에게 같은 유형의 비판을 몇 차례 연속하여 받도록 한 다음 다시 실수하는 상황에 부딪히도록 하였다. 방법에 초점을 맞춘 비판을 들은 아이들은 실수에 크게 실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반면 인간적 비판을 받은 아이들은 무기력해지고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는 모습을 보였다. 옳고 그른 판단을 넣어 비판을 받은 아이들은 그 중간이었다.
실수나 잘못에 대해 인간적인 비판을 받는 경우 아이는 스스로를 나쁜 아이로 인식하였다. 이 아이들은 실수를 할 경우 자신이 나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되는 것처럼 느끼게 되었다. 아이들은 무기력하게 되고 실수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하려 하였다.
지적은 꾸중 아닌 교육으로
재미있는 사실은 칭찬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점이다. 인간 지향적 칭찬, 예를 들어 ‘너는 어쩜 이렇게 착하니’ 하는 칭찬을 들은 아이들은 실패를 하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컸다. 반대로 ‘진짜 열심히 노력했구나.’ ‘제대로 하는 방법을 찾았네.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해보렴.’ 하는 칭찬을 들은 아이들은 실패에도 움츠려들지 않았다. 결국 문제는 ‘칭찬이냐, 비판이냐’가 아니었다. 어떤 칭찬이고, 어떤 비판인가가 중요하다.
아이가 아직 다 크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아이에게 무언가 지적해야 할 순간이 많다. 그러한 지적은 꾸중이 아니라 교육이어야 한다. 우리가 아이가 하는 행동에 짜증이 난다면 아무래도 교육보다는 꾸중으로 가기 쉽다. 내가 하는 일은 아이를 적극적이고 유능한 어른으로 만들려는 교육이지, 하루라도 이 아이로부터 빨리 벗어나려는 답답함에서 하는 행동은 아니지 않은가?
두 가지만 기억하자. 첫 번째 헛된 기대를 버리자. 아이가 문제 행동을 당장 바꾸기를 기대하지 말자. 아이는 내가 말 한 마디 한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다. 바뀔 시기가 되어야 변한다. 아이를 인간적으로 비난하면 아이는 무기력하고 자신을 믿지 못할 뿐이다. 이것은 거꾸로 변화를 방해한다. 우리가 바꿀 것은 아이 그 자체가 아니라 아이의 문제 행동일 뿐이다. 두 번째, 칭찬도 해가 될 수 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지만 아이의 인간적인 면을 반복적으로 칭찬할 경우 아이는 소심한 고래가 될 수 있다. 물가에 나왔다 포경선을 만날까봐 숨이 답답해도 깊은 바다 속에서만 헤엄치는 고래. 그렇게 깊은 물 속에만 있어서야 춤을 추는지, 노래를 부르는지도 알 수 없지 않겠는가?
서천석 서울신경정신과 원장·행복한아이연구소장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단독] ‘체포 시도’ 여인형 메모에 ‘디올백 최재영’ 있었다 [단독] ‘체포 시도’ 여인형 메모에 ‘디올백 최재영’ 있었다](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4/0603/6517174085880818.webp)
![[단독] 대답하라고 ‘악쓴’ 윤석열…“총 쏴서라도 끌어낼 수 있나? 어? 어?” [단독] 대답하라고 ‘악쓴’ 윤석열…“총 쏴서라도 끌어낼 수 있나? 어? 어?”](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5/0205/17387323600959_20250205501763.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