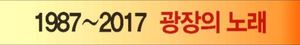[1987~2017 광장의 노래③ 광장, 그후] 세대별 키워드로 본 ‘광장 의미망’
87년을 실패한 혁명으로 기억
성공한 사람 ‘기회주의’자 표현 87년 그림을 보면, ‘나’(자기)와 ‘성공’이 대척점에 서 있다. 87년을 실패로 기억한다는 의미다. 6월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이뤘지만 야권의 분열로 정권교체에 실패했다. 혁명을 꿈꿨던 운동가들도 90년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갈 길을 잃었다. 김도훈 대표는 “87년 세대는 운동을 통한 정치에 모든 것을 걸었던 세대인데, 엘리트 중심의 전위적 혁명을 꿈꾸다 보니 고독만이 결과로 남았다”고 분석했다. 그 시절 ‘성공’한 사람들은 ‘기회주의’자로 표현됐다. “친구들이 희생할 때 나는 기회주의적으로 공부해서 대학원에 들어갔다. 석사 학위를 받고 나서 구속됐지만, 그사이 친구나 선배들이 많이 죽었다. 그 친구들 무덤에 가면 한없이 미안하다.”(김응교) 2008년 세대: 노무현, 분위기, 불안 2008년 세대는 광장에서 ‘노무현’을 만났다. 2004년 엄마 손을 잡고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에 처음 나왔고(이연우), 2009년 5월 노무현 서거 때 대한문에서 그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김기한). “기자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사람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자살하지 않는 세상이라고 했다더라. 근데 노 전 대통령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너무 싫었다. 우리가 바꾸자, 정치인에게 맡길 게 아니라 대한문에 있는 우리 한명 한명이 직접 바꾸자고 소리쳤다.”(김기한) 그러나 냉랭한 주변 ‘분위기’에 ‘눈치’를 보다가 이들은 위축되고 말았다. 각자도생 시대엔 시민권조차 조건과 자격을 갖춘 이들만 누릴 수 있다는 사회 분위기가 팽배했다. 노무현 전대통령 실패가 원인돼
정치적 발언 ‘발전’에 ‘방해’ 인식
불안한 삶의 기반탓 자기검열도 2008년 그림을 보면, 이들은 광장 이후 정치적 ‘입장’을 피력하는 게 ‘자기 발전’에 ‘반대’(방해)된다는 경험을 습득했다. 그 배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패가 자리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 때 정치에 눈을 떴지만, 그가 꿈을 실현하지 못함으로써 깊은 침묵에 빠져들었다. 김 대표는 “2008년 세대는 87년 세대와 일부 공감대를 형성하지만 차이점 또한 분명하다. 불안한 삶의 기반 탓에 정치적 의견을 내놓을 때도 기회비용을 따지고 자기검열을 하고 있다. 고도성장기에 하부구조(사회의 경제적 구조)를 돌볼 필요가 없었던 87년 세대와 확연히 다르다”고 분석했다. 2016년 세대: 민주주의, 사회, 투표 불안이 민주시민 의식을 완전히 잠식하려던 순간, 2016년 세대가 탄생했다. 해도 해도 너무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민주주의’와 ‘사회’, ‘투표’에 대한 관심을 흔들어 깨웠다. 김 대표는 “2016년 세대는 시민 참여의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시민권을 각성하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실마리를 마련했다. 그러나 불안한 하부구조가 얼마나 자신의 삶을 위협할지는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민주주의’ ‘사회’ ‘투표’에 관심
‘승리’해야 ‘권리’ 얻는다 생각 2016년 그림을 보면, 정치적 ‘문제’(국정농단)가 발생하면서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하라는 ‘평화시위’가 열렸다. ‘집회’와 ‘시위’에 참석한 ‘국민’들은 오랜 침묵을 깨고 ‘정치 얘기’를 ‘시작’했고 참된 ‘민주주의’, ‘사회’를 꿈꾼다. ‘민주주의’, ‘사회’는 ‘촛불’과 ‘광장’에서 ‘승리’함으로써 얻어낼 수 있는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한다. 해피엔딩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2008년 광장 이후에 그랬듯이, 불공정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경제 구조는 민주주의를 집어삼키고 각성한 시민에게 ‘주홍글씨’를 새길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이렇게 진단했다. “87년 세대는 정치권력에 의해 억압받았다면, 2008년과 2016년 세대는 경제권력의 굴레에 갇혀 있다. 경제적 안전성을 확보해야 정치적 시민권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다. 정치 이슈를 경제 이슈로 전환해 시민들이 안정적 하부구조를 획득하는 게 중요하다.” 민주주의 사회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기본소득이나 복지를 확충해야 하는 이유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