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시민들은 한강에서 헤엄치고 모래찜질하며 여름휴가를 즐겼다. 사진은 1차 한강개발이 시작한 해인 1966년 여름 한강대교와 노들섬 근처의 백사장에서 피서중인 사람들의 물결. 사진 제공
40년전만해도 피서인파 북새통
“콘크리트 구조물 자연형 바꿔야”
“홍수방지 우선” 안전우려 주장도
“콘크리트 구조물 자연형 바꿔야”
“홍수방지 우선” 안전우려 주장도
한강 평화·생태의 젖줄로 - 수중보·둔치 걷어내면 모래사장 돌아온다 “여름이면 뚝섬, 한강 인도교 아래에 물놀이 인파가 새까맣게 몰려들었어. 끝없이 펼쳐진 백사장에서 모래찜질도 했지. 그러다 겨울이 오면 한강에 스케이트·썰매장이 들어섰었지.” 영등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최종규(55)씨는 서울시민의 사랑을 받았던 ‘40여년 전의 한강’을 이렇게 떠올렸다. 기록으로만 봐도 지금의 동부 이촌동 앞(한강 백사장), 여의도·밤섬 사이(여의도 백사장), 뚝섬 앞 저자도, 압구정동 앞(사평리 백사장), 잠실·부리섬(잠실 백사장), 난지도 등 서울 한강가에는 500만평 이상의 백사장이 있었다. 그 가운데 여의도 백사장과 잠실 백사장은 각각 200만평이 넘었다. 하지만 이 백사장들은 두 차례 한강 개발을 거치며 모두 사라졌다. 1966년 시작된 1차 한강개발 때는 공유수면 매립사업으로 여의도 87만평, 잠실 75만평 등 200만평 이상의 백사장이 육지로 바뀌었다. 1980년대 2차 한강개발에서는 토사 채취와 잠실·신곡 수중보의 설치로 남아 있던 백사장마저 한강물 속으로 사라졌다.
한강 김포대교 하류 쪽에 가로놓인 신곡수중보는 서울지역 한강의 물을 가둠으로써 백사장을 물밑으로 가라앉히고 생태계를 뒤흔들어 놓았다. 뒤쪽으로 김포대교와 행주대교, 방화대교의 다릿발과 아치가 보인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서울과 한강의 ‘명물’이었던 드넓은 백사장을 지금이라도 다시 살려낼 수는 없을까? 노수홍 연세대 환경공학부 교수는 한강 물을 가두고 있는 신곡수중보(총 연장 1007m, 높이 2.4m)와 잠실수중보(총 연장 873m, 높이 6.2m)를 허물거나 보 높이를 낮추자는 제안을 내놨다. 그는 “수중보를 헐어 갇힌 물을 빼내면, 지형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행(뱀처럼 흐르는) 물길이 형성되고 강 한쪽에는 모래가 쌓여 백사장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예전 서울 지역 한강은 장마철 며칠말고는 강물 너비가 연중 200~300m에 그쳤고 수심도 일정하지 않았다. 지금처럼 800~1000m에 이르고 물 깊이가 일정해진 것은 2차 한강개발 뒤의 일이다. 특히 하류인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에 있는 신곡수중보는 한강 물길을 막아 물 깊이를 최소 2. 이상 일정하게 만드는 핵심 시설이다. 신곡수중보는 밀물 때 노량진까지 거슬러오르던 바닷물의 흐름을 김포대교 근처에서 가로막았다. 이 때문에 한강의 백사장과 자연스런 뱀형 물길은 사라졌고, 바다와 강을 오가던 물고기들의 길도 막히고 말았다.
정동양 한국교원대 기술교육과 교수도 “수중보의 문을 모두 열어 갇힌 한강물을 일단 한 번 빼보자”며 “물이 빠지면 한강의 본 모습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한강의 옛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콘크리트로 덮인 둔치와 호안들을 걷어내고 이를 자연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더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현재 74.7㎞의 한강 제방은 200년에 한 번 있을 수 있는 홍수 수위보다 2m 높게 쌓아 치수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 제방(높은 호안) 아래의 둔치와 낮은 호안은 대부분 콘크리트로 덮여 있다. 체육시설과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는 이 구조물들은 한강의 직선화와 생태계 파괴라는 큰 상처를 남겼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가 (주)한조엔지니어링에 맡겨 연구한 〈한강자연성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보고서(2004)〉에서는 “한강 본류가 획일적으로 콘크리트 호안으로 둘러싸여 생태계가 파괴됐다”며 “장기적으로 자연형 호안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봉호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는 “급한 물살의 공격을 받지 않아 모래가 퇴적되는 쪽이나, 한강 본류와 지류가 만나 물살이 약한 곳은 콘크리트를 걷어내 자연형으로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라인강이 지나는 독일 칼스루에시는 강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을 일부 헐어내 범람원(하천주변에 퇴적으로 생기는 편평한 지형)을 만들었다”며 “범람원은 평소에는 습지자연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철재 서울환경연합 운영국장도 “한강과 탄천의 합류부 같은 곳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걷어내도 치수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콘크리트 구조물을 걷어내고 물을 담아둘 수 있는 배후습지를 확보한다면 치수나 자연형 하천 복원 양쪽에서 모두 효과를 거둘 수 잇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강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기에 앞서 안정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덕기 한강시민공사업소 치수과장은 “수중보와 콘크리트 호안·둔치를 걷어내 백사장을 만들면 치수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백사장 등 자연을 복원하는 것도 좋지만 홍수 방지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 |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단독] 박선영이 준 ‘전두환 옹호’ 책 반납하는 진화위 직원들 [단독] 박선영이 준 ‘전두환 옹호’ 책 반납하는 진화위 직원들](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5/0210/17391554418838_5717391554086004.we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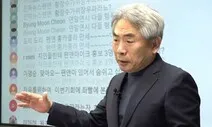

![[단독] 헌재 직권증인 “이진우, 공포탄 준비 지시…의원 끌어내라고” [단독] 헌재 직권증인 “이진우, 공포탄 준비 지시…의원 끌어내라고”](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5/0209/53_17390864130054_20250209501636.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