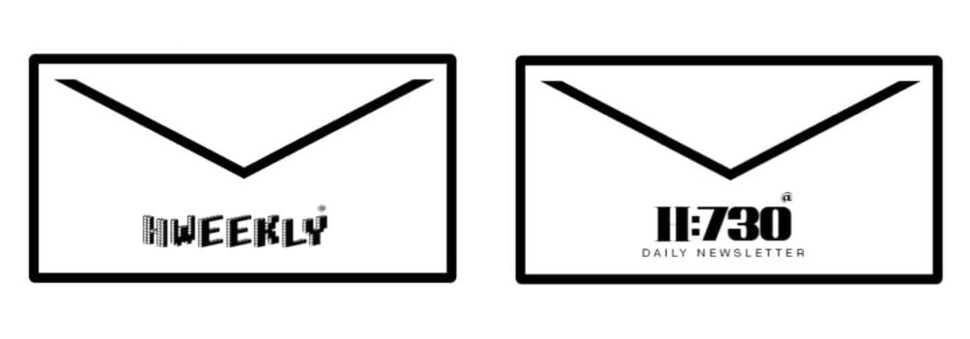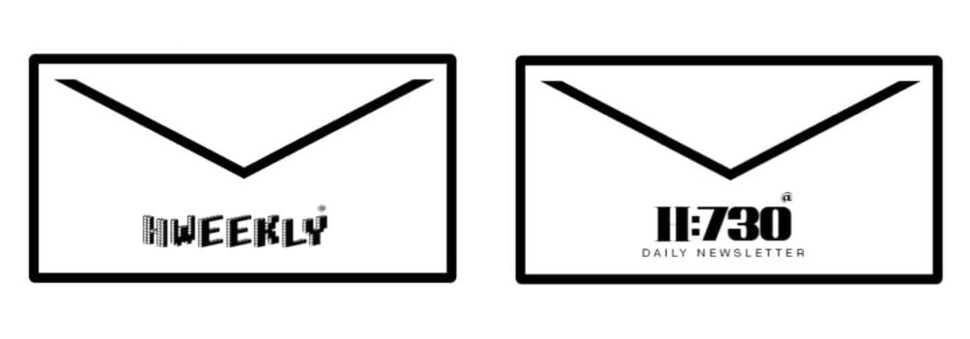<한겨레> 일일 뉴스레터 ‘H:730’(오른쪽)과 주간 ‘휘클리’.
기사 댓글 창을 ‘패싱’한 지 3년여쯤 된 듯합니다. 메일함에 들어온 독자 편지의 제목이 수상쩍으면 숫제 클릭도 하지 않고 슬쩍 휴지통에 옮겨두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한때는 항의 메일에도 마음을 다해 답장을 보냈습니다. 댓글을 읽으며 일희일비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의 품위가 떨어지자 소통의 품위마저 떨어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턴가 ‘비판’이나 ‘꾸짖음’이 아니라 성적 모욕, 욕설, 조롱이 담긴 피드백들이 도달했습니다. 기자 생활 10년, 소통을 그만두었습니다.
지난 1월, 다시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신문사에서 독자와 기자를 잇는 징검다리, ‘뉴스레터’ 서비스 운영을 맡게 됐기 때문입니다. 취재해서 쓰는 일만 해왔는데 비로소 더 잘 포장해서 배달하는 일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한겨레>는 2월22일부터 평일 아침 7시30분 그날의 뉴스를 선별해 독자님의 메일함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일간 뉴스레터 ‘H:730’(에이치칠삼공)입니다. 그에 앞서 1월21일 발간을 시작한 주간 뉴스레터 휘클리는, 중요하지만 다소 복잡한 이슈의 막전막후를 취재기자의 생생한 해설로 전달하는 레터입니다. ‘뉴스 페이퍼’를 10년이나 만들었는데, 뉴스레터를 만드는 경험은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이메일을 통한 소통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영상 등 다른 플랫폼과도 확연히 구별됩니다. 수신자와 발신자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저편의 독자에게 던지는 직구라고 할까요? 뉴스레터 안에서 발신자와 수신자는 알고리즘이라는 잡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됩니다. 끝없이 클릭하라고 외치는 자극적인 뉴스와 광고, 영혼을 좀먹는 악플로부터도 자유로운 소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뉴스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지요.
완전히 새로운 문법에 익숙해지기 위해 뉴스레터 업무를 맡은 뒤 별의별 공부를 다 했습니다. 기사를 쓸 땐 고민하지 않았던 일들이 고민되기 시작했거든요. ‘뉴스레터의 독자는 누구인가?’ ‘어떤 목소리로 독자를 안내할 것인가?’ ‘어떻게 써야 독자들에게 더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가?’ ‘아니 그래서, 요즘 독자들은, 정말 뭘 좋아하는 건가?’ 콘텐츠 제작의 걸음마부터 다시 배우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치학이나 사회학 책들만 꽂혀 있던 책장에 브랜딩과 마케팅에 대한 책들을 꽂아 넣기 시작했고, 토씨만 다른 뉴스들로 채워진 조간신문을 뒤적이던 아침에 나라 안팎의 뉴스레터들을 훑게 됐습니다. 몇년 새 뉴스레터 붐을 타고 쏟아져나온 레터들은 어지간한 매거진보다 알찹니다. 언론사 북 섹션보다 튼실한 책 소개 뉴스레터, 부동산이나 경제 관련 뉴스레터, 엠제트(MZ) 세대의 키워드를 풀어주는 트렌드 뉴스레터 등 기성 언론사 밖에 새로운 콘텐츠 시장이 섰습니다.
철저하게 구독자를 중심으로 써나가는 이 무료 뉴스레터들을 보면서 무엇을 쓸 것인가 이상으로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뉴스이면서 ‘레터’이기 때문에 구독자들의 질문이나 일대일 메일에 답해드리는 고객서비스(CS) 구실도 온전히 맡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친절한 기자’가 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걸음마를 처음 배우는 아이가 단박에 잘 달릴 수는 없습니다. 6개월 동안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좀 더 가벼운 소통을 해보겠다며 ‘반말’로 작성하는 주간 뉴스레터는 되레 문턱만 높인 게 아닌가 후회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피드백이 다수지만 “젊은 척하는 꼰대 같다”는 반응도 날아와 꽂혔습니다. ‘앗, 들켰네.’ 뜨끔했습니다.
‘정치적 올바름’을 강박적으로 추구하는 편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인터넷 언어를 사용하는 대실수를 저지르고 눈물의 반성문도 썼습니다. 낙장불입. 이미 보낸 메일을 주워담을 수 없는 뉴스레터의 세계에서는 작은 실수도 신뢰도를 크게 깎아 먹는 참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이 살얼음판입니다.
내 이름 석자 걸고 기사 쓰는 일이 자존의 전부였던 시절을 지나, 남의 뉴스 배달하는 우편배달원으로 사는 게 갑갑해지는 순간도 있지만 그런 순간들을 견디게 하는 것은 편지를 받아보는 분들의 격려입니다. “휘클리는 기존 신문보다 더 차분하고, 다정하게 알려줘서 정말 좋아.” “올해 가장 잘한 일 중 하나가 H:730 구독한 일입니다.” “뉴스레터를 보는 순간이 참 좋아요. 제게 H:730은 세상 소식을 전하는 우체통임과 동시에 나를 풍요롭게 해주는 문화생활이랍니다.”
기자 밥 먹은 지 10년 만에 비로소 소통한다는 것의 의미를 배워갑니다. 영화 <일 포스티노>에서 집배원 마리오가 네루다 선생님 댁에 편지를 배달하다 그와의 대화로 세상에 눈을 뜬 것처럼요. 그래서 오늘도, 편지 배달하는 일로 아침을 엽니다.
엄지원 콘텐츠기획팀 기자
umkija@hani.co.kr
▶
H:730 구독하기: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70653
▶
휘클리 구독하기: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98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