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9월14일 서울대에서 군 입대 뒤 의문사한 최우혁씨의 장례식이 열리고 있다(왼쪽). 최씨의 부모 최봉규(오른쪽)·강연임씨는 89년 5월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으로 찾아와 ‘의문사 진상규명’ 농성에 합류했다. 어머니 강씨는 91년 봄 끝내 투신으로 아들을 뒤따랐다.
박정기-아들보다 두 살 많은 아버지 82
1991년 3월6일 유가협 회원인 강연임(최우혁의 어머니)이 세상을 떠났다. 강연임은 남편 최봉규와 함께 활동했다. 기독교회관 농성장을 찾아왔을 때 그의 낯빛은 어두웠다. 건강 문제로 농성에 계속 참가하지 못한 그는 박정기에게 입버릇처럼 말했다.
“내가 군대를 보냈기 때문에 우리 우혁이가 그래 됐지요. 우혁인 내가 죽였습니다.”
“어마이, 무신 소립니꺼? 다신 그란 말 하지 마이소.”
그러면서도 의문사 진상규명의 의지는 어느 유가족 못지않았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우혁이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야 말겠습니다.”
최우혁은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다니며 학생운동을 했다. 그는 졸업 뒤 군에 입대하고 싶었지만, 당시 대학생 아들을 둔 여느 부모들처럼 강연임은 하루라도 빨리 아들이 군 복무를 마치기를 바랐다. 최우혁은 87년 봄 입대하기 전 여러차례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강제징집되면 나는 죽어요.”
학생운동 전력의 사병들에 대한 통제와 구타가 극심할 때였다. 최우혁은 보안사의 요시찰 명단에 올라 있었다. 그는 입대한 지 133일 만인 87년 9월8일 의문사했다. 강연임은 아들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 뇌일혈로 쓰러졌다. 병든 몸을 이끌고 기독교회관 농성장에 찾아온 것은 그가 떠난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아들에 대한 죄의식으로 몸져누운 아내를 최봉규는 극진히 간호했다. 강연임은 아들 죽음의 진상규명을 손꼽아 기다렸다. 하지만 국회 의문사 특위는 끝내 무산되었고, 그는 91년 2월19일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실어증과 우울증, 시력상실을 겪고 있을 때였다. 최봉규는 아내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강연임은 보름 만에 한강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다. 한 맺힌 삶을 마친 그의 주검은 마석 모란공원에 안장되었다. 짧은 기간 3명의 유가족을 잃은 유가협 사무국의 활동가들은 회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호소했다.
“요사이 사무국 분위기가 몹시 침울합니다. … 저희 간사들도 속상하고 힘이 없어졌습니다. … 이이동 아버님, 우혁이 어머님이 돌아가신 그때부터일 것입니다. … 어머니 아버지, 더이상 저희들 곁을 떠나지 말아주십시오.”
91년 1월7일 가족교실 입학식이 열렸다. 배움에 목말라하던 박정기는 학창시절로 돌아간 듯 마음이 설레었다.
“모르이 답답할 때가 많지. 우리 어마이 아바지들은 머든 배우고 싶거든.”
유가족들의 배움에 대한 갈증은 박정기와 다르지 않았다. 어머니 아버지들의 요청으로 가족교실을 기획한 박래군이 말했다.
“평소 어머니들이 우리 역사와 시국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 질문을 자주 하셨어요. 자식의 죽음에 대해 좀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어했습니다.”
원래 가족교실의 강사로 교수나 유명 인사를 초빙하려 했다. 가족교실이 열리기 전 월례회의 때 몇 차례 외부 강사를 불렀다. 그런데 강의 내내 유가족들 눈치를 보며 진땀만 흘리다 가곤 했다. 어머니들 수준에 맞춰 설명하는 것도 어려워했다. 외부 강사들은 어머니들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때가 많았고, 어머니들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헤아리지 못했다. 강의를 믿고 맡길 만한 분은 옥중의 문익환 목사밖에 없었다. 결국 유가협의 가족교실을 사무국에서 맡기로 했다. 가족교실의 교장은 박래군, 교사는 정미경과 간사들이었다.
사무국에서 교재를 만들어 수업을 진행했다. 민주화운동사와 현대사, 일제시대 민족해방사, 민중의 역사 등이 주제였다. 전진상 노래모임 회원들이 와서 노래를 가르쳤고 문익환 목사 방북 비디오도 함께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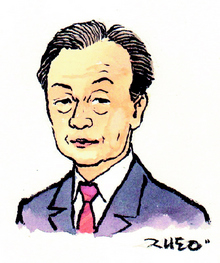 가족교실의 인기는 예상보다 뜨거웠다. 전국 각지에서 어머니 아버지들이 올라왔다. 전영희(김성수의 어머니)는 강원도에서 새벽 눈길을 뚫고 첫차를 타고 찾아왔다. 한울삶 방 안이 가득 차 모두 앉아서 수업을 받을 수조차 없었다. 광주지회, 영남지회의 요청으로 지방에서 수업을 할 때도 있었다. 가족교실이 열릴 때마다 어머니들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났다.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수업을 마친 뒤 유가족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걸 이제야 알았데이.”
“우리 애가 그래서 데모를 했던 거구나.”
가난한 집안의 딸로 태어나 학교에 갈 기회조차 없었던 어머니들은 연필을 들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한순간 행복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희회 고문/구술작가 송기역
<한겨레 인기기사>
가족교실의 인기는 예상보다 뜨거웠다. 전국 각지에서 어머니 아버지들이 올라왔다. 전영희(김성수의 어머니)는 강원도에서 새벽 눈길을 뚫고 첫차를 타고 찾아왔다. 한울삶 방 안이 가득 차 모두 앉아서 수업을 받을 수조차 없었다. 광주지회, 영남지회의 요청으로 지방에서 수업을 할 때도 있었다. 가족교실이 열릴 때마다 어머니들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났다. 질문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수업을 마친 뒤 유가족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걸 이제야 알았데이.”
“우리 애가 그래서 데모를 했던 거구나.”
가난한 집안의 딸로 태어나 학교에 갈 기회조차 없었던 어머니들은 연필을 들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한순간 행복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희회 고문/구술작가 송기역
<한겨레 인기기사>
■ 4대강 달성·고령보 위태…“주저앉을 가능성”
■ 방문진, 김재철 해임안 부결…노조 “청와대 거수기”
■ 라면 좋아하는 남자는 섹스도 좋아해?
■ 삼성가 상속분쟁 이창희쪽도 가세
■ 4.19kg 셋째딸, 쳐다보기 싫었다
박정기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고문
■ 4대강 달성·고령보 위태…“주저앉을 가능성”
■ 방문진, 김재철 해임안 부결…노조 “청와대 거수기”
■ 라면 좋아하는 남자는 섹스도 좋아해?
■ 삼성가 상속분쟁 이창희쪽도 가세
■ 4.19kg 셋째딸, 쳐다보기 싫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휴일 없이 하루 15시간씩, 내 살을 뜯어먹으며 일했다 [.txt] 휴일 없이 하루 15시간씩, 내 살을 뜯어먹으며 일했다 [.txt]](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124/20250124503090.webp)

![“박근혜보다 죄 큰데 윤석열 탄핵될지 더 불안…그러나” [영상] “박근혜보다 죄 큰데 윤석열 탄핵될지 더 불안…그러나” [영상]](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5/0201/17383957080479_2025020150043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