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1월22일 유가협 회원들이 서울시내 거리에 나가 ‘오영자·임분이 회원 석방’을 위한 탄원서에 지지 서명을 받고 있다. 유가족들의 끈질긴 석방 노력 끝에 두 사람은 그해 7월 모두 풀려났다. 사진 박용수 작가
박정기-아들보다 두 살 많은 아버지 76
1989년 7월26일, 박정기는 충남의 홍성교도소로 향했다. 교도소에서 임분이(정연관의 어머니)가 8개월15일 동안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하는 날이었다. 오영자(박선영의 어머니)는 전남의 순천교도소에서 같은 날 출소했다. 실형 선고 뒤 법원은 두 어머니를 교도소를 달리해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감했다.
유가협 회원들은 무리를 나누어 홍성과 순천으로 가 이들을 맞이했다. 순천교도소엔 유가협 광주지회 회원들이 마중나갔다. 박정기는 두 사람이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와 달리 그동안 면회를 자주 하지 못했다.
서울구치소에 있을 땐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가 위로했다. 두 어머니가 끊임없이 옥중 투쟁과 단식을 벌였기 때문에 걱정이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1월 초 서울구치소의 양심수 재소자들이 대부분 석방되었을 때 두 어머니는 양심수가 아니라며 내보내지 않았다. 그땐 항의농성을 벌였다. 임분이가 15일 동안 옥중 단식을 할 땐 이소선, 김대중과 함께 찾아가 단식을 말리기도 했다.
일행은 교도소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기다린 뒤 저녁 무렵에야 임분이가 밖으로 나왔다. 박정기는 교도소 오는 길에 두부를 사오진 않았다. 재범할 일도 없고, 임분이·오영자가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죄수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죄수복을 벗고 새 모시옷으로 갈아입고 나온 임분이의 모습은 밝고 환했다. 박정기는 두 어머니가 지난 8개월 넘게 겪은 힘겨운 일들을 떠올리며 위로했다.
“연관이 어마이, 떠난 자식 죽음의 발자국을 딛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데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한 가족으로 운명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 투쟁을 해야만 좋은 세상이 올 낍니다.”
임분이를 고향으로 떠나보내고 서울에 올라온 박정기는 ‘임분이·오영자 석방대회’를 준비했다. 유가협은 8월12일 연세대 장기원기념관에서 석방대회와 함께 정기총회를 열었다. 두 어머니를 환영하기 위해 전국에서 유가족들이 올라왔다.
이날 유가협은 회의를 통해 사무국을 설립했다. 그동안 유가협은 정미경이 사무를 보고, 김승균이 간사장을 맡고 있었다.
그런데 김승균이 운영하는 일월서각이 바빠지면서 유가협 일에 전적으로 매달리기 어려운 형편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일을 박정기와 이소선이 이끌어가고 있었다. 박래군은 일과 사건이 많은 유가협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사무 업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정기총회를 앞두고 박정기에게 제의했다.
“아버님, 정미경 간사 한 명으론 유가협이 원활하게 돌아가긴 어렵습니다. 안정적인 사무국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사무국 설립은 박정기가 미처 생각하지 않은 일이었다.
“사무국을 어뜨케 운영할지 계획이 먼저 서야 하지 않겠노? 또 사무국장은 누가 하나?”
잠시 머뭇거리던 박래군이 말했다.
“사람이 딱히 없으면 제가 할게요.”
박정기는 박래군이 사무국장을 맡겠다는 말에 반색했다. 유가협의 주요한 일을 도맡아 하는 처지에서 천군만마를 얻는 기분이었다. 유가족인 박래군은 회원들과 소통하는 데도 장점이 많았다. 얘기를 꺼낼 때까지 박래군은 사무국 일을 자신이 맡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그는 이때 사무국장을 맡은 일을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회고했다.
“대충 발 빼고 내 길을 가야 하는데, 한순간의 판단이 인생을 어렵게 한다는 교훈을 얻은 겁니다. 하하. 그 몹쓸 놈의 정이 들어 버렸거든요. 어머니 아버지들이 하루 종일 거리를 헤매고 다니시는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측은하죠. 미경이 혼자 고생하는 걸 보는 것도 안쓰러웠고. 그래서 사무국을 만들고 들어간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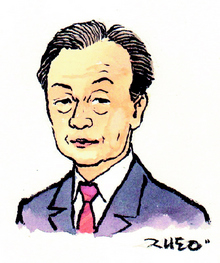 정기총회에서 박래군은 사무국장이 되었고, 정미경·김승균은 간사, 간사장을 연임했다. 유가협 사무국은 한울삶 한쪽에 책상 세 개를 두고 일했다. 사무국장이 받는 활동비는 월 10만원이었다. 재야의 장례사로 전국을 돌아다녀야 하는 그에겐 차비만으로도 모자란 돈이었다. 부회장과 회장을 맡는 동안 박정기는 매사에 박래군의 의견을 물으며 일을 벌였다. 박정기와 유가협 사무국 활동가들은 눈빛만으로도 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소통이 빨랐다.
그 후 유가협 사무국은 일이 많아지면서 박래전기념사업회에서 일하던 정종숙 등이 간사로 왔다. 한때 사무국엔 5명의 활동가가 일했다. 집을 얻고 사무국이 활발해지면서 한울삶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드나드는 사랑방이 되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고문/구술작가 송기역
<한겨레 인기기사>
정기총회에서 박래군은 사무국장이 되었고, 정미경·김승균은 간사, 간사장을 연임했다. 유가협 사무국은 한울삶 한쪽에 책상 세 개를 두고 일했다. 사무국장이 받는 활동비는 월 10만원이었다. 재야의 장례사로 전국을 돌아다녀야 하는 그에겐 차비만으로도 모자란 돈이었다. 부회장과 회장을 맡는 동안 박정기는 매사에 박래군의 의견을 물으며 일을 벌였다. 박정기와 유가협 사무국 활동가들은 눈빛만으로도 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소통이 빨랐다.
그 후 유가협 사무국은 일이 많아지면서 박래전기념사업회에서 일하던 정종숙 등이 간사로 왔다. 한때 사무국엔 5명의 활동가가 일했다. 집을 얻고 사무국이 활발해지면서 한울삶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드나드는 사랑방이 되었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고문/구술작가 송기역
<한겨레 인기기사>
■ 눈크기 27cm 대왕오징어 ‘왕 눈’ 된 이유
■ 허준영 “노회찬은 굉장히 네거티브하다”
■ F16 또 추락…국내서만 10대 넘게 추락
■ 소개팅·미팅 꼴불견 1위는?
■ 미래의 놀이법, 동네방네 커뮤니티
박정기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고문
■ 눈크기 27cm 대왕오징어 ‘왕 눈’ 된 이유
■ 허준영 “노회찬은 굉장히 네거티브하다”
■ F16 또 추락…국내서만 10대 넘게 추락
■ 소개팅·미팅 꼴불견 1위는?
■ 미래의 놀이법, 동네방네 커뮤니티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휴일 없이 하루 15시간씩, 내 살을 뜯어먹으며 일했다 [.txt] 휴일 없이 하루 15시간씩, 내 살을 뜯어먹으며 일했다 [.txt]](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124/20250124503090.webp)

![“박근혜보다 죄 큰데 윤석열 탄핵될지 더 불안…그러나” [영상] “박근혜보다 죄 큰데 윤석열 탄핵될지 더 불안…그러나” [영상]](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5/0201/17383957080479_2025020150043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