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등 여권 의원들이 국회 별관에서 ‘3선개헌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뒤 서둘러 빠져나가는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이룰태림-멈출 수 없는 언론자유의 꿈 (30)
1968년 말 박정희 정권이 ‘<신동아> 필화 사건’을 빌미로 기자들을 반공법으로 대거 조사하고 편집국 인사에까지 개입한 것은 동아일보사를 길들이기 위해서라는 설이 유력하게 퍼졌다. 실제로 박정희 장기집권을 추진하던 비서실장 이후락과 중앙정보부장 김형욱, 공화당 4인방 ‘백남억·길재호·김성곤·김진만’은 69년 1월 초부터 ‘3선 개헌 필요성’을 들고나왔다.
2월25일 공화당 당의장 서리 윤치영은 “장기집권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부패하는 것은 아니며, 헌법은 정세 변동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68년 ‘정계은퇴’를 강요당했던 김종필이 비겁하게도 69년 6월부터 ‘3선 개헌’ 주장에 앞장서자, 박정희 정권은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투표에 부쳐 나와 이 정부에 대한 신임을 묻겠다”며 ‘3선 개헌 추진’을 공식화했다.
개헌안을 두고 공화당 의원총회에서도 찬반 논란이 일자 이만섭 의원이 총대를 멨다. 그는 제3공화국 대통령 출마 조항을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에서, “2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로 바꿔 “박 대통령에게 3선 대통령의 길만 터주자”고 반대파들을 설득했다.
하지만 이만섭은 박정희의 야심을 너무 몰랐다. 박정희는 ‘5·16 군사쿠데타’ 때 이미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고 약속하고는 2년 뒤 “군정 4년 연장”을 발표했다가 미국의 반대로 할 수 없이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 이제 두 차례 대통령직을 연임한 뒤, 다시 ‘3선 출마’를 도모하고 있었다.
박정희 정권의 3선 개헌 추진에 맞서 당시 야당인 신민당은 ‘5인 호헌위원회’(김의택 전당대회 의장, 조영규 중앙상임위원장, 정헌주 정책위원장, 고흥문 사무총장, 김영삼 원내총무)를 구성하고 유진오 총재가 “국회의원 총사퇴도 불사하겠다”며 69년 6월5일 재야인사들과 함께 ‘3선개헌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위원장 김재준 목사)를 결성해 강경한 투쟁의지를 보였지만, 유진산 간사장 등 타협파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어 반대 투쟁이 여의치 않았다.
 결국 69년의 ‘3선 개헌 반대투쟁’도 학생운동이 떠맡게 되었다. 이번엔 서울대 법대생들이 최초의 반대운동 깃발을 들었다. 법대생 300여명은 6월12일 “3선 개헌 음모를 반민주적 행위로 단정”하고, 6월13일 밤샘농성에 들어갔다. 17일에는 서울대 문리대생 200여명이, 19일에는 고려대생 500여명(법대 학생회장 선병덕 주도), 서울대 공대생 300여명이 성토대회를 열었고, 20일에는 연세대 법정대 700여명이 ‘범연세 호헌투쟁위원회’를 결성했다.
6월20일에는 괴한들이 김영삼 원내총무의 차에 초산을 퍼붓는 테러를 했는데, 이는 김영삼이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을 파면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6월27일에는 고대에서 윤준하·이상수 등의 주도로 ‘고려대 민주수호투쟁위원회’를 결성해 600명이 거리시위를 벌였고, 28일에는 고려대 총학생회장 조춘구가 앞장서서 안암동 네거리까지 진출했다. 고려대와 경북대생들은 6월29일부터 1주일간 매일 시위를 벌였다. 7월1일부터 7일까지 연세대·서울대공대·외대·중앙대·동국대·전북대·성균관대·건국대·외대·동국대·숭실대·우석대·경희대생들이 시위를 벌였다. 정부당국의 종용으로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이 조기방학에 들어가자, 이번에는 고교생들이 나섰다. 7월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 동안 대구고·대륜고·경북고·안동고·대구계성고·경북김천중고생들이 시위에 나섰다.
3선 개헌 반대투쟁은 두 가지 장애에 부닥쳤다. 하나는 조기방학과 휴교령이었고, 다른 하나는 언론의 외면이었다. 이에 대해 천관우 전 <동아일보> 주필은 “연탄가스에 중독되어버린 언론”이라고 비판했다.
대학당국은 방학을 학생 징계 기간으로 악용했다. 서울대 문리대 학생회장 박영은과 서원석은 자퇴, 최재현·유홍준·조학송·김형관·강지원·박승무 등은 무기정학, 경북대 2명, 서울교대 1명, 고려대 학생회장 조춘구는 제적, 고려대 이원보·이상수·윤준하 등 16명과 부산대 5명 등이 무기정학을 당했다.(<한국민주화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편, 2008년)
결국 69년의 ‘3선 개헌 반대투쟁’도 학생운동이 떠맡게 되었다. 이번엔 서울대 법대생들이 최초의 반대운동 깃발을 들었다. 법대생 300여명은 6월12일 “3선 개헌 음모를 반민주적 행위로 단정”하고, 6월13일 밤샘농성에 들어갔다. 17일에는 서울대 문리대생 200여명이, 19일에는 고려대생 500여명(법대 학생회장 선병덕 주도), 서울대 공대생 300여명이 성토대회를 열었고, 20일에는 연세대 법정대 700여명이 ‘범연세 호헌투쟁위원회’를 결성했다.
6월20일에는 괴한들이 김영삼 원내총무의 차에 초산을 퍼붓는 테러를 했는데, 이는 김영삼이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을 파면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6월27일에는 고대에서 윤준하·이상수 등의 주도로 ‘고려대 민주수호투쟁위원회’를 결성해 600명이 거리시위를 벌였고, 28일에는 고려대 총학생회장 조춘구가 앞장서서 안암동 네거리까지 진출했다. 고려대와 경북대생들은 6월29일부터 1주일간 매일 시위를 벌였다. 7월1일부터 7일까지 연세대·서울대공대·외대·중앙대·동국대·전북대·성균관대·건국대·외대·동국대·숭실대·우석대·경희대생들이 시위를 벌였다. 정부당국의 종용으로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이 조기방학에 들어가자, 이번에는 고교생들이 나섰다. 7월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 동안 대구고·대륜고·경북고·안동고·대구계성고·경북김천중고생들이 시위에 나섰다.
3선 개헌 반대투쟁은 두 가지 장애에 부닥쳤다. 하나는 조기방학과 휴교령이었고, 다른 하나는 언론의 외면이었다. 이에 대해 천관우 전 <동아일보> 주필은 “연탄가스에 중독되어버린 언론”이라고 비판했다.
대학당국은 방학을 학생 징계 기간으로 악용했다. 서울대 문리대 학생회장 박영은과 서원석은 자퇴, 최재현·유홍준·조학송·김형관·강지원·박승무 등은 무기정학, 경북대 2명, 서울교대 1명, 고려대 학생회장 조춘구는 제적, 고려대 이원보·이상수·윤준하 등 16명과 부산대 5명 등이 무기정학을 당했다.(<한국민주화운동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편, 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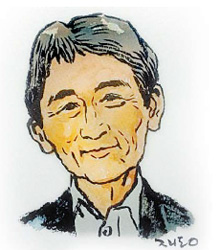 그해 8월 말 가을학기가 시작되자, 서울대 문리대에서 김세균을 위원장으로 하는 ‘3선개헌 반대투쟁위원회’가 새로 결성되고, 9월8일까지 서울의 거의 모든 대학에서 걷잡을 수 없이 시위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자 박정희 정권은 9월9일 국회 제3별관에서 공화당 단독으로 개헌안을 날치기로 기습 통과시켰다. 이어 10월17일 국민투표에서 개헌안은 ‘투표율 77.1%, 찬성 65.1%’로 확정됐다. 이로써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독재의 신작로’가 뚫린 것이다.
필자/성유보
정리도움/강태영
그해 8월 말 가을학기가 시작되자, 서울대 문리대에서 김세균을 위원장으로 하는 ‘3선개헌 반대투쟁위원회’가 새로 결성되고, 9월8일까지 서울의 거의 모든 대학에서 걷잡을 수 없이 시위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자 박정희 정권은 9월9일 국회 제3별관에서 공화당 단독으로 개헌안을 날치기로 기습 통과시켰다. 이어 10월17일 국민투표에서 개헌안은 ‘투표율 77.1%, 찬성 65.1%’로 확정됐다. 이로써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독재의 신작로’가 뚫린 것이다.
필자/성유보
정리도움/강태영
1969년 초부터 ‘3선 개헌’을 추진한 박정희 정권은 야당과 학생들의 저항을 철권으로 제압하고 끝내 국민투표로 개헌을 관철시켰다. 사진은 그해 9월9일 야당인 신민당 의원들의 국회 의사당을 점령하고 밤샘농성을 하는 모습.
성유보(필명 이룰태림·71) 희망래일 이사장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길을 찾아서] ‘가만있으라’에 굴종하랴?…제3의 시민혁명이 필요하다 / 이룰태림 [길을 찾아서] ‘가만있으라’에 굴종하랴?…제3의 시민혁명이 필요하다 / 이룰태림](https://img.hani.co.kr/imgdb/thumbnail/2014/0624/00505861601_20140624.JPG)

![[속보] 헌재, 직권으로 수방사 경비단장 증인 채택 [속보] 헌재, 직권으로 수방사 경비단장 증인 채택](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5/0206/17388054308846_20250206501102.webp)

![[단독] ‘체포 시도’ 여인형 메모에 ‘디올백 최재영’ 있었다 [단독] ‘체포 시도’ 여인형 메모에 ‘디올백 최재영’ 있었다](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4/0603/6517174085880818.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