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성유보)는 어린 시절을 되돌아볼 때 1949년 6살 때 입학한 경산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열정적인 가르침을 잊을 수가 없다. 사진은 1960년대 경산초교 선생님들이 못 쓰게 된 책걸상을 손수 수리하는 모습. 사진 경북교육청 공식 블로그
이룰태림-멈출 수 없는 언론자유의 꿈
나의 경산초등학교 시절은 ‘6·25 동란’의 시작과 끝이 맞물린 환란의 시대였다. 2학년 1학기 때 전쟁이 터져 5학년 여름방학 때 ‘정전협정’으로 총성이 멎었다. 이 대격동기에 선생님들이 전쟁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일편단심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데 전력을 다한 것을 나는 요즈음 들어 새삼 경이롭게 생각한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초등학교 6년 내내 수업에 공백이 있었던 기억은 없다. 다들 먹고살기 바쁜 농촌이라 ‘촌지’도, 치맛바람도 있을 턱이 없었고, 학부모들은 학교에 자식을 맡겨버리면 신경을 쓰지 않았다.
태어날 때부터 허약했던 나는 그 시절 “키는 조그마하고 볼품없지만, 공부는 좀 한다”는 소리를 곧잘 들었다. 지금 돌이켜 보면, 내가 그나마 공부를 한 것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선생님들의 관심과 칭찬 덕이었다.
특히 1학년 담임 정태봉 선생님(작고)은 돌아가신 넷째 숙부님과 경산초교 동기동창으로, 친구의 조카인 내게 유독 많은 사랑을 베푸셨다. “이 문제 아는 학생 손들어?” 했을 때 내가 손을 들면 늘 기회를 주셨다. 그때 내 글씨는 추상화 수준으로 엉망이었다. “영이야, 철수야” 국어 교과서의 단어들을 공책에 베끼게 하고는 동그라미를 표시해주곤 했는데, 내 공책에는 아예 동그라미도 치지 않고 “집에 가서 네 누나 앞에서 다시 써서 내일 가져와라” 하시곤 했다. 하지만 같은 학교 교사인 누나는 매우 귀찮아하면서 “잘 썼는데 뭘 그래?” 하고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혼자 낑낑대다 다시 써 가면 선생님께서는 “많이 좋아졌는데” 하면서 동그라미 3개를 쳐주었다.
새삼 묵은 일화가 떠오른 것은, 둘째 아들의 초등학교 시절 쓰라린 기억 때문이다. 1990년 가을쯤이었던가, 우리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살고 있었고, 둘째는 고일초교 4학년이었다. 어느날 둘째는 “선생님께서 내일 아빠나 엄마, 학교 한번 나오시래”라고 전했다. 그때까지 한 번도 학교로 불려간 적이 없었기에 우리 부부는 ‘녀석이 큰 말썽을 피웠구나’ 직감했다.
이튿날 선생님을 만나고 온 아내의 얘기는 이랬다. “둘째가 하도 개구쟁이여서 수업시간에도 장난치고 말썽을 부려 다른 학생 공부를 방해하는데, 아무리 야단쳐도 그때뿐이니 부모님이 말려 달라고 하시네요.” 우리집 교육철학(?)이 “공부에 취미 없으면 재미있게 놀기라도 하라”는 수준이었으니, 아들이 공부 못하는 것이야 놀라지 않았지만, 다른 학생들까지 방해하고 있다니, 이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둘째에게 연유를 물었다. 그런데 대답이 참으로 의외였다. ‘입학해서 그때까지 손을 열심히 들어도 선생님들이 한 번도 저를 지명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는 알아도 아예 손을 들지 않는다. 선생님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공부할 필요가 뭐 있느냐’고 항변하는 것이었다. 할 말이 별로 없었다. 고작 “공부 안 한다고 나무라지는 않을 터이니, 남 공부는 방해하지 말고, 수업시간에는 절대 장난치지 마라”고 타이를 수밖에.
두 아들 모두 공부를 잘하지 못한 데는 물론 우리 부부 탓도 크다. 한국 사회에서는 요즈음 선생님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학생들이 종종 ‘문제아’로 빠져드는 일이 드물지 않다. 우리는 아들들이 그나마 ‘문제아’가 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위로로 삼고 있다.
그럴수록 경산초교 시절 선생님들은 내게는 행운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2학년 때 담임은 그 시절 드물었던 여선생님이었는데, 성함은 기억 못하지만 젊고 미인이어서 학교 가는 것이 즐거웠다. 3·4학년 때 담임 이한용 선생님은 얼마나 재미있게 가르치는지 수업시간이 지루하지 않았다. 5학년 때 정오열 선생님께서는 여름방학 때면 소질 있는 학생들을 따로 불러 무료로 붓글씨를 가르쳐주었다. 그 자신 국전에서도 여러 번 입상한 서예의 대가였다. 예능에는 원체 소질이 없던 나도 여름방학 어느날 학교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정 선생님을 만난 덕분에 붓글씨를 배웠다. 선생님은 손수 붓과 먹과 벼루까지 선물해주었다. 그때 붓글씨 제자 중에는 경산군 대회에 나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허균(그는 요절했다)을 비롯해 입상한 친구들이 여럿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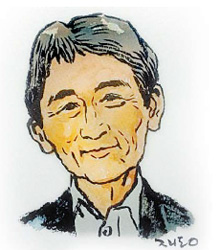 내 동기 남학생 60명 가운데 8명이 당시 대구·경북지역 명문으로 꼽히던 경북중에 진학했는데, 그 역시 정 선생님과 6학년 담임 황규봉 선생님의 열성 덕분이었다. 두 분은 각각 10명씩을 뽑아 무료로 합숙과외까지 시켜주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했듯이, 그때 고향에 남은 동기생들이 나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삶을 보내고 있다. 그래도 나는 물론이고 최상희·권민웅·이진환·김혁권·정병완·정상원·허균 등 8명에게는 더욱 고마움을 잊을 수 없는 은사님들이셨다.
정리·도움/강태영
내 동기 남학생 60명 가운데 8명이 당시 대구·경북지역 명문으로 꼽히던 경북중에 진학했는데, 그 역시 정 선생님과 6학년 담임 황규봉 선생님의 열성 덕분이었다. 두 분은 각각 10명씩을 뽑아 무료로 합숙과외까지 시켜주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했듯이, 그때 고향에 남은 동기생들이 나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삶을 보내고 있다. 그래도 나는 물론이고 최상희·권민웅·이진환·김혁권·정병완·정상원·허균 등 8명에게는 더욱 고마움을 잊을 수 없는 은사님들이셨다.
정리·도움/강태영
성유보(필명 이룰태림·71) 희망래일 이사장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길을 찾아서] ‘가만있으라’에 굴종하랴?…제3의 시민혁명이 필요하다 / 이룰태림 [길을 찾아서] ‘가만있으라’에 굴종하랴?…제3의 시민혁명이 필요하다 / 이룰태림](https://img.hani.co.kr/imgdb/thumbnail/2014/0624/00505861601_20140624.JPG)


![[속보] ‘어 이게 아닌데’…혐중 유도 신문에 답 안 한 윤석열 쪽 증인 신원식 [속보] ‘어 이게 아닌데’…혐중 유도 신문에 답 안 한 윤석열 쪽 증인 신원식](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5/0211/53_17392541890156_20250211502398.webp)
![[속보] 헌재, 윤석열 반발 일축…“내란 피의자 조서, 증거능력 있다” [속보] 헌재, 윤석열 반발 일축…“내란 피의자 조서, 증거능력 있다”](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5/0211/53_17392403696553_20250211501300.webp)
![[단독] 윤석열 “‘덕분에’ 빨리 끝났다”…조지호 “뼈 있는 말로 들려” [단독] 윤석열 “‘덕분에’ 빨리 끝났다”…조지호 “뼈 있는 말로 들려”](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2077.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