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3년 경북 경산에서 태어난 필자(성유보)는 경산초등학교 2학년 때 겪은 ‘6·25’를 통해 ‘큰 나라’ 미국과 미군에 대한 강한 인상을 받았다. 사진은 49년 할머니 회갑잔치 때 찍은 가족사진으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유년기 사진이다. 앞줄 오른쪽 둘째가 필자, 맨 가운데가 할머니, 그 뒷줄 좌우가 어머니와 아버지다.
이룰태림-멈출 수 없는 언론자유의 꿈 ⑫
이쯤에서 어릴 적 잊히지 않는 기억 몇 가지를 소개해야겠다. 나는 1943년 경북 경산에서 아버님 성태후와 어머님 신순득의 팔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일제 말기 대부분의 ‘조선인’이 그러했듯 우리집도 ‘창씨개명’을 해야 했고, 내 일본식 이름은 ‘나리오카 다카히코’였다. 45년 8월 해방이 되자 아버님은 호적에 새로 이름을 올리면서 엉겁결에 ‘철수’로 적었단다. 나는 어릴 때부터 놀림받던 그 이름이 싫어 대학을 졸업한 뒤 ‘유보’(裕普)라고 스스로 개명했다.
어머님께서는 살아생전 “일제가 쌀과 보리 등을 죄다 공출해 가고 만주에서 콩깻묵을 가져와 배급해주는 바람에, 네가 갓난아기 때 젖을 제대로 못 먹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고 하면서 “살아남은 것만도 기적이다”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허약해서 그랬는지, 평생 아버님 어머님께 혼나거나 매 맞은 기억이 한 번도 없다. 그렇다고 얌전한 아이는 전혀 아니었다. 다섯살 때인가, 뭣 때문인지 성이 난 나는 엄마에게 대들다가 엉엉 울면서 마당에 나가 뒹굴었다. 그러자 엄마는 나를 달래서 목욕시키고 새 옷으로 갈아입혔다. 그래도 화가 북받친 나는 또다시 마당에서 뒹굴 정도로 고집쟁이였다. 여섯살도 채 안 되어 경산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그 이유는 “학교라도 보내 하루빨리 못된 성격을 고쳐보려는 속셈”일 정도였다.
어쨌든 일제의 수탈과 이승만 정권의 방치로 그 시절 대다수 농민들은 끼니조차 찾아먹기 힘들었다. 그나마 우리집은 일제가 남기고 간 작은 과수원과 약간의 논밭 덕분에 보릿고개는 면했지만, 여름 한철에는 깡보리밥만 먹어야 했다.
초등학교 4학년 여름이었던가? 아버님은 학비를 마련하려 농우(農牛)를 내다 팔게 되었다. 경주까지 100리 길을 걸어서 오일장에 나가 소를 판 아버님은 다시 걸어서 11시쯤 한밤중에야 돌아오셨다. 어머님은 제사용으로 아껴둔 쌀로 흰밥을 지어 늦은 저녁상을 차려 냈다. 우리 팔남매는 이미 저녁을 먹어 놓고도 쌀밥에 넋이 나가 밥상에 둘러앉아 군침을 흘렸다. 아버님은 절반도 잡숫지 않고 “아 배부르네” 하시면서 숟가락을 놓으셨고, 우리는 앞다투어 숟가락을 들었다. 괴테의 ‘파우스트’는 권력과 부를 위해 영혼을 팔지만, 이 시절 우리네 농민들은 세끼 밥만 배불리 먹을 수 있다면 영혼을 팔고도 남았을 것이다.
초등학교 2학년 때인 50년 ‘6·25’가 터졌다. 다행히도 우리가 살던 경산은 국군이 대구를 방어선으로 삼은 덕분에 전쟁터 신세는 면했다. 그렇다고 전쟁과 무관할 수는 없었다. 아이들까지 나서서 방공호를 파야 했고, 어머님은 피난에 대비하여 미숫가루를 잔뜩 만들었다. 7월 중순께부터 10명쯤 되는 ‘국민방위군’ 어른들이 우리집에 기숙하더니, 열흘쯤 지나자 어디론지 사라졌다. 경산읍 상방동의 집 앞으로 실개천이 흘렀는데, 남서쪽 논밭 너머로 신작로(부산~대구~서울을 잇는 경부국도)가 보였다. 7월 하순 어느날부터 보름 넘게 흰옷 입은 어른들을 가득 태운 트럭들이 신작로를 줄지어 지나갔다. 그때는 무슨 일인지 전혀 알지 못했기에 그저 풍경화처럼 스쳐 바라봤을 뿐이었다.
2학기 들어 학교에 가보니 미군이 온통 점유하고 있었다. 대신 우리는 산과 들로 야외수업을 다니다가 늦가을부터 중방동에 있는 담배창고(당시 전매청에서 담뱃잎을 말리기 위해 지은 칸막이 창고들)를 임시학교로 사용했다. 4학년 2학기에야 미군이 철수해 우리는 학교를 되찾았다.
소년시절 ‘6·25’를 통해서 미국과 미군은 내게 두 가지 강한 인상을 남겼다. 하나는 미국이라는 큰 나라의 국력에 대한 부러움이었고, 하나는 그 힘이 주는 위압감이었다.
미군들은 간혹 동네 앞 실개천 제방에 나와 허공에 대고 사격연습을 하곤 했다. 그럴 때면 동네 여자들은 모두 숨기에 바빴고, ‘제 식구 안녕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남자 어른들의 자존심은 무참히 깨질 수밖에 없었다. 미 공군은 ‘쌕쌕이’라고 부른 제트 전투기와 B-29 전폭기로 우리 마을 상공을 지나 하루에도 몇십대씩 북쪽으로 날아갔다. 우리는 운동화가 없어 고무신을 신고, 자전거만 가져도 부자로 치는데, 어린 마음에 미국은 어떻게 수만리 떨어져 있는 북녘으로 비행기를 날려 보낼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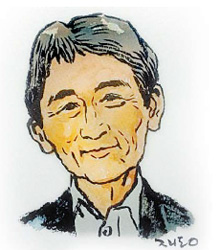 미군 병사들은 간혹 헬리콥터를 타고 동네 방천에 날아와서는, 열댓명씩 몰려나와 따라다니는 아이들에게 레이션 박스를 두세개씩 주곤 했다. 그 속에 든 통조림이나 초콜릿, 사탕 등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다. 멋모르고 털어넣었던 새카만 커피가루는 써서 삼키지도 못했지만. 그렇게 ‘6·25’를 통해 미군들에 의해 전파된 미제 상품들-먹거리·의약품·자동차·통신·석유·양담배 등등-은 한국인에게 미국식 생활양식, 미국식 사고방식, 양키 문화를 퍼뜨렸다.
정리 도움/강태영
미군 병사들은 간혹 헬리콥터를 타고 동네 방천에 날아와서는, 열댓명씩 몰려나와 따라다니는 아이들에게 레이션 박스를 두세개씩 주곤 했다. 그 속에 든 통조림이나 초콜릿, 사탕 등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다. 멋모르고 털어넣었던 새카만 커피가루는 써서 삼키지도 못했지만. 그렇게 ‘6·25’를 통해 미군들에 의해 전파된 미제 상품들-먹거리·의약품·자동차·통신·석유·양담배 등등-은 한국인에게 미국식 생활양식, 미국식 사고방식, 양키 문화를 퍼뜨렸다.
정리 도움/강태영
성유보(필명 이룰태림·71) 희망래일 이사장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길을 찾아서] ‘가만있으라’에 굴종하랴?…제3의 시민혁명이 필요하다 / 이룰태림 [길을 찾아서] ‘가만있으라’에 굴종하랴?…제3의 시민혁명이 필요하다 / 이룰태림](https://img.hani.co.kr/imgdb/thumbnail/2014/0624/00505861601_20140624.JPG)


![[속보] ‘어 이게 아닌데’…혐중 유도 신문에 답 안 한 윤석열 쪽 증인 신원식 [속보] ‘어 이게 아닌데’…혐중 유도 신문에 답 안 한 윤석열 쪽 증인 신원식](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5/0211/53_17392541890156_20250211502398.webp)
![[속보] 헌재, 윤석열 반발 일축…“내란 피의자 조서, 증거능력 있다” [속보] 헌재, 윤석열 반발 일축…“내란 피의자 조서, 증거능력 있다”](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5/0211/53_17392403696553_20250211501300.webp)
![[단독] 윤석열 “‘덕분에’ 빨리 끝났다”…조지호 “뼈 있는 말로 들려” [단독] 윤석열 “‘덕분에’ 빨리 끝났다”…조지호 “뼈 있는 말로 들려”](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2077.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