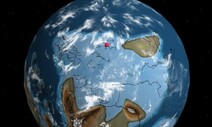1998년 5월 14일 오후, 한겨레 사람들이 막 윤전기를 빠져나온 창간호를 보고 있다. 앞줄 맨 오른쪽이 송건호 초대 한겨레 사장이다.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가 부자 신문이 아닌 것은 윤전기를 보면 안다. 1988년 5월 15일 창간호를 찍어낸 윤전기는 신문 인쇄가 아닌 잡지 인쇄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1988년 3월, 경기도 파주의 한 공장에 보관 중이던 것을 들여왔다. 이를 급한대로 고쳐 신문을 찍었다.
모든 윤전기는 제조사를 덧붙여 부른다. 하마다 윤전기, 케바우 윤전기 하는 식이다. 그런데 한겨레 창간호를 찍은 이 윤전기는 ‘작명’이 힘들다. 일본 하마다 공업사가 만든 기계 부품이 중심이 되긴 했는데, 다른 제조사의 부품을 여기저기 덧댔다. 정확한 제조연도를 따지기가 힘들 정도로 낡은 물건이었다. 만든 지 20년이 지났다는 점은 분명했다. 1980년대 후반, 한국과 대만에서 새 신문사가 많이 생기면서 일제 중고 윤전기 가격이 치솟았다. 한겨레로서는 이 정도 윤전기라도 구한 것이 다행이었다.
신문을 펼쳤을 때의 용지 크기를 대판이라 한다. 윤전기는 이 대판을 찍어낸다. 앞뒤로 신문 4개 면을 한 번에 인쇄하는 셈이다. 그래서 모든 윤전기는 4면, 8면, 12면 식으로 4배수의 지면만 인쇄할 수 있다. 한겨레가 처음 들여온 것은 8면을 시간당 2만 4000부 정도 인쇄하는 2대의 윤전기였다. 이 때문에 창간 초기엔 8면만 발행했다. 애초 계획엔 매일 12면을 낼 예정이었지만 윤전기가 따라주지 못했던 것이다.
“이래도 기계가 돌아가는군요”
1988년 3월 10일, 윤전기 시험 가동에 성공했다. 이날 <한겨레신문 소식> 7호를 이 윤전기로 찍었다. 창간호를 찍어내게 될 일제 중고 윤전기의 첫 작품이었다. 소식지를 찍어줄 곳을 찾느라 충무로 인쇄소 골목을 누비는 수고도 끝이 났다.
1988년 8월, 하마다 중고 윤전기 2대를 추가로 들여왔다. 윤전부 사원들이 이 기계들을 서로 짜맞췄다. 8면을 인쇄하는 윤전기 2대 가운데 하나를 절반으로 잘라 다른 하나에 덧붙이면 12면을 인쇄할 수 있다는 발상이었다. 초대 윤전부 사원들이 이를 현실화시켰다. 12면 인쇄가 가능한 윤전 라인을 완성했다. 1988년 8월 20일, 시험 가동에 성공했다. 열흘 뒤인 1988년 9월 1일부터 12면을 발행했다.
나중에 윤전기 점검을 위해 일본 기술자가 한겨레를 찾았다. 가동 중인 하마다 중고 윤전기의 ‘한겨레 버전’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야, 이렇게 붙여 쓰는 방법도 있군요. 이래도 기계가 돌아가는군요.”
1993년 8월, 윤전부 직원 차승만이 윤전기에서 나오는 신문을 살펴보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의 2세대 윤전기는 도쿄기계가 만들었다. 1971년 제작되었다. 역시 낡은 중고였지만 그래도 신문용 윤전기였다. 대만에서 최대 부수를 자랑하는 렌허바오(연합보)가 사용하던 것을 1989년 2월 도입 계약을 맺었다. 그해 여름, 서형수, 이길우, 윤영수, 장기선 등이 현지에 가서 윤전기를 살펴보고 이를 해체해 배에 실었다. 발전기금으로 사게 된 이 윤전기는 1989년 10월 부산항에 들어왔다. 그러나 한겨레 사람들이 그 윤전기를 실제로 보게 된 것은 한참 뒤였다. 건설사의 부도로 공덕동 새 사옥 공사가 늦어졌기 때문이었다. 하는 수 없이 서울 당산동 야적장에 윤전기를 보관했다. 무려 1년 반 동안 그렇게 방치되었다가 1991년 5월, 사옥 골조 공사가 끝난 뒤에야 비바람을 막을 지붕 아래로 윤전기가 들어왔다.
도쿄기계 윤전기로 신문을 처음 인쇄한 것은 1991년 12월 13일이었다. 흑백 16면 기준으로 시간당 10만~15만 부 정도를 찍어냈다. 그러나 예상보다 선명도가 떨어지고 인쇄 속도도 느렸다. 원래 활판용으로 만들었던 것을 대만 기술자들이 오프셋(offset)용으로 개조했는데, 들여오고 보니 인쇄 롤러가 엉망이었다. 국내 반입 뒤 야외에 쌓아둔 동안 일부 부품이 녹이 슨 것도 문제였다. 윤전부와 발송부 사원들이 애를 많이 먹었다.
“윤전기 돌리기 전엔 안 죽어”
윤전기의 잉크 분사가 고르지 않아 윤전부 사원들이 밤새 분무기로 물을 뿌려가며 인쇄를 했다. 찍어낸 신문 가운데 온전한 것만 골라 발송하느라, 신문용지를 많이 허비했다. 당시 최학래 상무가 윤전기 안정화를 책임졌는데, 한 달여 동안 윤전 사원들과 함께 밤을 새웠다. 결국 어느 날 새벽, 심장에 무리가 와서 쓰러졌다. 직원들이 놀라 달려왔다. “괜찮아. 윤전기 돌리기 전엔 안 죽어.”
그래도 윤전기 사고가 자주 일어나 발송 시간이 늦어졌다. 지방에 배달하는 신문은 기차에 실어 보내야 했다. 발송부 사원들이 서울역 관계자들과 멱살잡이까지 벌이며 떠나려는 기차를 붙잡아놓고 신문 나오기를 기다렸다. 기차를 놓치면 하는 수 없이 화물차에 실어 고속도로를 밤새 달렸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여러 사람을 고생시켰던 도쿄기계 윤전기는 1992년 2월 무렵에야 안정화되었다. 1993년 9월에는 경향신문이 보유하고 있던 도쿄기계 컬러윤전기를 추가로 도입해 보완했다. 1972년 제작되었는데, 1992년부터 가동되지 않고 창고에 처박혀 있던 물건이었다.
2006년 한겨레 사옥 내부 모습. 김윤섭 사진가
남들이 쓰다 남은 중고 윤전기를 써야 했던 지긋지긋한 시절이 1996년에 끝났다. 1994년 12월, 독일 케바우 사와 신형 고속윤전기 도입을 계약했다. 케바우는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회사였다. 130여 년 동안 윤전기만 만들었다. 한겨레가 도입하기로 한 윤전기는 컬러 8면을 포함해 모두 32면의 신문을 시간당 7만 부씩 찍어내는 최신식 기계였다.
제작국장 박성득, 총무부장 이훈우, 기획부장 윤석인, 전기팀장 장기선 등이 케바우 윤전기 도입을 추진해 성사시켰다. 신형 윤전기를 들여온 것은 창간 이후 처음이었다. 일제보다 성능이 뛰어난 독일제 윤전기를 산 것도 의미가 깊었다.
윤전부 사원들이 독일을 찾아 단기 연수를 받았고, 기계를 설치할 때는 독일 케바우 사 직원들이 공덕동 사옥을 찾아 일을 도왔다. 케바우 윤전기가 들어오면서 윤전부 사람들의 고생이 조금이나마 줄었다. 그 전에는 굉음을 내는 윤전기 옆에서 직접 작업해야 했지만, 케바우 도입 이후 사방이 유리로 막힌 방음실 안에서 컴퓨터 제어장치로 윤전기를 조정할 수 있었다. 윤전기를 바꾸면서 발송 장비도 최신식으로 교체했다. 스위스 뮬러마티니사가 만든 신형 발송 장비는 신문을 꾸러미로 묶고 포장하는 전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해주었다.
중고 시대를 끝낸 독일제 신형 케바우 윤전기
1996년 9월, 마침내 케바우 고속윤전기 1호기가 들어왔다. 이듬해인 1997년 4월에 2호기까지 들여왔다. 이 윤전기는 2008년 현재까지도 한겨레 고속윤전 라인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2006년 5월에는 컬러 지면을 늘이기 위해 도쿄기계 윤전기를 들여와 케바우와 합체해 쓰고 있다. 이 도쿄기계 윤전기도 중고 제품이다. 한겨레 윤전부 사람들이 윤전기 설치 업체 한국엔지니어링(HKE)과 함께 실현시켰다. 1990년대 초 LG 중고 제품으로 들여와 20여 년 사용한 윤전기용 공기압축기는 2013년에 한신에서 생산한 새 제품으로 교체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 사옥 1층 발송장과 윤전기가 있는 2층이 제작국 직원들의 일터다. 김성광 기자
같은 해, 필름 인쇄 시대도 마감했다. 2013년 2월 독일 크라우젠사의 신형 CTP(Computer to Plate의 줄임) 설비 2세트를 들였다. 전에는 취재, 편집, 디자인 등을 마치면, 이 지면을 필름으로 인쇄하고 필름을 다시 인쇄판으로 출력한 뒤 윤전기 가동에 들어갔다. CTP는 지면을 레이저로 인쇄판에 곧바로 쏘는 방식이다. 필름과 관련한 여러 공정이 줄어 제작 시간이 단축되었다. 한겨레가 신문 제작 설비를 선진화하려고 노력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독자들이다. 독자들에게 정보가 단 1개면이라도 더 들어찬 신문을, 몇 분이라도 더 빨리 전하기 위함이다.
※ 한겨레가 창간 30돌을 맞아 디지털 역사관인 ’한겨레 아카이브’를 열었습니다. 이 글은 '한겨레 아카이브'에 소개된 내용의 일부입니다. 한겨레의 살아 숨쉬는 역사가 궁금하시다면, 한겨레 아카이브 페이지(www.hani.co.kr/arti/archives)를 찾아주세요. 한겨레 30년사 편찬팀
achive@hani.co.kr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