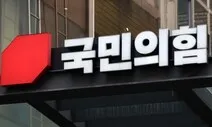이완구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성완종 리스트’에 관한 야당 의원의 질의를 눈을 감은 채 듣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야, 국회서 ‘성완종 리스트’ 추궁
이완구 “수사 받겠지만 사퇴 거부”
홍영표 “충청포럼, 총리 인준위해
현수막 5천장 이상 걸었다 들어”
성 전 회장과의 관계 의혹 제기
이완구 “수사 받겠지만 사퇴 거부”
홍영표 “충청포럼, 총리 인준위해
현수막 5천장 이상 걸었다 들어”
성 전 회장과의 관계 의혹 제기
여야는 4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13일 이완구 국무총리와 황교안 법무장관을 상대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야당은 특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에 거명된 이 총리를 상대로 “공정한 수사를 위해 총리직을 사퇴하라”고 공세를 폈다.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총리에게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총리직을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신중하게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순서”라며 일축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대정부질문에서 “총리는 직간접적으로 법무장관을 지휘해 수사를 조율할 수 있다”며 “총리직에서 사퇴하고 조사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성 전 회장 메모에 거명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민정수석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검찰 수사에 관여할 수 있으므로 비서실장직을 사퇴하고 조사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리는 또 “검찰의 소환 요청이 있으면 응할 것이냐”는 정 의원의 질문에 “당연하다. 총리를 포함해 어느 누구도 수사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도 “총리는 수사에 일체 관여해선 안 되고, 관계된 어떤 사람과도 연락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또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홍영표 새정치연합 의원이 “이 총리가 인사청문회 당시 인준이 어려워질 것 같으니, 성 전 회장을 중심으로 충청포럼이 나섰다고 한다. 7만원 상당의 현수막이 5000장 이상 걸렸다고 한다”고 충청포럼을 운영하는 성완종 전 회장과 이완구 총리와의 관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완구 총리가 후보 시절, 잇따른 도덕성 논란으로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으며 낙마 가능성이 거론되자, 당시 충남 일대에 “충청 총리 낙마되면 다음 총선·대선 두고 보자”는 내용의 현수막이 ‘바르게살기 회원’, ‘새마을협의회’ 등의 이름으로 걸린 바 있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의원도 대정부질문에서 “현수막을 만든 광고업체에 충청포럼이 3000만원을 지급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이 총리를 공격했다.
그러나 이 총리는 “충청포럼에 전화한 적 없고, 성 전 회장과도 (총리 인준 당시) 통화한 적 없다”며 부인했다. 또 성 전 회장과의 최근 접촉에 대해서도 “3월22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전화 받았다”며 “억울하다고 말하기에 검찰에 가서 상세하게 말하라고 원칙적인 말을 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성 전 회장이 숨지기 직전 충남 태안군의회 전 의장 등을 만나 나눈 대화 내용이 11일 언론에 보도되자, 당사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성 전 회장과) 무슨 얘기를 나눴냐’고 집요하게 물어봤던 데 대해 “저와 친분 있던 사람(태안군의회 전 의장)이 제 얘기를 했길래 알아본 것”이라며 “(직접 전화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 알아봤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은 든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황교안 법무장관은 경남기업과 성 전 회장에 대한 자원외교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성 전 회장에게 정치적 ‘딜’(거래)을 제안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과정에 변호사 3명이 시종 함께했으며, 압력이 가해지거나 딜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부인했다. 또 가족 등에 대한 별도의 수사 등 ‘별건 수사’를 통한 압박 때문에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아니냐는 홍영표 새정치연합 의원 등의 추궁에 “별건이 아닌 동일한 수사의 연장”이라며 “러시아 캄차카 광구 개발 비리와 관련해 경남기업이 은행권으로부터 성공불융자를 받았고, 그 과정에 비리가 포착돼 이를 밝히다 보니 회사 내 분식회계 등이 연결돼 수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단독] 박찬대 “내란 특검법 거부하면 최상목 탄핵”…역풍 우려도 [단독] 박찬대 “내란 특검법 거부하면 최상목 탄핵”…역풍 우려도](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5/0123/53_17376152509264_20250123503075.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