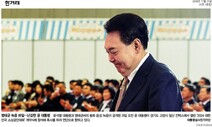‘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할 검찰 특별수사팀이 13일 발족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여야 가리지 않고 벌써 특별검사 얘기가 나오고 있다. 사안 자체가 ‘살아있는 권력’의 핵심을 겨냥하고 있으니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질지, 실체에 다가서는 수사 결과가 나올지 세간의 의구심이 큰 탓이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김진태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기로 하고, 팀장에 검사장 가운데 가장 기수가 높은 문무일 대전지검장을 앉히는 등 나름대로 자존심을 거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국민적 신뢰를 업고 수사를 시작하기에 역부족이다. 얼마 전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피습당했을 때 즉시 검사 13명을 동원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호들갑을 떨었던 것과 비교하면, 여론에 밀려 10명 안팎의 검사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초기 대응 태도부터 사뭇 다른 느낌이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이나 정윤회씨의 국정농단 의혹 등 정권의 치부를 건드리는 사건에서 검찰이 보여온 기회주의적인 모습도 국민의 기억에 뚜렷하다.
특히나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이완구 국무총리,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검찰 수사 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는 위치에 버젓이 앉아 있다는 사실은 애초부터 수사의 신뢰성을 지워버리기에 충분하다. 특별수사팀을 독립성이 보장된 특임검사처럼 운용하겠다는 말도 나오지만, 수사 상황을 윗선에 보고하는 한 청와대와 총리실, 여당에 그 내용이 전파되고 결국 수사가 외풍을 탈 것이 뻔하다. 정말로 특별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면 ‘특임검사 운영에 관한 지침’대로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물론 신뢰의 충분조건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는 것이다. 검찰로서는 ‘권력의 시녀’라는 오래된 오명을 씻을 드문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에도 재수사나 특검으로 이어지는 사태가 온다면 검찰의 종언이 될 것이라는 각오로 수사에 임하길 바란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이미 예견됐던 ‘채식주의자’ 폐기 [한겨레 프리즘] 이미 예견됐던 ‘채식주의자’ 폐기 [한겨레 프리즘]](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4/1028/20241028500119.jpg)
![[사설] 임기 절반도 안 돼 최저 지지율 19%, 이 상태로 국정운영 가능한가 [사설] 임기 절반도 안 돼 최저 지지율 19%, 이 상태로 국정운영 가능한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4/1101/3117304203620057.jpg)

![다시 전쟁이 나면, 두 번째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김연철 칼럼] 다시 전쟁이 나면, 두 번째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김연철 칼럼]](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4/1027/2024102750143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