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기. 최근 30년 만의 풍어를 기록했지만 자원 고갈의 조짐이 역력하다. 최윤 군산대학교 교수 제공
[토요판] 생명 조홍섭의 자연 보따리
생명은 바다에서 기원했지만, 바다가 생물로 가득 차자 포식자와 경쟁자를 피해 신천지인 육지로 퍼져 나갔다. 누구나 아는, 그리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이야기다.
그러면 생명이 육지보다 바다에 더 풍부할까. 놀랍게도 그렇지 않다. 생물의 양은 바다가 많을지 몰라도 종의 다양성은 육지의 15~25%밖에 안 된다. 바다가 표면적으로 지구의 70%, 생물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는 90%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에 비춰 보면 그 차이가 짐작된다. 바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물고기를 대상으로 이런 궁금증을 푼 연구가 최근 나왔다. 상어나 가오리, 폐어 등을 뺀 물고기의 96%는 등뼈가 변한 가시를 부드러운 피부로 덮은 지느러미를 가진 종류이다. 우리가 아는 물고기, 곧 붕어나 조기 등은 모두 이 부류에 속한다. 미국 과학자들은 최근 이들 물고기 집단 가운데 현존하거나 화석으로 남은 모든 계보를 조사했다. 그랬더니 담수와 바다에 각각 1만5000종가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나 2%를 덮고 있는 담수나 이들 물고기 종수가 비슷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바다에 사는 물고기 4종 가운데 3종은 담수어의 후손임이 드러났다.
뼈가 있는 등지느러미를 가진 물고기가 처음 등장한 것은 약 3억년 전 육지에서였다. 바다는 상어나 가오리 등의 조상인 다른 물고기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바다에서 대규모 멸종사태가 벌어져 이들 가운데 일부만 남고 바다가 텅 비는 사태가 벌어졌고, 1억8000만년 전 육지의 지느러미 물고기가 바다로 진출해 빈자리를 채웠던 것이다. 지금까지 지구에 존재한 종의 98%는 멸종했다. 특히 다섯번의 대멸종 사태는 유명한데, 2억5000만년 전 고생대와 중생대를 가르는 멸종사태 때는 바다 생물종의 96%와 육지 생물종의 70%가 멸종했다. 바다는 광활하지만 균일해, 숨을 곳이 많고 다양한 서식지가 있는 육지보다 멸종사태에 취약하다. 강이나 호수는 지구 차원의 재앙이 닥쳤을 때 물고기를 보존하는 종 대피소 구실을 한 것이다.
바다에서 육지로, 그리고 다시 바다로 향한 진화는 물고기만의 일은 아니었다. 고래도 육상동물로 진화했다가 어룡과 수장룡 등이 바다에서 자취를 감춘 뒤 다시 바다로 돌아갔다.
이런 지질학적 차원의 얘기를 끄집어내는 것은 인류가 그런 규모의 대멸종 사태를 빚고 있기 때문이다. 인류의 남획으로 금세기 중반이면 세계 바다의 주요 어장이 대부분 붕괴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게다가 기후변화로 인한 바다 산성화는 생태계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바다는 비어가는데 강이나 호수의 물고기마저 상당수가 멸종위기에 놓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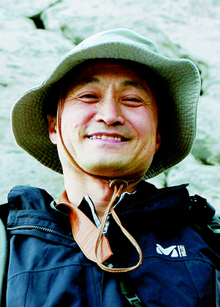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돌아가는 상황도 심각하긴 마찬가지다. 지난겨울 참조기가 “30년 만의 풍어”를 이뤘다고 기뻐했다. 정부 말대로 수산자원 회복 노력이 결실을 보아서였을까. 어류 전문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참조기 자원의 붕괴를 우려해 왔다. 풍성하게 잡힌 참조기는 대부분 한번도 알을 낳아보지 못한 1년생 어린 고기였다. 자원고갈 위기에 놓인 다른 수산어종과 마찬가지로 참조기도 점점 크기가 작아지고 조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알을 품고 있는 어린 참조기가 많은 것은 그런 불길한 조짐이다. 남획에 맞서 미숙하지만 종족 번식을 서두른 것이다. 면밀한 분석도 없이 참조기가 늘어났다고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우리나라에서 돌아가는 상황도 심각하긴 마찬가지다. 지난겨울 참조기가 “30년 만의 풍어”를 이뤘다고 기뻐했다. 정부 말대로 수산자원 회복 노력이 결실을 보아서였을까. 어류 전문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참조기 자원의 붕괴를 우려해 왔다. 풍성하게 잡힌 참조기는 대부분 한번도 알을 낳아보지 못한 1년생 어린 고기였다. 자원고갈 위기에 놓인 다른 수산어종과 마찬가지로 참조기도 점점 크기가 작아지고 조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알을 품고 있는 어린 참조기가 많은 것은 그런 불길한 조짐이다. 남획에 맞서 미숙하지만 종족 번식을 서두른 것이다. 면밀한 분석도 없이 참조기가 늘어났다고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 윤석열이 연 파시즘의 문, 어떻게 할 것인가? [신진욱의 시선]](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2/20250212500150.webp)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 “공부 많이 헌 것들이 도둑놈 되드라” [이광이 잡념잡상]](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2715.webp)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 극우 포퓰리즘이 몰려온다 [홍성수 칼럼]](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211/20250211503664.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