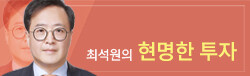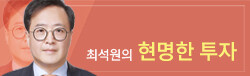코로나19 충격 이후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한계 수준까지 낮추고 거의 제한 없이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나서자, 인플레이션 현상을 이용해 투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때 주식을 사는 것이 좋은가를 묻는 경우가 많다. 우리 머릿속에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화폐적인 현상’이라는 명제가 단단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투자에서 인플레이션을 대할 때는 ‘금리가 낮고 돈은 풀리니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을 거야’라는 단순한 생각보다 훨씬 많은 점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돈이 풀렸을 때 어떤 가격이 올라갈 것인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 돈이 풀린 후 특정 가격은 올라가는 반면 다른 가격은 올라가지 않는 현상이 자주 관찰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가를 얘기할 때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를 기준으로 한다. 오랜 연구를 통해 정밀한 기준으로 경제 전체의 일반 물가 수준을 측정한 지표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실생활과 괴리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물가가 낮아도 가계가 느끼는 체감물가가 높은 경우가 많고, 집값과 주가 등 자산의 가격이 크게 올라도 소비자물가가 오르지 않는 경우 역시 허다하다.
만약 저금리와 유동성으로 소비자물가가 오른다면 좋은 투자 대안은 물가연계채권과 금이다. 이 두 자산은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만으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돈을 많이 푸는 시점에는 항상 가격이 들썩인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물가지표가 높아지지 않으면 두 자산의 가치는 다시 떨어진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저금리와 양적완화 환경 하에서도 각국의 소비자물가는 크게 오르지 않아, 기대만으로 크게 올랐던 금값과 물가연계채권 가격은 다시 크게 떨어졌다.
집값은 어땠을까? 나라별로 차이가 있지만 부동산 가격은 2008년 이후 저금리와 맞물려 올랐다. 하지만, 집값에는 저금리와 유동성 이외에도 각국의 정책과 심리가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 그림에서 확인되듯이 금융위기 이후 국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은 주로 2017년 이후 현재까지다. 그 전에는 저금리 하에서도 공급과 유동성 조절 등 정부 정책, 그리고 심리 안정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았던 것이다. 즉, 저금리만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설명하기 어렵다.
주가도 살펴보자. 미국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주가가 많이 올랐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저금리가 물가를 자극하고 이 때문에 기업 수익이 좋아져 주가가 올랐다고 보긴 어렵다. 물가 자체가 낮았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는 미국 신기술 기업의 높은 경쟁력이 풀린 돈을 끌어들였다. 반면 수출의존도가 높고, 신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 수가 적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는 풀린 돈이 몰리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 주가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수준이다. 결국 금리가 낮으면 주식에도 긍정적인 기대가 형성되지만, 모든 국가의 증시나 모든 주식에 돈이 흐르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돈을 풀어도 경쟁력을 가진 증시와 주식에 돈이 집중되며 차별화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엄청난 규모의 돈을 풀고 있는 이번에는 어떨까? 역시 소비자물가는 크게 오르지 않을 것 같다. 전염병 충격이 수요곡선을 이동시켜 물가 하락 압력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최근 돈을 푼 기대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금값과 물가연계채권 가격 상승은 어느 순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금리와 유동성을 볼 때 집값, 주가 등 자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과거 경험상 부동산은 공급과 정부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제대로 된 정책이 시행되기만 한다면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풀린 돈은 결국 경쟁력을 가진 증시와 주식에 흐를 가능성이 높다.
SK증권 리서치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