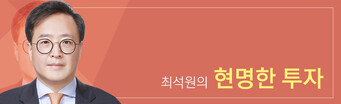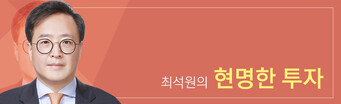지난 한 달 동안 글로벌 금융시장의 화두는 실리콘밸리은행(SVB)을 비롯한 일부 미국 은행들의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과 자금 이동,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행보였다. 하지만, 글로벌 증시는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 파산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박스권 흐름을 지속했다.
증시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정책당국의 대응이 빨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시스템 위험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이번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예금자를 보호하고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했다. 이 과정에서 미 연준의 자산은 3400억달러 정도 늘었는데 이는 지난해 3월 이후 양적 긴축으로 1년 가깝게 줄였던 자산 규모의 절반에 달한다. 시중 유동성 증가를 자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 보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거의 시차 없이 나온 셈이다.
이는 통화 긴축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대로도 이어졌다. 3월 중 연준이 정책금리를 0.50%포인트까지 인상할 것으로 본 금융시장은 실리콘밸리은행 사태 이후 0.25%포인트 인상 또는 동결로 전망을 바꿨고, 연준은 실제로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물가를 잡아야 했지만, 금융시장 불안을 방치할 수 없었던 것이다. 다른 나라들에서도 통화 긴축 속도가 조절되거나 오히려 정책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 있다는 전망이 강해지며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내렸다. 이러한 전망 변화와 시장금리 급락이 각국 증시 하락을 방어하고 있다.
또한 이번 위기는 2008년 금융위기를 촉발한 근원적 신용 위험보다는 만기 불일치에 따른 유동성 위험에 기인했다. 두 위험 모두 뱅크런과 급격한 자금 이동을 초래해 금융시스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유사하다. 그러나 유동성 공급으로 시간을 벌어 줘도 해결이 어려운 신용 위험과 달리 유동성 위험은 돈을 풀어주면 시간에 걸쳐 자생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 각국 증시는 이러한 부분도 반영하고 있다.
물론 유동성 위험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신용 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뱅크런이 이어져 미국의 지방은행이 큰 타격을 받는 가운데 상업용 부동산 대출 등 특정 자산의 가치도 급락하거나 부실화하면 전체 금융시스템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달러 가치나 국가 위험 지표를 볼 때 아직 미국의 전반적인 신용 위험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고용시장 상황 등을 살펴보면 강한 경기 침체가 나타날 가능성 역시 커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아직 안정되지 않은 물가다. 연준이 충분히 물가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금융시장 위험과 이에 대한 대응은 다시 물가 기대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 현재 유동성 공급이 코로나19 직후의 유동성 공급과 달리 주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으나 물가 기대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를 인식하고 있는 중앙은행들은 과거 유동성 위기 국면만큼 완화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즉,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와 크고 작은 유동성 위험의 발현, 그리고 금융시장의 부분적 경색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통화정책이 물가, 경기, 금융시장 안정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지금, 주식 시장은 큰 위험도 큰 수익도 기대하기 어렵다.
SK증권 미래전략부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