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 속 한 장면.
[토요판] 김세윤의 재미핥기
고장난 엘리베이터 때문이다. 폴이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에 들어가게 된 것은. 할 수 없이 계단을 이용해 내려가던 그가 4층, 아니 정확히 말하면 3과 ¾층쯤 되는 곳의 벽에서 작은 틈을 발견한다. 틈에 손을 넣어 당겨보니 문짝이다. 손잡이도 없는 문을 열고 들어간 폴에게 프루스트 아줌마가 차와 마들렌을 건넨다.
차 한 모금 마들렌 한 입. 그만 정신을 잃고 마는 폴. 잊고 있던 어린 시절 기억 속을 헤매다가 깨어보니 다시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 그날 이후 폴은 매일 그녀의 집을 찾아간다. 3과 ¾층 벽에 난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간다. 차를 마시고 마들렌을 먹은 뒤 꿈꾸듯 정신을 잃었다가 웃으며 현실로 돌아온다. 아빠와 엄마를 잃기 전의 시간으로 돌아가 잠시나마 행복해지는 것이다.
지난주에 개봉한 프랑스 영화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은 주인공 폴 ‘마르셀’이 마담 ‘프루스트’를 만나는 이야기다. 자신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스스로 신비한 최면술에 걸리는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로 우려낸 차이면서, 그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반죽해 구워낸 마들렌인 셈이다. 하지만 그 맛과 색이 분명 소설의 그것과는 다르다. 영화가 좀더 어여쁘고 훨씬 더 달콤하다. 소설이 보여주지 않은, 오직 영화에만 존재하는, 아주 작고 소중한 ‘틈’ 하나가 그리 만들었다.
아파트 3층과 4층 사이 계단 벽에 난 작은 문. 그 안에서 폴이 마담 프루스트를 처음 만나는 순간, 나는 영화 <존 말코비치 되기>(1999)를 떠올렸다. 주인공 크레이그가 찾아간 회사의 7과 ½층을 기억해냈다. 폴이 3과 ¾층 벽에서 찾아낸 이상한 문은, 천장이 낮아 허리도 제대로 펼 수 없던 7과 ½ 층 사무실 캐비닛 뒤에서 크레이그가 우연히 찾아낸 좁은 문을 닮았다. 그 문을 통해 크레이그가 배우 존 말코비치의 머릿속으로 들어갔듯, 폴은 어린 시절의 자기 머릿속으로 들어간 셈이다. 마치 킹스크로스역 9번 플랫폼과 10번 플랫폼 사이 기둥을 향해 돌진하던 해리 포터처럼. 그 기둥 너머 9와 ¾ 승강장에서 호그와트행 열차에 오르던 아이들처럼. 3과 ¾층 벽에 난 작은 틈을 지나서야 폴은 드디어 마법의 타임머신에 탑승할 수 있었다.
영화는 결국 세상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것. 그리하여 잠시 다른 세상을 상상하는 ‘짬’을 내는 것. 2층, 3층, 4층…. 세상이 정해놓은 층만 오르내려서는 절대 알아챌 수 없는 수많은 ‘틈’을 ‘문’으로 바꾸어 관객에게 열어주는 것. 3과 4 사이의 3과 ¾, 7과 8 사이의 7과 ½, 9와 10 사이의 9와 ¾…. 그렇게 어떤 것들의 ‘사이’를 부지런히 넓혀 현실과 공상의 ‘차이’를 열심히 좁히는 것. 그게 바로 영화의 진짜 미덕이 아닐까.
개봉을 앞둔 영화 <안녕, 헤이즐>에서 참 근사한 대사를 들었다. “0과 1 사이엔 사실 무수히 많은 수가 있다”는 거다. 0.1, 0.12, 0.112…. 이렇게 “0과 1 사이에만도 하나의 무한대가 존재”하는 게 세상이라는 거다. 그러므로 하나의 삶은 유한하지만 하나의 삶과 또 다른 하나의 삶 ‘사이’에는 무한한 흔적과 시간이 남는 법이라고, 영화가 내게 말했다. 남겨진 사람이 그 흔적과 시간을 잊지 않는 한 이미 사라져버린 다른 하나의 삶도 무한이 될 수 있다고, 영화가 내게 속삭여 주었다.
3층, 4층, 5층…. 세월호의 도면이 말해준 숫자들. 하지만 3층과 4층 사이, 4층과 5층 사이마다 각각의 무한대가 존재할 것이다. 파도가 격벽을 무너뜨릴지라도 격벽과 격벽 사이를 채운 무수히 많은 사연과 흔적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남겨진 사람들이 잊지 않는 한 떠난 이들의 삶은 무한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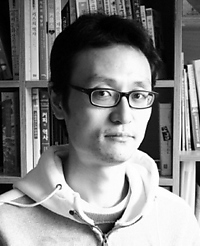 나는 바란다. 당사자가 아니어서 그저 ‘바라는’ 수밖에 없으므로 다만 간절하게 바란다. 언젠가, 지금은 힘들겠지만 앞으로 언젠가, 유족들과 생존자들이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을 보게 된다면, 그래서 폴과 함께 3과 ¾층의 틈을 비집고 들어간다면, 그때 부디 꿈꾸듯 추억에 빠져들었다가 웃으며 현실로 돌아오기를. 아이를, 아빠를, 엄마를, 형제를, 친구를 잃기 전의 시간으로 돌아가 잠시나마 행복해지기를. 슬픔과 아픔 사이에 영화로 잠시 ‘틈’을 만들고 마법의 타임머신에 탑승할 ‘짬’이 나기를. 지금은 힘들겠지만 앞으로 언젠가…. 꼭, 부디, 그렇게 되기를.
김세윤 방송작가
나는 바란다. 당사자가 아니어서 그저 ‘바라는’ 수밖에 없으므로 다만 간절하게 바란다. 언젠가, 지금은 힘들겠지만 앞으로 언젠가, 유족들과 생존자들이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을 보게 된다면, 그래서 폴과 함께 3과 ¾층의 틈을 비집고 들어간다면, 그때 부디 꿈꾸듯 추억에 빠져들었다가 웃으며 현실로 돌아오기를. 아이를, 아빠를, 엄마를, 형제를, 친구를 잃기 전의 시간으로 돌아가 잠시나마 행복해지기를. 슬픔과 아픔 사이에 영화로 잠시 ‘틈’을 만들고 마법의 타임머신에 탑승할 ‘짬’이 나기를. 지금은 힘들겠지만 앞으로 언젠가…. 꼭, 부디, 그렇게 되기를.
김세윤 방송작가
김세윤 방송작가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