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플립>(2010).
[토요판] 김세윤의 ‘재미핥기’
그림을 그리시던 아빠가 풍경화의 마법을 설명하신다. “소는 그냥 소이고, 초원은 그냥 풀과 꽃이고, 태양은 그냥 한 줌의 빛일 뿐이지만 그 모든 게 함께 어우러지면 마법이 되거든. 부분이 모여 아름다운 전체를 이루는 거지.”
열세살 소녀 줄리는 아빠 얘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부분이니 전체니 하는 말부터가 아직 낯설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로 날린 연이 버스정류장 옆 플라타너스에 걸린 날, 크고 높은 나무를 줄리가 씩씩하게 타고 오른다. 가지 끝에 걸린 연을 간신히 떼어낸다. 그때 문득 눈앞에 펼쳐진 황홀한 풍경. 땅에서는 보지 못한, 오직 나무 위에서만 보이는 찬란한 광경. 훗날 줄리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한다. “나무 위에서 석양을 바라보던 날, ‘부분이 모여 아름다운 전체를 이룬다’는 아빠 말씀이 비로소 머리에서 가슴으로 옮겨왔다.”
그날 이후 줄리가 나무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땅 위로 높이 들어올려져 바람에 어루만져지는 느낌”이 좋아서 그랬다. 하지만 불행히도 마을에는 그 나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어른들이 있었다. 크고 못생기고 쓸모없는 플라타너스 따위 확 베어버리는 게 낫다는 것이다. 결국 전기톱 든 아저씨들이 나무 밑에 모인다. 당장 내려오라고 소리친다. 줄리는 내려가지 않았다. 경찰이 와도 버텼다. 나무 한 그루가 사라지는 건 곧 ‘아름다운 전체’가 사라지는 것이므로. 크고 높은 나무가 거기, 그렇게, 가만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괜히 마음이 든든했으므로. 줄리는 나무를 지켜주기로 결심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2014년 7월17일 현재 포털사이트 네티즌 평점 9.5를 기록중인 작품. 그런데도 끝내 극장에서 개봉하지 못하고 디브이디(DVD)와 아이피티브이(IPTV)로 직행한 할리우드 로맨틱 성장 드라마. 영화 <플립>(2010)의 포스터엔 주인공 줄리와 줄리가 사랑한 소년 브라이스의 뒷모습이 담겨 있다. 열세살 소년 소녀의 사랑과 우정과 성장을 묵묵히 지켜보던 영화 속 플라타너스가 근사한 실루엣을 뽐내며 아이들과 함께 포스터 안에 서 있다.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그리고 나무 한 그루. 영화 <플립>의 이야기를 예쁘게 잇는 세 꼭짓점. 이 영화에서 나무는 단순한 소품이 아니다. 또 하나의 주인공이다.
그 남자의 작품에서도 나무는 언제나 주인공이었다. 그런데 주인공을 돋보이게 만드는 방법이 엽기였다. 단 한 그루의 나무를 돋보이게 하려고 다른 나무 수십 그루를 마구 베어낸 사진작가라니. 그가 베어낸 나무 중에는 수령이 220년 된 금강송도 있다던가. 크고 못생기고 쓸모없는 나무 따위 확 베어버리는 게 낫다며 전기톱 들고 달려든 영화 <플립>의 어른들이 생각났다. 자신의 카메라에 담길 ‘부분’이 조금 더 돋보이라고, 자연이 빚어낸 ‘아름다운 전체’의 허리를 끊어버린 그의 무지와 탐욕이 끔찍했다.
모든 생명은 저마다의 속도로 세상을 산다. 돌고래가 헤엄치는 속도 시속 60㎞. 치타가 달리는 속도 시속 100㎞. 바퀴벌레도 도망갈 땐 최고 시속 150㎞를 낸다. 온통 빠르고 재빠른 생물들 틈에서 꿋꿋하게 시속 0㎞의 속도로 살아가는 생물. 나무. 이 지독한 느림보는 “지구 어디에서나 자신의 자리에 서서 다른 생명체를 잡아먹지 않은 채 지구 생명체 중 가장 크게, 모든 생명체 중 가장 오래 살 수 있다.”(<지식채널 e>(북하우스) 339쪽 ‘시속 0㎞’ 중)
21세기 인간이 성취한 속도. 시속 8000㎞(음속의 8배). 가장 빠른 속도로 지구를 망가뜨리는 우리에게 나무의 속도는 어떤 의미일까. 남을 해치거나 상처 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나아가 다른 생명까지 먹여 살리는 경이롭고 아름다운 공존의 속도. 시속 0㎞. 나무는 다른 생명과 싸우지 않는다. 오직 중력과 싸우며 솟아오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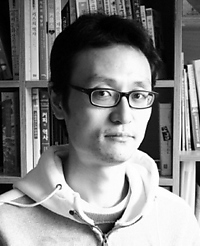 결국 어른들은 줄리의 플라타너스를 벤다. 줄리는 2주 동안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다. 그 어느 것도 위로가 되질 않았다. 나무 위에서 만난 세상이, 그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석양이 영원히 사라져버렸다. 크고 높은 나무가 거기, 그렇게, 가만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괜히 든든했던 아이는 하루아침에 마음 기댈 곳을 잃었다.
평창 동계올림픽 스키장을 만들기 위해 가리왕산의 울창한 숲을 밀고 나무 5만여 그루를 벤다고 들었다. 한 그루 자르면 성장영화를 만들지만 5만 그루로 만들 건 재난영화뿐이다. 하아…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온다.
김세윤 방송작가
결국 어른들은 줄리의 플라타너스를 벤다. 줄리는 2주 동안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다. 그 어느 것도 위로가 되질 않았다. 나무 위에서 만난 세상이, 그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석양이 영원히 사라져버렸다. 크고 높은 나무가 거기, 그렇게, 가만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괜히 든든했던 아이는 하루아침에 마음 기댈 곳을 잃었다.
평창 동계올림픽 스키장을 만들기 위해 가리왕산의 울창한 숲을 밀고 나무 5만여 그루를 벤다고 들었다. 한 그루 자르면 성장영화를 만들지만 5만 그루로 만들 건 재난영화뿐이다. 하아…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온다.
김세윤 방송작가
김세윤 방송작가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