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 그만둔대>의 한 장면.
[토요판] 김세윤의 재미핥기
잘생기고 키 크고 운동도 잘하는 키리시마. 학교 ‘킹카’면서 배구부 에이스. 녀석이 연습에 나타나지 않았다. 학교 전체가 술렁였다. 수군수군 속닥속닥. 아이들의 입에서 입으로 바삐 전해진 문장이 그대로 영화 제목이 되었다.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 그만둔대>
키리시마가 배구부 활동을 그만둔 금요일부터 키리시마의 친구들이 학교 옥상에 집결하는 화요일까지. 어느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자기 학교 에이스가 사라진 4박5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지켜보는 영화. 그런데 짜임새가 조금 특별하다.
가령 이런 식이다. 키리시마의 여자친구 리사와 단짝들이 방과 후 빈 교실 뒤에 모여 앉는다. 키리시마처럼 “뭐든 잘할 것 같은” 남학생이 또 누가 있는지, 그중 누구의 얼굴과 몸매가 제일 좋은지, 신나게 떠들어댄다. 그러다 뒤늦게 알아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던 교실 1분단 맨 앞자리에 실은 아까부터 마에다(카미키 류노스케)가 앉아 있다는 사실을. 한 여학생이 슬쩍 눈짓하며 속삭인다. “다 들리는 거 아냐?” 다른 아이가 말한다. “됐어. 뭐 어때.” 때마침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간 마에다를 화제 삼아 아이들이 다시 떠들어댄다. 영화 동아리 활동을 하는 마에다의 작품을 비웃으며 큰 소리로 깔깔댄다.
잠시 뒤. 조금 전 교실 풍경을 처음부터 다시 보여주는 영화. 카메라 앵글만 바뀌었다. 아까는 내내 등만 보이던 마에다의 얼굴을 이번엔 볼 수 있다. “다 들리는 거 아냐?” 움찔하는 마에다. “됐어. 뭐 어때.” 애써 태연한 척 가방을 싸는 마에다. 깔깔대는 소리가 창문을 넘어온다. 복도를 걷는 마에다의 머리 위로 아이들의 비웃음이 물벼락처럼 쏟아진다. 이젠 익숙해질 만도 한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
나도 키리시마가 아니었다. 잘생기지 않았고 운동도 그냥저냥. 그래도 다행히(!) 키가 작지 않았다. 교실 맨 뒤에서 딴짓하는 아이로 학창 시절을 보냈다. 내가 앉은 자리에서는 반 아이들 뒤통수가 다 보였다. 키가 좀 크다는 이유만으로 누린 ‘시선의 권력’이었다. 소위 ‘잘나가는 뒷동네 아이들’ 눈높이에 덩달아 내 가늠쇠를 맞추려 하던 그때. 정말 부끄럽게도, 누군가의 머리 위로 물벼락처럼 쏟아진 수많은 “깔깔깔” 가운데 분명 내 입에서 나온 생각 없는 웃음도 있었을 것이다. 어느 반에나 ‘마에다’는 있었으니까.
영화의 미덕은 내가 서보지 못한 자리에 나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미처 보지 못하고 지나친 세상을 다시 살펴보게 만드는 것이다. 교실 맨 뒤에서 학창 시절의 대부분을 보낸 나는 이 영화 덕분에 반 전체를 등지고 앉은 맨 앞자리 아이의 시선을 잠시 빌릴 수 있었다. 소심한 ‘오타쿠’ 마에다의 눈으로 금요일 오후 학교 풍경을 다시 보게 되었다. “됐어. 뭐 어때.” 눈앞에 존재하는 사람을 순식간에 아무 데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말의 위력도 조금은 헤아리게 되었다.
영화 <우아한 거짓말>에서 따돌림당하는 천지(김향기)가 말한다. “아이들은 항상 ‘우리’였고 나는 ‘얘’였다”고. ‘우리’들이 밀쳐낸 ‘얘’로 살아남기가 힘들어 천지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마에다에겐 다행히 카메라가 있었다. 좀비들이 키리시마의 잘난 친구들을 물어뜯는 장면을 찍으며 마음속 응어리가 잠시 풀렸다. 조금 더 버틸 힘을 얻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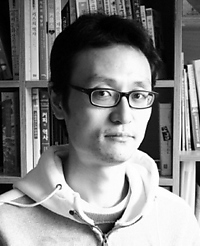 지오피(GOP) 총격 사건 보도 가운데 내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른 기사 한 토막. “비쩍 마른 임 병장을 아주 희화적으로 그려놓고요. 그 주위에 사람 눈을 여러 개 그렸어요. 우리가 너를 보고 있다, 왕따시키고 있다는 극단적인 표현 아니에요? 그 눈들은 다 조롱의 눈이죠. 그 눈, 임 병장 주위를 둘러싼 그 눈을 보고 저는 소름이 돋더라고요.”(<한수진의 SBS전망대> 임 병장 변호인 인터뷰 중에서)
불행히도 그때, 임 병장은 카메라 대신 총을 쥐고 있었다. 모두가 나만 쏘아보는 ‘괴로움’과 그런 나를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외로움’. 임 병장을 둘러싼 이 ‘시선의 과잉’과 ‘시선의 결핍’은 결국 같은 탄창 안에 들어간 총알이다. 방아쇠를 당긴 건 ‘얘’지만 탄창을 끼운 건 ‘우리’다. ‘피해자 임 병장’은 그렇게 ‘가해자 임 병장’이 되었다. 그제야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김세윤 방송작가
지오피(GOP) 총격 사건 보도 가운데 내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른 기사 한 토막. “비쩍 마른 임 병장을 아주 희화적으로 그려놓고요. 그 주위에 사람 눈을 여러 개 그렸어요. 우리가 너를 보고 있다, 왕따시키고 있다는 극단적인 표현 아니에요? 그 눈들은 다 조롱의 눈이죠. 그 눈, 임 병장 주위를 둘러싼 그 눈을 보고 저는 소름이 돋더라고요.”(<한수진의 SBS전망대> 임 병장 변호인 인터뷰 중에서)
불행히도 그때, 임 병장은 카메라 대신 총을 쥐고 있었다. 모두가 나만 쏘아보는 ‘괴로움’과 그런 나를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외로움’. 임 병장을 둘러싼 이 ‘시선의 과잉’과 ‘시선의 결핍’은 결국 같은 탄창 안에 들어간 총알이다. 방아쇠를 당긴 건 ‘얘’지만 탄창을 끼운 건 ‘우리’다. ‘피해자 임 병장’은 그렇게 ‘가해자 임 병장’이 되었다. 그제야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김세윤 방송작가
김세윤 방송작가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