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말레피센트>
[토요판] 김세윤의 재미핥기
‘울산 국어 교사 모임’이 내게 강연을 청했다. 풉. 내 주제에 강연? 못하겠습니다, 하며 정중히 고사한 뒤 이동진 기자나 김영진 평론가의 전화번호를 알려줘야 마땅할 것이나 나는 그리하지 않았다. “저 인간의 강연에 비하면 내 수업은 참으로 알차지 아니한가!” 선생님들께 그런 자신감을 선물하고 싶었다고 해두자. 그리하여 지난 주말, 울산 어느 교실에 식은땀을 흘리며 서 있게 된 나.
조잡하고 허접한 강연이 끝난 뒤 선생님들과 함께 모둠 수업 대형으로 둘러앉았다. 다행히 물어뜯을 치킨이 앞에 있어서 그분들이 굳이 나를 물어뜯진 않았다. 마땅히 집어 던질 돌멩이가 없으니 아쉬운 대로 질문을 단단히 빚어 힘껏 던지는 선생님이 많았다.
“반 아이들과 <말레피센트>(사진)를 보았습니다. 마냥 재밌다며 박수들을 치는데 이럴 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남학생 반을 맡고 있습니다. 그 나이의 아이들이 보면 좋을 영화는 뭘까요?” “국어 수업에 도움이 될 영화를 추천한다면?” 쓸만한 대답이 나오길 기대하며 내 입만 쳐다보던 수많은 눈동자. 최선을 다해 그들의 시선을 외면하던 나의 두 눈동자. 기차 시각을 핑계로 빠져나와 서울로 돌아오는 길. 뒤늦게 ‘쓸만한 대답’ 하나를 생각해냈다. 문득 이 문장이 떠오른 것이다.
“시를 읽는 즐거움은 오로지 무용하다는 것에서 비롯한다. 하루 중 얼마간을 그런 시간으로 할애하면 내 인생은 약간 고귀해진다.” 소설가 김연수가 책 <우리가 보낸 순간-시>(마음산책)의 첫 장에 써넣은 말. ‘시’를 ‘영화’로 바꾸어 다시 읽어본다. “영화를 보는 즐거움은 오로지 무용하다는 것에서 비롯한다. 하루 중 얼마간을 그런 시간으로 할애하면 내 인생은 약간 고귀해진다.” ‘고귀한 인생’이 ‘무용한 시간’에서 비롯되는 이치를 작가는 이렇게 설명한다. “시를 읽는 동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무용한 사람이 된다. 시를 읽는 일의 쓸모를 찾기란 무척 힘들기 때문이다. 아무런 목적 없이 날마다 시를 찾아서 읽으며 날마다 우리는 무용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최소한 1시간은 무용해질 수 있다.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뭔가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걸 순수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우리는 날마다 시를 읽는 것만으로도 그 순수한 존재를 경험할 수 있다.” 이번에도 ‘시’를 ‘영화’로 바꾸어 다시 읽으며 나는 울산에서 만난 젊은 교사들의 열정 가득한 눈동자를 떠올린다.
모든 어른들이 그러하듯 선생님들 또한 어떤 사명감을 갖고 있었다. 아이들에게 좋은 말과 좋은 생각을 항상(!) 가르쳐야 한다는 사명감. 부모들이 자녀에게 그냥 만화보다는 ‘학습 만화’를 사주려 애쓰는 것처럼, 선생님들은 영화를 그냥 ‘보기’만 하는 아이들에게 영화 ‘읽기’의 새로운 차원을 가르치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힘빠지게도, 영화 보는 시간일랑 애초에 별 쓸모가 없는 시간이다. 쓸모없다는 게 영화의 유일한 쓸모다.
<말레피센트>가 마냥 재밌다며 박수 친 아이들은 마냥 재미있는 2시간을 경험한 것으로 충분하다. 온갖 ‘쓸모 있는 시간’에 짓눌린 녀석들이 잠시나마 숨통이 트였을 것이다. 그 나이의 학생들이 ‘보면 좋을’ 영화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 나이의 학생들이 ‘보면 좋아할’ 영화가 따로 있을 뿐이다.
영화를 본다는 건 잠시 딴생각을 한다는 뜻. 잠깐 한눈을 판다는 뜻. 세상엔, 딴생각을 해야만 들려오는 어떤 소리가 있고, 한눈을 팔아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어떤 풍경이 있다. 그렇게 보고 들은 소리와 풍경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마음 한켠에 눈처럼 소복이 쌓인다. 그 눈을 뭉쳐 제법 근사한 눈사람을 만들 날이 나중에 온다. 지금은 쓸모없어 보이는 영화적 체험들이 언젠가 제 쓸모를 찾게 된다. 그때까지 아이들에겐 무언가를 자꾸 ‘말해주는’ 어른만 필요한 게 아니다. 먼저 ‘들어주는’ 어른도 필요하다. 자기 마음에 오늘 어떤 눈송이가 내려앉고 있는지 신나게 떠들어대는 아이들. 녀석들이 지금보다 더 풍부하고 정확한 모국어로 떠들 수 있게 단어와 문장을 가르치는 국어 선생님은 꼭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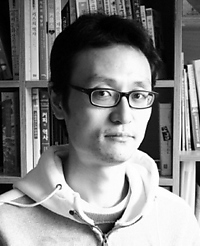 “설명하지 마라. 친구라면 설명할 필요가 없고 적이라면 어차피 당신을 믿으려 하지 않을 테니까.” 미국 작가 앨버트 허버드의 말이 부디 선생님들께 위안이 되기를. 친구란, 결국 쓸모없는 시간을 기꺼이 함께 보내는 사이이므로. ‘쓸데없는 영화’도 기꺼이 함께 보는 선생님이라면 굳이 다른 설명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김세윤 방송작가
“설명하지 마라. 친구라면 설명할 필요가 없고 적이라면 어차피 당신을 믿으려 하지 않을 테니까.” 미국 작가 앨버트 허버드의 말이 부디 선생님들께 위안이 되기를. 친구란, 결국 쓸모없는 시간을 기꺼이 함께 보내는 사이이므로. ‘쓸데없는 영화’도 기꺼이 함께 보는 선생님이라면 굳이 다른 설명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김세윤 방송작가
김세윤 방송작가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