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라자르 선생님>(2011)
[토요판] 김세윤의 재미핥기
그날 아침, 시몽이 본 것은 다리였다. 허공에 떠 있는 선생님의 다리. 시몽이 물러서자 알리스가 다가왔다. 방금 시몽이 본 것을 알리스도 보았다. 교실 천장에 목을 매 숨져 있는 선생님의 뒷모습.
캐나다 영화 <라자르 선생님>(2011)은 그렇게 시작한다. 소설 <우아한 거짓말>의 첫 문장을 빌려 말하면, 내일의 수업을 준비하던 마틴 선생님이, 오늘 죽었다. 다른 아이들은 ‘허공에 떠 있는 선생님의 다리’를 직접 보지 못했다. 하지만 겁에 질린 시몽과 알리스의 얼굴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어떤 아이는 악몽을 꾸기 시작했고, 어떤 아이는 전학을 간다고 했다.
학교는 서둘러 죽음의 흔적을 지웠다. 교실을 새로 칠하고 새 담임을 채용했다. 알제리에서 19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얼마 전 캐나다로 이민 왔다는 바시르 라자르 선생님. 첫 수업 시간에 한 아이가 멍하니 위만 쳐다보고 있다. 텅 빈 천장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선생님이 이유를 묻는다. 다른 아이가 대답한다. “거기가 마틴 선생님이 돌아가신 곳이에요.”
페인트칠로 죽음의 흔적을 지우는 건 실패했다. 마틴 선생님의 두 다리가 여전히 아이들 마음속 허공에 떠 있기 때문이다. 왜 하필 교실에서 자살하신 건지 아이들은 알고 싶었다. 자신들에게 화가 나서 일부러 그렇게 떠나신 건지 아이들은 묻고 싶었다. 하지만 어른들이 모든 질문을 막았다. 그래야 빨리 잊힐 테니. 우울증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선생님께 원래 우울증이 있었다고 말해봐야 무슨 소용 있냐는 생각도 했을 것이다.
라자르 선생님만 생각이 달랐다. 죽음을 ‘잊고’ 사는 건 불가능하니, 죽음을 ‘안고’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게 낫다고 믿는다. 상처는 ‘말’이 아니라 ‘침묵’ 때문에 덧나는 것이니.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면 그 죽음이 너희들 탓이 아니라는 말도 해줄 수 없으니. 아이들과 함께 마틴 선생님 이야기를 한다. 기어이 울음을 터뜨린 아이를 토닥이고 다시 겁에 질린 아이를 품에 안는다. 부모들은 기겁한다. 그들에게 라자르는 토닥이고 안아준 선생님으로 기억되지 않는다. 겨우 가라앉은 상처를 자꾸 들쑤시는 선생님일 뿐이다.
라자르 선생님이 아이들을 위해 지은 짧은 우화. 선생님은 끝까지 담담하게 읽어 내려갔지만 난 이 우화를 들을 때마다 자꾸 눈물이 고인다.
“올리브나무 가지에 에메랄드 빛 번데기가 매달려 있습니다. 나무는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번데기를 지키기 위해 바람을 가리고 개미를 막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떠나보내야 합니다. 내일이면 나비가 돼 훨훨 날아갈 것입니다. 짓궂은 적이 우글대는 험한 세상으로.
그날 밤, 뜨거운 불꽃이 숲을 집어삼켰습니다. 번데기는 나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연기가 잦아든 새벽녘, 나무의 마음은 까만 숯이 됐고 화염과 슬픔으로 큰 생채기가 남았습니다. 훗날 나무는 팔에 날아 앉은 새에게 번데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름다운 날개를 활짝 펴고 푸른 하늘을 날아다니며 꽃꿀을 맘껏 빨아들이는, 자신이 사랑했던 아름다운 나비 이야기를….”
봄이 온다. 꽃이 핀다. 나비가 난다. 이 따뜻한 봄날에 어떤 이는 목을 맨다. 어떤 이는 저 아래 꽃밭으로 몸을 던지고, 또 어떤 이는 나비가 들어올 수 없게 창문 걸어잠그고 번개탄을 피운다. 뜨거운 불꽃이 매일 수많은 ‘내일’을 집어삼키는 이 ‘짓궂은’ 시대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까만 숯이 되어버린 서로의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질 것인가.
라자르 선생님은 이야기를 택했다. 번데기로 끝나버린 이들에게 날개 달린 해피엔딩을 선물했다. 이야기 속에서 그들은 잠시나마 푸른 하늘을 날아다니는 나비가 된다. 그리고 라자르 선생님은 스스로 나무가 되기로 결심했다. 화염은 막을 힘이 없지만 바람과 개미라도 막아주려 애썼다. 그 넉넉한 나무의 품에 안긴 뒤에야 알리스는, 그리고 그 세심한 나무가 등을 두드려준 뒤에야 시몽은, 비로소 조금 괜찮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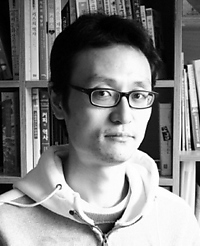 품을 내어주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 어떤 사람을 품에 안고 등을 두드리는 건 그 사람 마음속 응어리를 내 품에 다 토해놓고 가라는 뜻. 눈 덮인 겨울 아침의 죽음에서 시작해 눈부신 봄날 오후의 포옹으로 끝나는 영화 <라자르 선생님>은 나비가 되고 싶은 아이들과 나무가 되고 싶은 선생님의 이야기다. 봄이 왔지만 아직 봄을 맞지 못한 이들을 품에 안고 토닥토닥, 등 두드려주는 영화다. 지난해 봄에 개봉했던 영화를 이제라도 꼭 소개하고 싶은 이유다.
김세윤 방송작가
품을 내어주는 것은 사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 어떤 사람을 품에 안고 등을 두드리는 건 그 사람 마음속 응어리를 내 품에 다 토해놓고 가라는 뜻. 눈 덮인 겨울 아침의 죽음에서 시작해 눈부신 봄날 오후의 포옹으로 끝나는 영화 <라자르 선생님>은 나비가 되고 싶은 아이들과 나무가 되고 싶은 선생님의 이야기다. 봄이 왔지만 아직 봄을 맞지 못한 이들을 품에 안고 토닥토닥, 등 두드려주는 영화다. 지난해 봄에 개봉했던 영화를 이제라도 꼭 소개하고 싶은 이유다.
김세윤 방송작가
김세윤 방송작가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