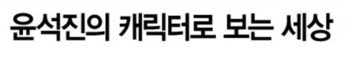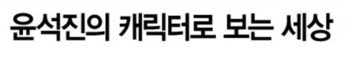2022년 3월 실시될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를 선출하려는 각 정당의 경선이 치열하다.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앞서는 여당 예비 후보들 사이 사생결단식 검증 공방이 ‘적벽대전’에 비유된다. 예비 후보들을 태우려고 준비한 야당의 ‘경선버스’는 졸지에 ‘가두리 양식장’으로 둔갑해 돌고래와 멸치 논쟁이 한창이다. 상대를 헐뜯고 깎아내리는 정치적 비방이 난무해 정책 경쟁과 검증이라는 경선 의미가 훼손될 지경이다. 코로나19로 인류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한민국 안전과 번영을 책임질 대통령의 자질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을지, 유권자로서 마뜩잖다.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 위상은 달라졌지만, 정치 행태만큼은 여전히 후진적이고 퇴행적인 현실이 놀랍지도 않다. 만약 대한민국이 정체불명의 역병이 휩쓸고 간 직후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진다면 정치인들이 어떻게 처신할지 자못 궁금하다. ‘가상의 디스토피아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정의와 인간 본성을 성찰한 드라마 <악마판사>(티브이엔)는 허중세(백현진)라는 가상의 대통령으로 이런 궁금증을 부분적으로나마 해소시킨다. 그는 대한민국 유권자의 상식에 맞지 않는 대통령이지만,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는 플라톤의 경고가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음을 환기하는 인물이다.
허중세는 구독자가 솔깃할 만한 정치적 음모론을 과장된 몸짓과 직설 화법으로 표현하면서 대중의 이목을 사로잡은 유튜버이다. 역병이 진정된 대한민국에서는 경제 위기가 이어지고, 약탈과 폭동이 발생한다. 허중세는 “강력한 법질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주창하는 파시즘적인 선동으로 정치 막후 세력 ‘사회적 책임 재단’의 정치적 허수아비로 낙점받는다. 재단의 막대한 자금과 미디어의 적극적 지원을 등에 업고 “부잣집에서 태어나 교육 잘 받고 출세한 특권층은 서민의 삶에 관심 없으니, 흙수저 출신의 허중세가 대한민국을 반드시 일으켜 세우겠다”며 서민의 표심을 공략한 끝에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대통령 허중세는 ‘강력한 사법 개혁’이라는 대선 공약 실행을 명분으로 ‘국민 참여 시범 재판부’를 설치한다. 하지만 재판장 강요한(지성)은 폐수 방출로 법정에 선 대기업 회장에게 금고 235년을 선고하는 등 거침없는 판결로 허중세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사회적 책임 재단 이사들을 궁지로 몰았다. 국민을 대상으로 모금 운동을 벌인 재단 사업 자금이 엉뚱한 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며 재단 실세의 비리도 폭로한다. 물론 가상의 디스토피아 대한민국이기에 가능한 이야기이다.
사법 불신이 강했던 대중이 강요한 판사에게 열광할수록, 허중세의 위기감은 고조된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한민국 토탈 체인지, 허중세의 개사이다! 애국자면 다 같이 구독, 댓글,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를 외치는 허중세는 자신의 방송이 사기와 위선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위기에 처하자 파시즘적 선동을 서슴지 않는다. “강요한 판사는 한국인 핏줄이 아니고,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외국 적대 세력과 내통하는 세력이라는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는 발언은, 순수 혈통에 기반한 민족주의로 대중을 현혹했던 히틀러가 주창했던 파시즘의 복사판에 불과하다. “강요한, 얘 진짜 뭐야? 빨갱이야?”라는 발언에서 그의 정치적 인식이 1970년대 유신정권에서 비롯한 것임을 암시한다.
대통령조차 사회적 책임 재단과 같은 단체에서 정치 자금을 후원받는 것이 당연한 <악마판사> 속 상황은 현실인 듯, 현실 아닌, 현실 같은 착시 현상을 유발한다. 아무리 드라마라도 대통령을 너무 형편없는 존재로 묘사한 게 아닐까 하는 장면도 나온다. 극단적인 진영 논리로 사사건건 대립하고 갈등하는 대한민국의 후진적인 정치 현실이라면 머잖은 미래에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모습이다.
드라마는 때로 현실을 환유하는 강력한 사회문화적 기제로 작용한다. <악마판사>의 허중세가 유권자들이 다음 대통령의 자질을 심사숙고하게 만드는 계기의 캐릭터였기를 바란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여차하면 허중세 같은 퇴행적인 파시스트가 뿌리내릴 수 있는 정치적 자양분으로 전이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 출마 후보자를 선출하는 각 정당의 경선 과정을 비판적인 안목으로 냉정하게 지켜봐야 하는 까닭이다.
대중문화평론가·충남대 국문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