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생각] 양경언의 시동걸기
나는 겨울로 왔고 너는 여름에 있었다
임승유 지음/문학과지성사(2020)
‘코로나19’의 증상이 있는지 살필 때 냄새를 맡을 수 있는지도 알아봐야 한다는 정보를 의미심장하게 여긴 적이 있다. 모니터를 앞에 두고 비대면 수업을 진행할 때였다. 주어진 화면을 통해 학생들과 함께 새로운 시공간을 만들어나가고 있다는 감각을 잃지 않으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강의실에서 진행됐던 수업과 비교한다면 말 그대로 그러한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했기 때문이다. 모니터 안에선 얼마든지 편집이 가능하고, 입체감이 없으며 결정적으로 냄새가 없다. 어떤 관계든지 추상적으로 느껴지기 십상이고, 바로 이러한 이유로 컴퓨터든 스마트폰이든 하나의 네모난 화면을 붙잡고 있는 이가 스스로 만든 생각에 갇히기 쉽기도 했다. 화면을 통한 소통이 거듭될수록 다른 풍경의 냄새와 섞일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을 저하시키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는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던진 과제가 증상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않을까 싶었다.
임승유의 시집 <나는 겨울로 왔고 너는 여름에 있었다>에 수록된 여러 시편들에서 포착된 말하는 이의 방식은 특별하다. 마치 시에서 울리는 목소리들이 추상화 속으로 물러나서 그 목소리가 시작된 곳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살피고, 그 자리에서 세밀화를 그려나가려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둘러보는 몸짓을 취하고 있는 것만 같다. 더군다나 시인이 세밀화로 그려나가야겠다 싶어 아직은 추상화로 제시하는 그곳은 언제나 다른 어디도 아닌 ‘여기’이다. “없어지지 않으면 좋겠다”(‘여기’)는 마음과 더불어 “조금 더”(‘얼마 지나지 않아’) 해볼까 싶은, 조심스러운 그러나 끊이지 않는 ‘생생히’ 살아 있고자 하는 다짐이 여기엔 촘촘히 심겨 있다.
한 행으로 이루어진 연마다 길고 짧은 호흡이 번갈아 이어질 때 연이 나눠지는 사이마다 ‘지금은 왜 이렇게 됐을까’ ‘지금과는 다른 상태도 있지 않을까’ 하는 화자의 고민이, ‘무엇을 놓쳤을까’ 싶어 그려보는 과거 어느 상황에 대한 그림의 윤곽이 드러난다. 시는 과거 어느 날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눴던 대화에서 “아무거나 줘”라고 아무렇게나 대충 임하지 말고, “사과에 대해” “우리가 갖게 된 여러 가지 사과의 맛과 종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야 했다고, “다양한 표정과 억양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생생한 현장을 건네줄 수 있어야 했다고 말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조금 더’ 충실해야 하고 ‘조금 더’ 그럴 수 있다. 평면화된 화면 속 추상적인 형태로 물러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든 조금 더 생생하게, 앞으로 그려나갈 세밀화에 필요한 것들을 헤아리면서.
양경언 문학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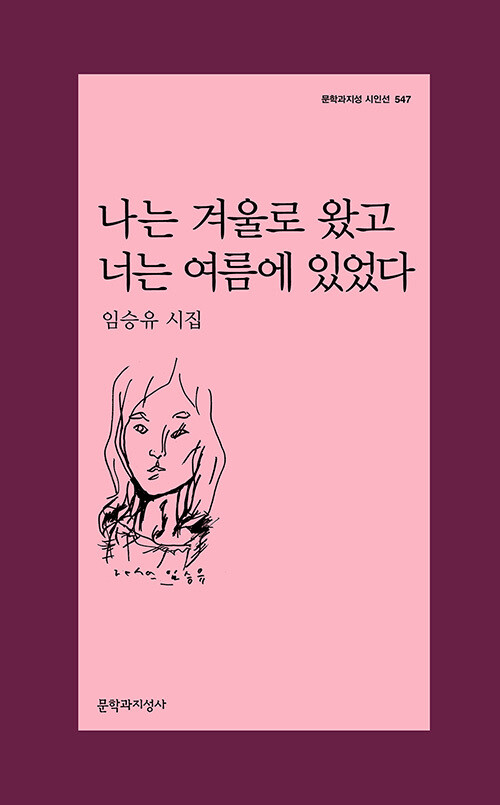
우리가 사과를 많이 먹던 그해 겨울에 너는 긴 복도를 걸어와 내 방문을 열고
사과 먹을래
물어보곤 했다. 어느 날은 맛있는 걸로 먹을래 그냥 맛으로 먹을래 그러기에 네가 주고 싶은 것으로 아무거나 줘 말해버렸고
오래 후회했다.
그날 사과에 대해 우리가 갖게 된 여러 가지 사과의 맛과 종류에 대해, 다양한 표정과 억양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뭔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임승유, ‘길고 긴 낮과 밤’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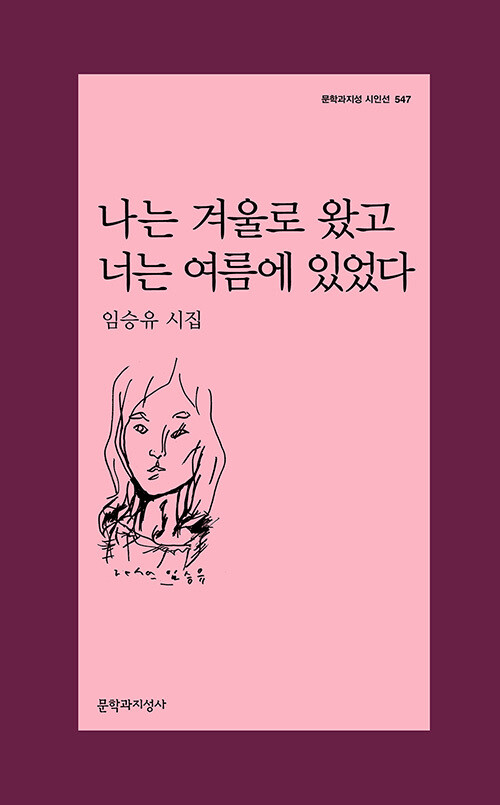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임유영의 ‘오믈렛’, 제 마음대로 죄송했던 마음의 정체 [책&생각] 임유영의 ‘오믈렛’, 제 마음대로 죄송했던 마음의 정체 [책&생각]](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3/1208/53_17019966324302_20231207503893.jpg)


![“남들 앞에서 하지 마세요”…요즘 젊은이들은 ‘칭찬’을 싫어한다? [책&생각] “남들 앞에서 하지 마세요”…요즘 젊은이들은 ‘칭찬’을 싫어한다? [책&생각]](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4/1108/971731026640596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