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막의 고독
황야에서 보낸 침묵의 날들
에드워드 애비 지음, 황의방 옮김 l 라이팅하우스(2023)
민들레 꽃씨 날리던 4월의 어느 날, 나는 전신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게 되었다. 마취에서 깨어나니 간호사가 말했다. “앞으로 여섯 시간 동안은 물을 마시면 안 돼요.” 그러려고 했다. 그렇지만 입술이 타고 목까지 탔다. 5시간 55분이 경과하자 나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몸을 삐거더억~ 삐거어덕 밀리미터 단위로 움직여서 물 한 모금을 힘겹게 마셨다. 5분 뒤 간호사가 내게 물었다. “물 안 마셨죠?” 나는 진짜 쪼금 마셨다고 자백했다. “뭐라고요? 난 몰라. 의사 선생님에게 보고해야겠어요.” 나는 간호사의 애물단지가 되었다. 그래도 그 물은 정말 맛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이보다 더 맛있어 보이는 물 이야기를 <사막의 고독>이라는 책에서 발견하고 만 것이다. 에드워드 애비는 젊은 날, 1956년과 57년, 미국 유타주 아치스 국립공원(수십만년에 걸쳐 자연적으로 바위에 뚫린 아치들이 즐비해서 생긴 이름이다)에서 ‘완벽했던 두 해’를 보낸다. 아치스 공원은 코끼리 같기도 하고 공룡 같기도 한 기기묘묘한 바위들과 사암이 침식되어 생긴 협곡들이 있고, 외로운 향나무와 절벽장미들이 있고, 보고 놀라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살아 있는 것들이 ‘생명이 없는 바위와 황량한 모래를 배경으로 대담하고, 용감하고, 생기있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곳이라고 한다. 단, 지표의 4분의 3이 모래와 사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분명히 사막이고 물이 문제인 곳이다.
애비는 그곳의 공원관리인이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인간으로부터 32㎞ 떨어져 있던 그는 혼자서 그 많은 별빛을 보고 그 많은 장밋빛 해가 뜨는 아침을 보고 그 많은 온갖 색에 물드는 바위들을 보았으니 그가 하는 말마다 나를 목마르게 한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미로와 같은 협곡 깊숙이에 작은 샘 하나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아주 작은 샘으로 물이 이끼 덩어리에서 한 번에 한 방울씩-1초에 한 방울씩-돌 위로 떨어진다. 6월의 어느 날 오후 나는 거기 한 시간 동안-두 시간 또는 세 시간이었는지도 모른다-웅크리고 앉아 물통을 채웠다. 수 킬로미터 이내에 달리 물을 채울 곳이 없었다. 물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각다귀들이 그 물을 놓고 나와 싸움을 벌였다. 그놈들이 물통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나는 손수건으로 물통 주둥이를 덮고 물을 받아야만 했다. 그러자 그놈들은 내 눈을 공격했다. 사람의 눈에 있는 물기에 이끌린 것이다. 나는 그때 그 물보다 더 맛있는 물을 마셔 본 적이 없다.”
아치스 내셔널 모뉴먼트. 출처 브랜드 유에스에이(Brand USA)
그 물맛 정말 끝내줄 것 같다. 사막이 그를 유혹한 것처럼 그의 책과 말과 삶이 나를 유혹한다. 나도 그처럼 사막에 쌍무지개가 뜨는 것을 보고 싶고 세상에서 제일 향기롭다는 향나무 향을 맡고 싶고 눈 덮인 머나먼 산을 보면서 커피를 마시고 싶고 생명체로서 대담하고 생기있게 살고 싶다. 그렇지만 이 책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개발로 사라져버렸다. 저자도 일이 그렇게 진행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 이 책은 사라져 가는 것을 사랑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애비는 관광객을 위한답시고 도로를 건설하는 데 결사반대한다. 황야(야생)를 “제발 좀 그냥 놔둬라!”가 그의 모토다. 그의 이 위풍당당하고 용기 있는 발언의 힘은 기쁨에서 나온 것이다. 아름다운 것들을 온 ‘몸’으로 흠뻑 누려보고 사랑하게 된 사람의 기쁨. <사막의 고독>에 나오는 이 기쁨과 용기,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들이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었던 많은 것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사라져 가고 있다.
<CBS>(시비에스) 피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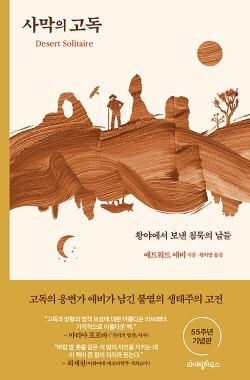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책&생각] 매일 낮 4시 시위하는 교수, 이처럼 사소하게 어마어마하게 [책&생각] 매일 낮 4시 시위하는 교수, 이처럼 사소하게 어마어마하게](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3/1229/53_17038134086514_2023122850374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