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밑에서
김석범 지음, 서은혜 옮김 l 길 l 2만3000원
제주4·3이 조금이나마 드러난 이래, 정치사회가 흔들지언정 문학에서 흔들린 적은 없다. 첫 집필에서 한국어판 완역까지 40년이 걸린 2만2000장 원고의 일본어 대하소설 <화산도>(김환기 옮김, 2015)에 감히 범접할 만큼 ‘거짓’에 혼신이 담길 순 없다. <작별하지 않는다>(한강, 2021)만큼 숭엄하게 기억하고 사랑하리라는 ‘거짓’ 또한 존재하기 어렵다.
일본 내 문학계에서 노벨문학상 후보자로도 거명됐던 재일조선인 김석범(98) 작가가 1976년 연재를 시작해 단행본으로 펴내기까지
20년가량 투신했던 작품이 <화산도>다. 자신의 원고향 제주에서 가슴이 도려진 채 대마도(쓰시마)로 밀항한 여성을 만나면서 “자신의 니힐리즘을 때려 부쉈던” “평생을 지배하는 충격”을 받는다(김석범-김환기 대담, <일본학> 56집, 2022년 4월). 4·3의 파묻힌 진실이 필생의 한이자 업이 된 순간이다. 김 작가는 이를 한국에선 자유롭게 말할 수도 쓸 수도 없는 “기억의 타살과 자살”로 불러왔다. (국내에서 ‘기억의 금기’를 깬 첫 작품이 1978년 현기영 작가의 단편 ‘순이 삼촌’이다.) 그가 제1회 ‘제주 4·3평화상’을 받은 자리에서 이승만 정권과 친일세력을 비판한 발언으로 이후 국내 입국이 금지되고 4·3평화재단이 감사를 받은 게 고작 2015년이다. 당시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대한민국 건국을 매도하고 무장 반란을 정당시하는” “북 대변자”라고 김 작가를 비난했다.
내년 백수(99)를 맞는 재일조선인 작가 김석범. ⓒ김기삼. 길 제공
2016~19년 일본 월간지 <세카이>에 연재하고 이달 국내 소개된 김 작가의 장편 <바다 밑에서>(海の底から)는 제목이 가리키는바 ‘화산도’의 수면 아래 몸통으로, 원서 7권짜리로도 부족해 눌러 보태가며 최후의 구두점을 찍은 <화산도>의 완결판이다. 이를테면 지상에서의 뒤틀린 ‘현대사’를 감당하며 지상 아래 ‘인간사’를 지탱하는 존재론적 의미에 대한 탐구, 평생 경계인을 자처한 작가 나이 아흔 넘어 되돌아간 최초의 질문.
소설은 전편의 주인공 이방근의 사망 1주기가 되는 1950년 6월의 일본에서 시작한다. 20년짜리 7권에 고작 1년여 시간을 담은 <화산도>만큼이나 <바다 밑에서>의 속도도 더디다. 달리 이유가 없다. 기억이 선연하여 고통이 촘촘하므로, 미래는 낙관도 비관도 먼 세계일 뿐인, 어제 같은 오늘의 지체 상태 때문일 터.
1997년 완간된 7권짜리 일본어판과 2015년 12권으로 완역된 한국어판 <화산도>. 사진 류우종 기자
1948년 4·3항쟁에 함께 가담했다 1949년 4월 일본 오사카로 밀항해 목숨을 부지했던 20대 청년 남승지가 탈출을 도왔던 이방근의 죽음을 뒤늦게 듣고 그의 여동생 유원과도 해후하면서 겪는 살아남은 자의 고뇌, 더불어 살아남아야 할 진실에 대한 탐문이 새 소설의 축을 이룬다.
오직 죽지 않고자 패퇴한 디아스포라가 삶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는, 4·3항쟁 중 경찰의 고문을 받고 대마도로 탈출한 두 여성을 남승지가 만나 오사카로 데려오는 말미의 여정으로 완성된다.
셋의 하룻밤 이야기는 4·3의 실체를 에두르지 않고 새삼 정면으로 다뤄 사자후하듯 끔찍하고 생생한데, 김 작가가 실제 만난 두 여성과의 이야기를 소환하므로 눈 뜨고 읽기 어렵다.
남편 앞에서 경찰에게 능욕을 당한 교사 출신 안정혜와 또다른 고문 피해 교사 강연주는 자신들의 서사에서 나아가 6·25 발발 직후까지 전해 듣고 증언해낸다.
닥치는 대로 검속된 수천명 주민 가운데 500명이 증거라도 남길세라 알몸으로 돌에 묶여 수장된 제주 사라봉 절벽 아래, 무엇을 먹었는지 유난히 그 시절 갈치가 살지더란, 극상의 맛을 낸 은비늘 갈치를 그 마을 사람들은 먹지 않게 되더란 모순의, 그럼에도 침묵하는 암흑의 심연이 바로 한반도 섬 제주의 ‘바다 밑’이다. 4·3때도 그토록 애먼 죽음을 삼켜야 했던 바다.
“…나는 소위 인간,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도 나 나름대로는 사람이에요. 나는 살기 위해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살아서 “비겁하고 부끄럽”다 자책했던 남승지에게 안정혜가 몰강스레 던진 이 말은 기어코, 오사카로 먼저 탈출해온 어머니를 만나 “아이고 살았어요, 살았어, 살아남았다고, 어머니”라는 통한의 울음으로 부서진다, 나앉는다.
작품에 넘쳐나는 “아이고” “아이구”를 작가는 가타카나로 표기했다고 번역한 서은혜 전주대 전 일문과 교수는 적었다. 고유명사나 외래어, 의미 강조 때 사용하는 문자다. 고유한 슬픔, 한국적 슬픔인 것이다.
이 소설이 <화산도>의 완결편인 이유는, 죽은 이방근의 진짜 투쟁이 수행되기 때문이겠다. 이방근이 누구인가. 유복하게 자란 일본 유학생 출신, 독립운동 사상범으로 붙잡혀 고초를 겪은 뒤 전향한 허무주의자, 혼돈의 해방 정국에 뒷짐이나 지던 방관자다. 그를 다시금 하나의 ‘인간’으로 격발시킨 사건이 4·3이다. “친일파들의 반공애국”에 맞서 친일 경찰간부 그러나 친척 형인 정세용을 처단하고, 당원명부를 경찰에 팔아넘긴 배신자 그러나 친구인 유달현을 죽게 한다.
이방근의 살인은 제 신앙인 “자유로운 인간”을 부정한 것이므로 제 남은 삶을 부정하기에 이르나 그의 ‘유지’는 다르다. 그가 자살 전 남승지를 도피시키며 한 말에 이방근이 ‘자유주의 후대’에 당부한 투쟁이 새겨져 있다.
“…여기서 개죽음을 하지 않도록 나는 너를 일본으로 보내는 거야… 이 땅에서 헛되이 죽게 하진 않을 거야. 무의미한, 무의미를 사는 것이 이방근의 사상이었건만… 그는 그곳으로부터의 탈출을 재촉했다. 반혁명 행위라고 비판당하면서도 패잔 게릴라들을 섬 밖으로 탈출시키기 위해 한대용을 선주로 하여 대가 없이 일본으로 밀항시킨다는, 그 나름의 마지막 투쟁을…. 돼지가 되어서라도 살아라….”
‘기억’이 죽을 때 비로소 죽는 것이다. 이방근을 남승지를 누가 죽이는가. 작가 김석범이 말했다. “사건을 생각하면 화가 치민다. 화가 나니까 소설을 쓰는 것이다. 쓰고 싶다는 마음이 나를 죽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나는 오래 살았다.”(2020년 2월 일본 출간 인터뷰, ‘옮긴이의 말’ 재인용)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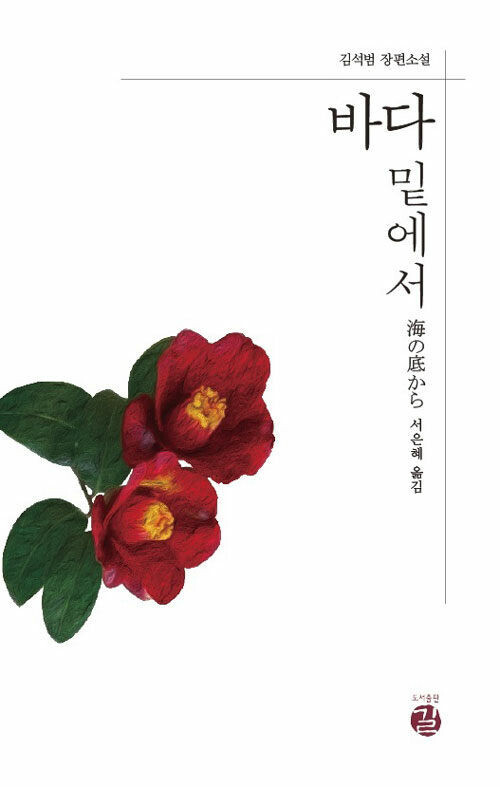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