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돌이와 함께 고향 바다에 방류된 남방큰돌고래 춘삼이가 새끼를 낳아 기르는 것으로 확인된 2016년 당시 춘삼이와 새끼의 모습. 등지느러미에 숫자 '2'라는 표식이 있는 춘삼이 바로 옆에 새끼 돌고래가 헤엄치고 있다. 연합뉴스
기러기
메리 올리버 지음, 민승남 옮김 l 마음산책(2021)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크게 인기를 끌자 이런 문자를 연거푸 받게 되었다. “정 피디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셨어요? 우영우 변호사 보면 정 피디님 생각나요.” 우 변호사가 나를 연상시킨 이유는 돌고래 때문이었다. 우영우 변호사가 늘 돌고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었다. 우 변호사는 제주 대정 앞바다에 가서 돌고래쇼를 하다가 야생방사된 남방돌고래 제돌이, 춘삼이, 삼팔이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것은 나의 말이기도 했다. 몇 년 전에 나는 열성적으로 제돌이 방사를 주장해온 <한겨레> 남종영 기자가 방사 몇년 후 제주 바다에서 제돌이를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만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제돌이에게 “안녕, 잘 지냈어?” 인사까지 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부러워서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다. 그날 이후 나는 야생방사된 돌고래를 만나서 인사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
지난해 겨울, 내가 여행 천재라고 부르는 독립피디 복진오 피디가 내 꿈을 듣더니 이렇게 말했다. “대정 앞바다에서 서너 시간만 왔다 갔다 하면 만날 수 있어요. 대정에 가면 나무 그네가 있어요. 거기서 기다려봐요.” 그 성스러운 말을 내가 잊을 리가 있겠는가? 5월의 어느 날 나는 대정 앞바다에 갔다.
제주에 가기 전부터 긴장되었다. 돌고래를 보는 것과 야생방사된 바로 그 돌고래를 보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제돌이의 등지느러미에는 1이라는 숫자가, 춘삼이의 등지느러미에는 2라는 숫자가 있다고는 하지만 내가 알아볼 수 있을까? 더구나 대정 앞바다에서 돌고래를 본다는 것은 돌고래 관광선을 타지 않고 바닷가에 앉아서 돌고래를 본다는 뜻이다. 내가 바닷가에 앉아 있는 그 시간에 제돌이나 춘삼이께서 내 눈앞을 지나가는 은총을 내려주시려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나무 그네도 보고 춘삼이도 봤다. 춘삼이는 아기와 함께 있었다. 춘삼이가 춘삼이임을 알아보는 데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 쌍안경이 필요했다. 하여간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나는 앞으로 기적은 없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을 작정이다. 대정 앞바다에서 돌고래를 만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다. 차를 세우고 바다를 뚫어지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면 얼른 그 옆에 서 있으면 된다. 돌고래가 나타나면 기쁨의 탄성이 바닷가에 울려 퍼진다.
대체 돌고래가 뭐길래 꿈까지 품었냐고 누가 내게 묻는다면 시로 대답하고 싶다. “(…)우리는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채로 기다리고, 갑자기/ 그들이 수면을 박살내면, 누군가/ 환호하기 시작하고 당신은/ 그것이 자신임을 깨닫지/ (…)난 살 만한 가치가 있는 몇 가지 삶들을 알지/ 들어봐, 당신이 어떤 삶을 살고자 하든/ 당신의 몸이/ 꿈꾸는 것만큼/ 당신을 황홀하게 해주는 건 없어,/ (…)모든 것들이, 심지어 거대한 고래조차도,/ 노래로 고동치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동안,/ 영혼은 날기를 갈망하지.”(메리 올리버 시선집 <기러기> 중에서 ‘혹등고래’)
고래가 수면을 박살 낸다는 말이 정말 좋다. 나는 돌고래가 솟구치면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우영우 변호사도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이라 짐작해본다) 그럼, 왜 특히 제돌이나 춘삼이냐고 묻는다면, 나비와 꽃처럼, 벌과 꿀처럼 세상에는 떨어져서는 안 되는 사이들이 있고, 돌고래와 바다가 다시 연결된 것이 좋아서, 우리의 끊어진 관계들, 마음들이 다시 연결되는 것을 보고 싶어서라고 대답하고 싶다.
정혜윤/<CBS>(시비에스) 피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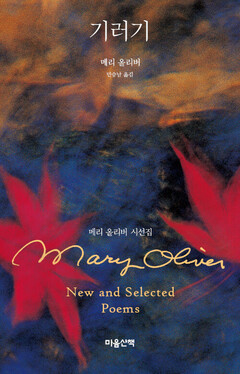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책&생각] 매일 낮 4시 시위하는 교수, 이처럼 사소하게 어마어마하게 [책&생각] 매일 낮 4시 시위하는 교수, 이처럼 사소하게 어마어마하게](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3/1229/53_17038134086514_2023122850374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