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시종가1080
14. 남의 잘못에는 추상 같지만 자기 허물에는 관대했다
 (본문)
견추호지말자(見秋毫之末者) 부자견기첩(不自見其睫)
(본문)
견추호지말자(見秋毫之末者) 부자견기첩(不自見其睫)
거천균지중자(擧千鈞之重者) 부자거기신(不自擧其身)
작은 털끝까지 본다는 이도 자기 눈썹은 보지 못하며
천근의 무게를 든다는 이도 자기 몸은 들지 못하는구나 하지만 이것으로 의사 전달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는지 “이는 마치 수행자가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것은 분명히 하면서도(猶學者明於責人) 자기를 용서하는 관대함과 조금도 차이를 두지 않았다(昧於恕己者 不少異也)”라는 부연설명까지 덧붙였다. 이 선시는 불안청원(佛眼淸遠·1067~1120)이 고암(高庵)에게 일러준 것으로 ‘동어서화’(東語西話)에 실려 있다. ‘동어서화’는 천목중봉(天目中峰·1243~1323) 선사의 <광록>(廣錄) 30권 가운데 18·19·20권에 해당된다. <천목중봉화상광록>은 중봉선사 열반 후 제자인 북정자적(北庭慈寂)의 노력에 의하여 1334년 입장(入藏·대장경에 편입됨)될 만큼 원나라 시대의 참선공부인을 위한 중요 지침서로 대접받았다. 천목중봉은 절강(浙江)성 항주(杭州) 전당(錢塘) 출신이다. 천목산(天目山)에서 수행하던 고봉원묘(高峰原妙)의 법을 이었으며 이후 일정한 거처를 정하지 않고 수행 삼아 산천과 마을을 찾아 행각했다. 경론과 선어록에도 해박했고 제자백가는 물론 시(詩)와 부(賦)에도 뛰어났다. 이 모든 것을 선(禪)으로 귀결시키는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인지라 당시 사람들에게 ‘강남고불’(江南古佛)이라는 칭송을 받았다.

 (해설)
이 선시는 청원 스님이 고암 스님을 만나면서 남긴 인물 관전평이다. 서양 종교의 말을 빌자면 ‘제 눈의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 티끌을 탓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남의 잘못에는 추상 같았으나 자기 허물에는 참으로 너그러운 모습을 보다 못해 (한두번이 아니었을 것이다) 우아한 시문 형식을 빌어 에둘러 한마디 보탠 것이다. 직설적인 표현은 결국 말싸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너무 간접적인 비유를 동원한 탓에 혹여 제대로 알아듣지 못 할까 봐 사족 같은 해설까지 붙여 당사자는 물론 주변 사람의 이해를 도왔다. 또 다른 자비심이다. 하긴 이런 경우가 어디 이 두 사람에게만 국한된 일이겠는가? 그리고 또 어찌 그 시절뿐이었겠는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로남불’이란 사자성어를 만들 만큼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광경이기도 하다.
유식학(唯識學)은 ‘내로남불’을 이기심의 극치라고 단정한다. 그런데 이런 이기심을 일으키는 마음바탕인 ‘제7식’(第七識·숫자로 표시하는 것 역시 가치 중립적이다)을 어감이 별로 좋지 않은 ‘이기식’(利己識)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고 음역(音譯)한 인도식 언어인 ‘말나식’(末那識)을 그대로 사용한 것도 어찌 보면 또 다른 ‘중국식’ 자비심이라 하겠다.
어쨌거나 이것은 자기를 늘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영역을 가르킨다. 자기 사랑이야 당연한 것이지만 방향이 잘못되거나 양이 과도하면 상대에 대한 적대감 혹은 지나친 차별심으로 인하여 스스로를 어리석게 만들고(我癡) 일방적 자기 주장만 앞세우게 되며(我見) 알 수 없는 자신감 혹은 근거 없는 자신감(我慢)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과도한 자기집착(我愛)을 만드는 4가지 번뇌와 연결된다. 이것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까지 뇌고(腦苦)롭게 만든다. 어쨌거나 번뇌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는 뜻이다.
(해설)
이 선시는 청원 스님이 고암 스님을 만나면서 남긴 인물 관전평이다. 서양 종교의 말을 빌자면 ‘제 눈의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 티끌을 탓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남의 잘못에는 추상 같았으나 자기 허물에는 참으로 너그러운 모습을 보다 못해 (한두번이 아니었을 것이다) 우아한 시문 형식을 빌어 에둘러 한마디 보탠 것이다. 직설적인 표현은 결국 말싸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너무 간접적인 비유를 동원한 탓에 혹여 제대로 알아듣지 못 할까 봐 사족 같은 해설까지 붙여 당사자는 물론 주변 사람의 이해를 도왔다. 또 다른 자비심이다. 하긴 이런 경우가 어디 이 두 사람에게만 국한된 일이겠는가? 그리고 또 어찌 그 시절뿐이었겠는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로남불’이란 사자성어를 만들 만큼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광경이기도 하다.
유식학(唯識學)은 ‘내로남불’을 이기심의 극치라고 단정한다. 그런데 이런 이기심을 일으키는 마음바탕인 ‘제7식’(第七識·숫자로 표시하는 것 역시 가치 중립적이다)을 어감이 별로 좋지 않은 ‘이기식’(利己識)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고 음역(音譯)한 인도식 언어인 ‘말나식’(末那識)을 그대로 사용한 것도 어찌 보면 또 다른 ‘중국식’ 자비심이라 하겠다.
어쨌거나 이것은 자기를 늘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영역을 가르킨다. 자기 사랑이야 당연한 것이지만 방향이 잘못되거나 양이 과도하면 상대에 대한 적대감 혹은 지나친 차별심으로 인하여 스스로를 어리석게 만들고(我癡) 일방적 자기 주장만 앞세우게 되며(我見) 알 수 없는 자신감 혹은 근거 없는 자신감(我慢)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과도한 자기집착(我愛)을 만드는 4가지 번뇌와 연결된다. 이것으로 인하여 주변 사람까지 뇌고(腦苦)롭게 만든다. 어쨌거나 번뇌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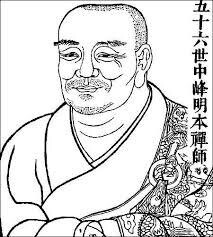 이 ‘내로남불’의 사례가 주는 대중적 교훈성을 일찍이 간파한 중봉 선사는 후인들이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의미에서 기록으로 남겨두었다. 중봉 선사의 별명은 ‘강남고불’이다. 활동 지역이 양자강 하류 남쪽 지방인 항주(杭州)·소주(蘇州)로 대표되는 절강성(浙江省)이기 때문이다. 고봉원묘 선사를 만난 천목산(天目山) 역시 절강성에 위치하고 있다.
‘고불’은 조주 선사가 원조이다. 조주(778~897) 선사는 말로 하기 어려운 선(禪)을 언어로 잘 표현하여 후학들에게 전달했다. 그 세월이 40년이다. 게다가 120살까지 장수했다. 그래서 조주고불(趙州古佛)이라고 불렀다. 활동 무대였던 조주의 동관음원(東觀音院) 위치는 하북성(河北省) 서쪽이다. 중원에서 본다면 북쪽 지방인데 현재 만리장성과 북경이 위치한 지역이다. 지리적으로 ‘강북고불’인 셈이다.
조주 선사는 언어로 자상하게 선을 잘 설명했고, 중봉 선사는 종횡무진의 글 솜씨로 <동어서화> <산방야화>(山房夜話) 등의 저술 속에서 수많은 사례를 통해 참선공부인을 독려하고 또 경책하고 있다. 이런 연유로 ‘고불’은 두 선사의 자비심을 칭송하는 뜻에서 후인들이 붙여준 애칭인 셈이다.
원철 스님/불교사회연구소장
***이 시리즈는 대우재단 대우꿈동산이 함께합니다.
이 ‘내로남불’의 사례가 주는 대중적 교훈성을 일찍이 간파한 중봉 선사는 후인들이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의미에서 기록으로 남겨두었다. 중봉 선사의 별명은 ‘강남고불’이다. 활동 지역이 양자강 하류 남쪽 지방인 항주(杭州)·소주(蘇州)로 대표되는 절강성(浙江省)이기 때문이다. 고봉원묘 선사를 만난 천목산(天目山) 역시 절강성에 위치하고 있다.
‘고불’은 조주 선사가 원조이다. 조주(778~897) 선사는 말로 하기 어려운 선(禪)을 언어로 잘 표현하여 후학들에게 전달했다. 그 세월이 40년이다. 게다가 120살까지 장수했다. 그래서 조주고불(趙州古佛)이라고 불렀다. 활동 무대였던 조주의 동관음원(東觀音院) 위치는 하북성(河北省) 서쪽이다. 중원에서 본다면 북쪽 지방인데 현재 만리장성과 북경이 위치한 지역이다. 지리적으로 ‘강북고불’인 셈이다.
조주 선사는 언어로 자상하게 선을 잘 설명했고, 중봉 선사는 종횡무진의 글 솜씨로 <동어서화> <산방야화>(山房夜話) 등의 저술 속에서 수많은 사례를 통해 참선공부인을 독려하고 또 경책하고 있다. 이런 연유로 ‘고불’은 두 선사의 자비심을 칭송하는 뜻에서 후인들이 붙여준 애칭인 셈이다.
원철 스님/불교사회연구소장
***이 시리즈는 대우재단 대우꿈동산이 함께합니다.

사진 픽사베이
거천균지중자(擧千鈞之重者) 부자거기신(不自擧其身)
작은 털끝까지 본다는 이도 자기 눈썹은 보지 못하며
천근의 무게를 든다는 이도 자기 몸은 들지 못하는구나 하지만 이것으로 의사 전달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는지 “이는 마치 수행자가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것은 분명히 하면서도(猶學者明於責人) 자기를 용서하는 관대함과 조금도 차이를 두지 않았다(昧於恕己者 不少異也)”라는 부연설명까지 덧붙였다. 이 선시는 불안청원(佛眼淸遠·1067~1120)이 고암(高庵)에게 일러준 것으로 ‘동어서화’(東語西話)에 실려 있다. ‘동어서화’는 천목중봉(天目中峰·1243~1323) 선사의 <광록>(廣錄) 30권 가운데 18·19·20권에 해당된다. <천목중봉화상광록>은 중봉선사 열반 후 제자인 북정자적(北庭慈寂)의 노력에 의하여 1334년 입장(入藏·대장경에 편입됨)될 만큼 원나라 시대의 참선공부인을 위한 중요 지침서로 대접받았다. 천목중봉은 절강(浙江)성 항주(杭州) 전당(錢塘) 출신이다. 천목산(天目山)에서 수행하던 고봉원묘(高峰原妙)의 법을 이었으며 이후 일정한 거처를 정하지 않고 수행 삼아 산천과 마을을 찾아 행각했다. 경론과 선어록에도 해박했고 제자백가는 물론 시(詩)와 부(賦)에도 뛰어났다. 이 모든 것을 선(禪)으로 귀결시키는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인지라 당시 사람들에게 ‘강남고불’(江南古佛)이라는 칭송을 받았다.

중국 절강성 천목산. 조현 종교전문기자

중국 절강성 천목산 개산노전 선원에 모셔진 고봉 선사(가운데), 천목중봉 선사(왼쪽), 단애요의 선사(오른쪽). 조현 종교전문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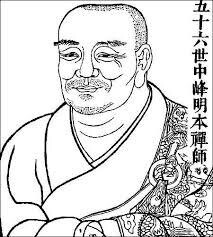
천목중봉 선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