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강순명 목사 “남을 성자로 보는이가 성자” 노인·나환자들 돌보기 헌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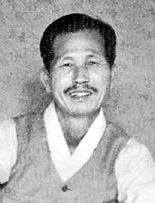 한국전쟁의 와중 전라도 광주에서 강순명(1898~1959·왼쪽 사진) 목사가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의 구걸을 지켜보고 있었다. 골목 첫 집에선 할머니가 부르는 소리에 나왔던 사내가 걸인이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문을 쾅 닫고 돌아서 버렸다. 두번째 집도, 세번째 집도 마찬가지였다. 다리를 힘들게 끌며 골목을 다 다녀도 보리쌀 한줌도 얻지 못한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는 것을 본 강 목사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자기 집에 데려갔다. 하루하루 죽으로 연명하며, 방 두 칸에 대식구가 겨우 살아가는 비좁은 집에 식구 하나가 늘었다. 광주천 다리 밑을 지나다가도 거적때기를 둘러쓰고 죽어가던 할머니를 두고 돌아설 수 없던 강 목사는 또다른 할머니를 업고 와 집 안방에 누였다. 그렇게 집에 데려온 사람이 무려 30여명. 강 목사가 전쟁 중 데려온 걸인 할머니 때문에 강 목사 가족들은 방안에 들어가 앉을 수도 없어 한뎃잠을 자야 할 지경이었다. 그것이 천혜경로원의 시작이었다. 1952년 7월이었다.
일제 학살때 “하나님 죄 씻을 시간 주소서”해방·한국전쟁 곤궁 속 빈민에 사랑 실천
광주시 동구 학동 천혜경로원에 들어가 70여명의 할머니들을 보니 자식도 없고 가진 재산도 없어 양로원에 들어와 살아가는 노인들은 불쌍하다는 편견이 여지없이 무너진다. 정갈한 외모에 밝은 미소들이 경로원 전체를 빛으로 감싸는 듯하다. ‘오늘이 바로 할머니의 마지막날이라고 여기고 여한이 남지 않게 모시려 한다’는 강은수(65) 원장은 강 목사의 아들이다.
강순명은 원래 모태신앙이었으나 아홉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열세살 때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 청년기를 방황으로 보냈다. 그러면서 광주의 뒷골목에서 이름을 떨치던 ‘박치기 명수’였다. 형 태성의 눈물 어린 호소로 순명은 마침내 교회를 나가고, 이발 기술을 배워 이발소를 차려 새 출발을 했다. ‘돌아온 탕아’였다. 그는 그해 수피아여고를 나온 재원 최숙이와 결혼했다. ‘광주의 대부’ 오방 최흥종 목사의 장녀였다. 대인은 대인의 싹을 알아본 것일까. 당시 일본 유학을 다녀온 의사의 청혼을 거절하고, 부모도 없이 뒷골목이나 누비던 이발사를 사위로 맞으려 하자 집안 식구들은 모두 기가 막혀 했지만 최흥종 목사는 보물을 얻은 듯 만족해했다.
순명은 이듬해 만학도가 되어 일본에 유학해 중학교에 입학했다. 살림은 아내가 일본 유학생들의 밥을 해주어 근근이 이어갔다. 일본에서 2년째. 도쿄대지진이 일어났다. 이틀 만에 도쿄 인구 300만명 가운데 16만여명이 죽고, 10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민심이 극도로 흉흉해지자 일제는 분노의 화살을 ‘조선인’에게로 돌렸다. ‘조센징들이 혼란한 틈에 도둑질을 하고, 우물에 독약을 풀었다’는 유언비어가 나돌면서 일인들은 미친개처럼 조선인을 찾아 닥치는 대로 칼로 베고 찔러 죽였다. 도쿄에서 그렇게 학살당한 조선인이 무려 5천명이 넘었다. 우에노공원으로 피신한 순명은 눈물을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지은 죄를 조금도 씻지 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청산하도록 사흘만 시간을 주십시오!”
눈물의 기도였다. 폭포수 같은 눈물이 그치자 말할 수 없는 평화가 밀려왔다. 그는 그 때 여생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다.
회심 1년 뒤 귀국한 순명은 기독교청년회(YMCA)에서 농촌운동을 시작했다. 그는 전주 서문교회 배은희 목사와 함께 독신전도단을 만들어 일제의 수탈로 피폐해진 농촌으로 파고들었다. 독신전도단은 청년들이 3년간 시간을 내 홀로 농촌에 들어가 헌신하며 주간엔 일하고, 저녁이면 부녀자와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고, 주일이면 교회에 봉사하는 삶으로 농촌에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나섰다. 독신전도단은 농촌 협동조합과 소비조합을 조직해 농촌경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는가 하면, 늘 기초 상비약을 준비해 환자들을 치료하기도 했다. 그때 독신전도단으로 그를 따라나섰던 이들이 ‘맨발의 성자’ 이현필과 ‘해남의 등대’ 이준묵 목사 등이다. 순명은 그때부터 병에 걸려 가족으로부터 버림 받은 폐병환자와 나환자를 업어다가 돌보았다. 그는 언제나 말보다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했다. 첫부인이 결혼 17년 만에 6남매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뒤, 평양여자신학생 장신애는 처녀의 몸으로 고아원에 들어간 셈 치고 순명의 삶에 동참했다. 바로 강은수 원장의 어머니다.
강순명 목사는 해방 뒤 서울에서 연경원을 만들어 기독교 청년들을 훈련시켰다. 직접 골목길을 누비며 남의 아궁이를 고쳐주고 쌀을 얻어와 청년들을 먹여살렸다. 그러나 그가 거둬주었던 한 집사가 소유권 등기를 해놓지 않은 것을 알고 연경원을 자신의 소유로 해버렸다. 주위에선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며 이를 갈았으나, 그는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한다”며 두말없이 한강 다리 밑으로 떠났다. 그는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누구에게서나 그만의 장점을 발견해내 칭송하곤 했다. 그리고 “남을 성자로 보는 자가 바로 성자이며, 남을 마귀로 보는 자가 바로 마귀”라고 했다. 광주/글·사진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한겨레신문 2007년 2월 21일자)
[이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울림 - 우리가 몰랐던 이땅의 예수들>(한겨레출판 펴냄)에 있습니다.]
한국전쟁의 와중 전라도 광주에서 강순명(1898~1959·왼쪽 사진) 목사가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의 구걸을 지켜보고 있었다. 골목 첫 집에선 할머니가 부르는 소리에 나왔던 사내가 걸인이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문을 쾅 닫고 돌아서 버렸다. 두번째 집도, 세번째 집도 마찬가지였다. 다리를 힘들게 끌며 골목을 다 다녀도 보리쌀 한줌도 얻지 못한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는 것을 본 강 목사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자기 집에 데려갔다. 하루하루 죽으로 연명하며, 방 두 칸에 대식구가 겨우 살아가는 비좁은 집에 식구 하나가 늘었다. 광주천 다리 밑을 지나다가도 거적때기를 둘러쓰고 죽어가던 할머니를 두고 돌아설 수 없던 강 목사는 또다른 할머니를 업고 와 집 안방에 누였다. 그렇게 집에 데려온 사람이 무려 30여명. 강 목사가 전쟁 중 데려온 걸인 할머니 때문에 강 목사 가족들은 방안에 들어가 앉을 수도 없어 한뎃잠을 자야 할 지경이었다. 그것이 천혜경로원의 시작이었다. 1952년 7월이었다.
일제 학살때 “하나님 죄 씻을 시간 주소서”해방·한국전쟁 곤궁 속 빈민에 사랑 실천
광주시 동구 학동 천혜경로원에 들어가 70여명의 할머니들을 보니 자식도 없고 가진 재산도 없어 양로원에 들어와 살아가는 노인들은 불쌍하다는 편견이 여지없이 무너진다. 정갈한 외모에 밝은 미소들이 경로원 전체를 빛으로 감싸는 듯하다. ‘오늘이 바로 할머니의 마지막날이라고 여기고 여한이 남지 않게 모시려 한다’는 강은수(65) 원장은 강 목사의 아들이다.
강순명은 원래 모태신앙이었으나 아홉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열세살 때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 청년기를 방황으로 보냈다. 그러면서 광주의 뒷골목에서 이름을 떨치던 ‘박치기 명수’였다. 형 태성의 눈물 어린 호소로 순명은 마침내 교회를 나가고, 이발 기술을 배워 이발소를 차려 새 출발을 했다. ‘돌아온 탕아’였다. 그는 그해 수피아여고를 나온 재원 최숙이와 결혼했다. ‘광주의 대부’ 오방 최흥종 목사의 장녀였다. 대인은 대인의 싹을 알아본 것일까. 당시 일본 유학을 다녀온 의사의 청혼을 거절하고, 부모도 없이 뒷골목이나 누비던 이발사를 사위로 맞으려 하자 집안 식구들은 모두 기가 막혀 했지만 최흥종 목사는 보물을 얻은 듯 만족해했다.
순명은 이듬해 만학도가 되어 일본에 유학해 중학교에 입학했다. 살림은 아내가 일본 유학생들의 밥을 해주어 근근이 이어갔다. 일본에서 2년째. 도쿄대지진이 일어났다. 이틀 만에 도쿄 인구 300만명 가운데 16만여명이 죽고, 10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민심이 극도로 흉흉해지자 일제는 분노의 화살을 ‘조선인’에게로 돌렸다. ‘조센징들이 혼란한 틈에 도둑질을 하고, 우물에 독약을 풀었다’는 유언비어가 나돌면서 일인들은 미친개처럼 조선인을 찾아 닥치는 대로 칼로 베고 찔러 죽였다. 도쿄에서 그렇게 학살당한 조선인이 무려 5천명이 넘었다. 우에노공원으로 피신한 순명은 눈물을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지은 죄를 조금도 씻지 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청산하도록 사흘만 시간을 주십시오!”
눈물의 기도였다. 폭포수 같은 눈물이 그치자 말할 수 없는 평화가 밀려왔다. 그는 그 때 여생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다.
회심 1년 뒤 귀국한 순명은 기독교청년회(YMCA)에서 농촌운동을 시작했다. 그는 전주 서문교회 배은희 목사와 함께 독신전도단을 만들어 일제의 수탈로 피폐해진 농촌으로 파고들었다. 독신전도단은 청년들이 3년간 시간을 내 홀로 농촌에 들어가 헌신하며 주간엔 일하고, 저녁이면 부녀자와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고, 주일이면 교회에 봉사하는 삶으로 농촌에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나섰다. 독신전도단은 농촌 협동조합과 소비조합을 조직해 농촌경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는가 하면, 늘 기초 상비약을 준비해 환자들을 치료하기도 했다. 그때 독신전도단으로 그를 따라나섰던 이들이 ‘맨발의 성자’ 이현필과 ‘해남의 등대’ 이준묵 목사 등이다. 순명은 그때부터 병에 걸려 가족으로부터 버림 받은 폐병환자와 나환자를 업어다가 돌보았다. 그는 언제나 말보다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했다. 첫부인이 결혼 17년 만에 6남매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뒤, 평양여자신학생 장신애는 처녀의 몸으로 고아원에 들어간 셈 치고 순명의 삶에 동참했다. 바로 강은수 원장의 어머니다.
강순명 목사는 해방 뒤 서울에서 연경원을 만들어 기독교 청년들을 훈련시켰다. 직접 골목길을 누비며 남의 아궁이를 고쳐주고 쌀을 얻어와 청년들을 먹여살렸다. 그러나 그가 거둬주었던 한 집사가 소유권 등기를 해놓지 않은 것을 알고 연경원을 자신의 소유로 해버렸다. 주위에선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며 이를 갈았으나, 그는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한다”며 두말없이 한강 다리 밑으로 떠났다. 그는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누구에게서나 그만의 장점을 발견해내 칭송하곤 했다. 그리고 “남을 성자로 보는 자가 바로 성자이며, 남을 마귀로 보는 자가 바로 마귀”라고 했다. 광주/글·사진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한겨레신문 2007년 2월 21일자)
[이 기사의 자세한 내용은 <울림 - 우리가 몰랐던 이땅의 예수들>(한겨레출판 펴냄)에 있습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