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14일 남원 실상사에서 만난 도법(왼쪽) 스님과 신상환(오른쪽) 박사가 함께 낸 책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지리산 실상사 회주 도법(73) 스님과 불교학자 신상환(54) 박사가 불교 전반에 대해 펼친 불꽃 튀는 논전이 책으로 나왔다. <스님, 제 생각은 다릅니다>(도서출판 b)이다.
도법 스님은 18살에 출가해 법랍 55년으로 이제 노승에 접어들었다. 1994년 조계종 개혁 등 불교계의 변화를 주도하고, 실상사를 불교계의 대표적인 공동체로 만든, 조계종의 대표적인 실천가다. 그런데 책의 부제를 보면 ‘도법 묻고 담정 답하다’이다. 담정은 스님보다 19살 아래인 신 박사의 호다. 지난 14일 전북 남원 실상사에서 상식을 깬 논전의 두 주인공을 함께 만났다.
법랍 55년 도법 ‘모르는 건 배운다’
신 박사 ‘중관학당 공부모임’ 참가
‘대승불교 아버지’ 용수 사상 문답
‘스님, 제 생각은 다릅니다’ 펴내
“스님은 모든 것 중도에 갖다 붙인다”
“중관사상 10년 탐구했으면 해법내라”
‘스님, 제 생각은 다릅니다’ 표지. 도서출판 b 제공
신 박사는 1980년대 운동권 출신이다. 2년 옥살이 끝에 중앙아시아 파미르고원과 히말라야를 순례하다가 ‘대승불교의 아버지’라는 용수의 중관(中觀)사상에 꽂혔다. 인도 캘커타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시성 타고르가 설립한 비스바바라티대학에서 티베트 승려들에게 중관사상을 가르치다가 10여년 전 귀국했다. 경남 함양 고반재에서 고려대장경연구소장 종림 스님과 함께 지내다가, 3년 전 전남 곡성에 자리잡고 농사를 지으며 티베트어와 산스크리트어 경전을 번역하고 중관학당을 열어 가르치고 있다.
도법 스님이 신 박사의 중관학당 공부모임에 참여하면서 둘은 처음 인연을 맺었다. 승속을 불문하고 ‘모르는 건 배운다’는 스님의 열린 자세부터 파격적이다. 19살 연상의 스님에 맞서 조금의 타협도 없이 공(空)사상으로 상대의 논리를 철저히 논파하는 신 박사도 놀랍긴 마찬가지다. 책의 서문에, 독자들이 다 읽고 난 뒤 ‘신상환 판정승’이라고 결론내주길 바란다고 쓴 그는 애초부터 결코 나이 대접, 스님 대접을 해줄 생각이 없었다.
이날 만남에서도 신 박사는 “스님은 모든 것을 중도(中道)에 갖다 붙인다”고 포문을 열었다. 중도란 붓다가 깨달은 핵심 사상이다. 통상 ‘있다거나 없다거나, 고통스럽다거나 행복하다거나 같은 한쪽에 치우친 생각에서 벗어나 올바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일컫는다. 도법 스님은 “붓다는 고행과 선정이라는 양극단을 좇는 수행으로 깨닫지 못하다가 자신의 방식으로 중도의 길을 찾아 바로 깨달았다”며 “중도가 깨달음으로 가는 실천이라면, 붓다가 깨달은 ‘연기’(緣起·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인과법칙)는 존재의 진리다”라고 했다. 연기·중도 사상으로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운동을 펴온 도법 스님은 얼마 전 <붓다, 중도로 살다>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실천가답게 그는 중도를 우리말로 쉽게 풀어 “현장에, 있는 그대로의 길”이라고 했다. 실제 지리산 일대에 갈등 분쟁이 생겼을 때 도법 스님은 ‘중도’적으로 극단의 대립을 넘어 양쪽이 수긍하는 방향의 대화를 여러 차례 이끌었다. 그래서 도법 스님은 ‘중도’라는 말을 ‘약방의 감초’처럼 쓴다. 그런데 신 박사가 도법 스님의 주무기를 패대기치고 나선 것이다.
도법 스님도 가만히 당하고 있을 리 만무하다. 그는 신 박사에게 “대승불교 8대 종파에서 모두 조사로 떠받들고 ‘제2의 붓다’라고까지 불리는 용수의 중관사상을 10년이나 공부하고 또 가르치기까지 한다면 이 문제 많은 한국불교와 사회현실에 대해서도 해결점을 내놓아야 할 것 아니냐”고 되받아쳤다. “붓다의 깨달음이란 바로 현장에서 이해되고 실현·증명된다고 했는데, 온갖 불교학과 수행도 그런 식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말만 무성하기에 불교가 혼란스러운 것 아니냐”는 것이다. 붓다가 중생의 고통을 해소해줬듯이 ‘중관학’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면 현실 문제에 대해 대안과 답을 내놓으라는 뜻이다.
이에 대해 신 박사는 “중관이란 남의 주장을 논파하는 것이지, 자기 주장이 없다”고 했다. 중관이라는 게, 붓다 사후 부파불교 시대에 각종 종파가 난립해 지나친 분석 위주의 교학으로 머리만 아파지자 용수가 공사상을 통해 ‘도장깨기’식으로 각 종파들의 논리를 논파하는 데서 나왔다는 것이다. 신 박사는 이미 종림 스님과 지낼 때도 ‘비겁한 놈’이라는 욕까지 먹은 터여서 ‘반대만 있고 대안이 없다’는 공격에 익숙한 듯하다. 그는 자신의 주장은 없이 상대의 주장을 공격하는, 익숙한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 그는 “자기 문제를 고치는 것이 곧 중도이지, 스님처럼 중도를 추구하는 것은 또 다른 극단을 세우는 것일 뿐”이라고 반격했다. 진리는 보편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 걸핏하면 중도를 끌어들이다 보면 구체적인 진리를 놓친다는 것이다. 그는 “스님은 실천적 행보로서 중도를 ‘중재의 노력’으로 해석하고 그것만 실천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공박했다.
이에 도법 스님은 “중도를 중재의 논리로 보고 해석하지 않는다”며 “다만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인다’고 하다 보니 중재 운운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중관학파는 논파해야만 양극단을 벗어난다고 하지만, 나처럼 중도적인 방식으로 하면 양극단은 저절로 떨어져나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논리적으로만 따지고 들면 너무 복잡해진다”고 응수했다.
끝내 평행선을 달리던 둘 사이에 회통하는 지점도 없지 않았다. ‘자기를 바로 봐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신 박사는 “‘잘 살아보세’란 구호대로 살만큼 사는 시대가 됐음에도 불만족은 커져가고 있다”며 “이것이 과연 외적인 궁핍 때문이기만 한 것인지 자기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시대”라고 했다. 도법 스님도 “컴퓨터다 인공지능이다 전지전능한 것처럼 모르는 것이 없어 보이는데, 정작 자신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자기를 잘 알고, 자신을 잘 다루는 실력을 길러내느냐의 여부가 우리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남원/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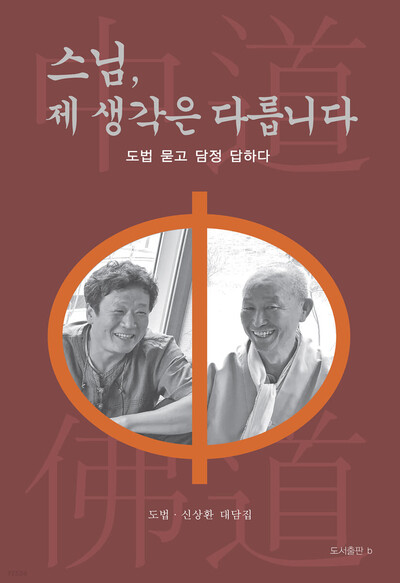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