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호텔 중식당 도림의 여경옥 셰프가 중국냉면을 만들고 있다. 사진 임경빈(어나더원비주얼 실장)
‘중국냉면’은 꽤 신기한 음식이다.
이맘때면 젓가락질과 ‘면스플레인’으로 입이 바빠지는 ‘평양냉면파’와 ‘함흥냉면파’, 그리고 맵고 짜고 시고 단 ‘분식집 냉면파’까지 파벌이 나뉘어 대결하는 ‘냉면 강호’에서 중국냉면은 오랫동안 살아남았다. 한때 ‘한국 음식이다, 중국 음식이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던 시절도 있었으나 이젠 어엿한 ‘냉면’의 한 장르로 인정받았다. 고급 호텔의 중식당에서도, 동네 허름한 중국집에서도, 배달 음식으로도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입지가 공고해진 중국냉면은 유명세만큼이나 애호가도 많다.
인기가 높은 음식이지만 그 정체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언제, 누가, 어떻게 중국냉면을 만들었는지 중식 요리사조차 알지 못한다. 이렇다 보니 공식화된 레시피도 없다. 주방장의 손끝과 업장의 성격에 따라 음식이 천차만별이다. 심지어 중식 원조인 중국에도 없는 요리다. 중국에선 량몐(凉麪)이라는 국물 없는 비빔면을 차게 먹긴 하지만, 각종 해물 고명과 땅콩소스가 곁들여진 현재의 중국냉면은 중국에서 원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은 언제부터 중국냉면을 먹기 시작했을까. 신문에 ‘중국냉면’이 최초로 발견되는 것은 1962년 9월 25일 〈동아일보〉에 실린 〈부부〉라는 소설에서다. ‘평양냉면’이 일제 강점기 때부터 적극적으로 등장하는 것과 비교하면 약간은 늦은 시기다. 소설엔 “우리는 어느 중국집 이층의 조용한 방에 올라가서 여사가 좋아한다는 탕수육에 맥주를 한병씩 마시고, 중국냉면으로 저녁을 먹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평양냉면 만큼은 아니지만, 꽤 오래전부터 중식당에 중국냉면이란 메뉴가 있었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지금의 중국냉면과 같은 형태인지는 알 수 없다.
롯데호텔 중식당 도림의 여경옥 셰프. 사진 임경빈(어나더원비주얼 실장)
중식 대가인 여경옥 롯데호텔 중식당 도림 셰프는 “중국냉면을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정확한 자료는 없다. 1980년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특수로 호텔을 중심으로 고급 중식당이 발전하면서 대중에게 널리 퍼지긴 했지만, 정확히 그때 만들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실제 1980년대가 되면 신문에 중국냉면이 자주 등장한다.
당시 고급 중국요리를 만들 요리사가 부족했던 호텔들이 중국, 대만, 홍콩, 일본 등에서 중식 요리사들을 데려왔는데, 이들에 의해 탄생했다는 ‘설’도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히야시츄카라는 중화풍 냉면은 땅콩소스를 쓰는 등 현재 한국서 먹는 중국냉면과 비슷한 구석이 있다.
종합하면, 중국냉면은 특정인이 특정시점에 개발한 음식이라기보다 시간을 두고 변형·발전된 음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 셰프는 “비빔냉면이나 콩국수 같은 냉면류는 일찍부터 중식당에서 판매했다. 이러한 냉면들이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하면서 점점 변형돼 지금의 중국냉면이 됐다고 보는 게 맞다”며 “맛은 시대에 따라 변화하게 마련이고 소비자의 요구에 따르는 것이 요리사의 의무자 숙명이다. 차가운 육수에 만 면을 좋아하는 대중의 기호에 맞춰 자연스럽게 발전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냉면을 즐기는 데, 굳이 국적을 따질 필욘 없다. “짜장면, 짬뽕도 중국에 없는 요리다”며 크게 웃은 여 셰프는 “중식은 어느 나라에 가든 그 나라의 식문화를 반영한다. 아메리칸 차이니즈(미국식 중국요리)처럼 그 지역에서 오랜 기간 사랑받았다면 그 나라 음식이다”고 말했다. 중국에도 없는 중국냉면은 한국에서 태어나 발전 중인 한국 냉면이라고 봐야한다는 얘기다.
네 요리, 내 요리 따지다가 육수 식고 면 붇는다. 면스플레인은 이제 끝내고, 즐기자. 소설 〈부부〉에 나온 것처럼, 이번 주말에 좋은 사람과 만나 탕수육에 맥주 한잔 한 뒤, 중국냉면으로 마무리해보는 건 어떨까.
백문영 객원기자, 이정국 기자
moonyoungbaik@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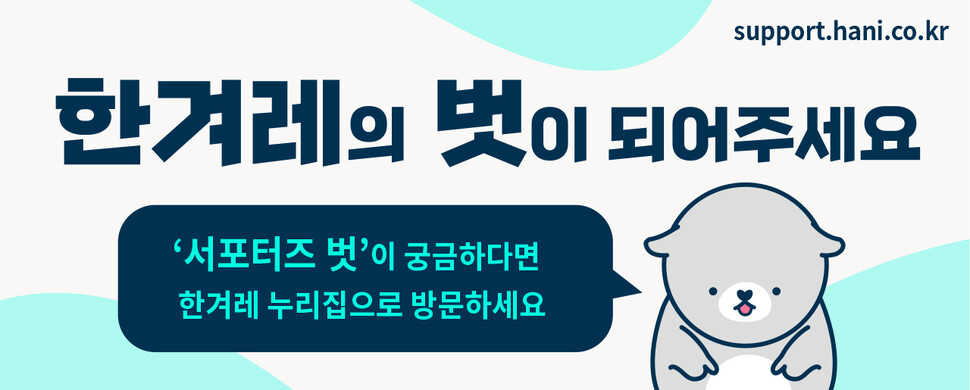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스치던 얼굴을 빤히…나를 빛내는 ‘영혼의 색’ 찾기 [ESC] 스치던 얼굴을 빤히…나를 빛내는 ‘영혼의 색’ 찾기 [ESC]](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3/1229/53_17038084296564_20231227503552.jpg)



![히말라야 트레킹, 일주일 휴가로 가능…코스 딱 알려드림 [ESC] 히말라야 트레킹, 일주일 휴가로 가능…코스 딱 알려드림 [ESC]](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4/0427/53_17141809656088_20240424503672.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