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피티 작가 제이플로우. 사진 <럭셔리> 제공
“요즘 제일 핫한 게 뭐야?”라는 질문에 답을 해줄 행사가 열린다. 7일부터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0 크리에이터스 그라운드’는 ‘엠제트(MZ)세대'(밀레니얼 세대+제트 세대·1980년대 초반부터 2004년 출생한 세대)의 패션 놀이터를 지향한다. 요즘 가장 ‘힙’한 패션 브랜드의 창작자를 직접 만나고, 최신 패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주최 측이 내건 캐치프레이즈도 ‘오늘의 브랜드, 오늘의 디자이너, 오늘의 창작자’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크리에이터스 그라운드’는 패션 산업을 이끌어갈 창작자들과 작품을 조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앞으로 매해 진행될 이 행사의 첫 키워드는 스트리트 패션이다. 자유로운 감성과 과감한 실험 정신을 내세우는 스트리트 패션은 힙합, 스케이트보드 등 소위 길거리 문화를 대변한다. 한때는 비주류였으나 최근 몇 년 사이 남다른 개성을 중시하는 엠제트 세대의 폭발적인 지지를 얻으며 주류로 떠올랐다.
제이플로우와 그라피티 작가들이 협업한 작품. 강현욱(스튜디오 어댑터)
이번 전시에서는 패션뿐만 아니라 최신 힙합 음악, 스트리트 문화를 대변하는 그라피티 아트 퍼포먼스까지 엠제트 세대가 열광하는 다양한 문화 코드를 ‘깨알같이’ 접할 수 있다. 디제잉 공연, 국내 최초 스니커즈 거래 플랫폼 ‘프로그’에서 진행하는 한정판 스니커즈 경매 등이 열리는가 하면, 이제는 패션 아이템이 된 타투 그래픽 아트를 굿즈와 미디어로 만날 수 있다. 인기 일러스트레이터인 ‘그림왕양치기’ 작가의 ‘약치기 짤 만들기’ 체험도 가능하다.
지난달 30일, 이번 전시의 총괄 아트 디렉터로 나선 그라피티 아티스트 제이플로우를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에서 만나 이번 행사 및 스트리트 문화와 관련한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그의 진단엔 지금 라이프 스타일의 최전선에 선 ‘요즘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점이 있었다.
―‘2020 크리에이터스 그라운드’는 최신 경향의 패션, 라이프 스타일, 음악과 춤 등을 선보인다고 했다. 요즘 엠제트 세대가 선호하는 것에 더해 한발 앞선 제안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준에서 아이템을 선정했나?
“무조건 핫한 것! 그게 기준이었다. 사실 기준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열광하고 스트리트 패션 범주에 있는 다양한 아이템들을 많이 연구했다. 관람객이 국내 스트리트 브랜드들의 새로운 행보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했다. 스트리트 문화의 울타리 안에서 사람들이 가장 신선하게 여길 만한 것들, 그리고 그런 브랜드가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단순히 걸려 있는 옷이나 소품을 구경하는 것이 아닌, 제품에 들어간 그래픽이나 행사의 배경으로 들리는 음악, 그리고 함께 진행되는 퍼포먼스 등 이런 모든 것들을 관람객이 즐겼으면 한다.”
―스트리트 패션, 스트리트 문화라는 게 뭔가?
“스트리트 패션에도 힙합 스타일, 스케이트보드 스타일, 펑크스타일 등 여러 결이 있지만, 크게 보면 이름 그대로 길거리 스타일, 가난한 흑인들의 힙합 문화 등에 원류가 있다. 1990년대 자주 얘기하던 힙합 스타일을 떠올리면 스트리트 패션과 연관 짓기 쉬울 거다. 예전에는 스트리트 패션 스타일로 입고 다니면 소수의 마니아로 치부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가 자유분방한 이미지를 앞세우며 오히려 기존의 패션 시장을 자극하는 마케팅 행보를 보인다.”
―한국에서도 스트리트 패션은 10대 혹은 마니아의 전유물이 아닌 더 넓은 연령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트리트 패션에 관심 없었던 사람도 로고 티셔츠나 스니커즈를 하나쯤 가지고 있을 정도로 대중화했다. 이런 경향이 얼마나 지속할 것으로 보나?
“이제는 스트리트 스타일로 입는 게 특이한 게 아닌 오히려 트렌드세터처럼 보이지 않나. 여러 브랜드가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와 협업하려고 하고, 스트리트 스타일의 디자인을 내놓고 있다. 스트리트 패션은 이제 하나의 장르로 자리를 잡았다고 본다.”
―이번 행사에서 직접 라이브 드로잉 퍼포먼스도 선보인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그라피티 작업을 직접 하는 건가?
“가로 6m 정도 되는 벽에 프리 스타일로 그라피티를 한다. 힙합, 타투, 패션, 음악, 스케이트보드 등 스트리트 문화와 관련한 아이콘을 두들링(doodling·낙서, 뭔가를 끼적거린다는 뜻)하는 방식으로 그릴 예정이다. 4시간 정도 진행될 것 같은데, 관객들이 오며 가며 직접 볼 수 있다. 요소들이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보며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수도 있고, 음악을 들으며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함께 즐길 수 있다.”
홍익대 인근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네어마인드’에 걸린 그라피티 작품들. 강현욱(스튜디오 어댑터)
그라피티는 미국 뉴욕 슬럼가 사람들이 특유의 낙서를 벽에 남기면서 시작된 대표적인 길거리 문화다. 2001년부터 그라피티를 그리기 시작한 제이플로우는 국내 1.5세대 그라피티 작가로 통한다. “한국에선 1990년대 후반에 1세대 작가가 등장했는데, 저는 그 계보를 이으면서 완전히 새로운 세대와의 가교 역할을 하는 거죠. 개인적으론 몇 세대가 왜 중요한가 싶은데 ‘쩜오’라고 하니 뭔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웃음).”
그라피티를 시작할 당시 그는 그림과 전혀 상관없는 교통공학과에 다니던 학생이었다. 길에서 그라피티 작업물을 여럿 접하며 “내가 더 잘 그릴 수 있겠는데”라는 자신감에서 몇 번 그려보기 시작한 것이 대학 중퇴로 이어졌고, 결국 전업 작가의 길을 걷게 됐다. 현재는 ‘스틱업키즈’(STUK)라는 글로벌 그라피티 그룹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타투이스트,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면서 스트리트 브랜드 스티그마의 대표이기도 한 그는 지포, 뉴에라 등 유명 브랜드와 경계를 넘나드는 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제이플로우의 브랜드 ‘스티그마’의 옷. 스트리트 패션. 사진 제이플로우 제공
―국내에서는 그라피티 작업 여건이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보기 드문 현장이겠다.
“그라피티가 발전한 해외에서는 길거리에서 그라피티 작업을 하는 걸 몇 번 지켜보다가 하나둘 따라 그리기 시작하면서 취미로 삼기도, 프로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한국은 우선 시시티브이(CCTV)가 너무 많고(웃음), 불법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 미처 완성하지 못한 그라피티를 본 경우가 많을 거다. 나도 옥상에 큰 합판 구조물을 세워서 그렸던 데 덮어쓰고 또 그리길 반복하면서 그린 적이 더 많다.”
―스트리트 문화가 대중화하면서 그라피티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었나? 스트리트 문화와 그라피티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인가?
“그라피티를 접할 수 있는 채널이 다양해지긴 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에스엔에스(SNS)에서 그라피티를 좋아하는 친구들을 많이 볼 수 있긴 한데, 실제로 신(문화의 한 지형) 자체가 넓어진 것 같진 않다.”
‘2020 크리에이터스 그라운드’에 참여하는 업싸이클 브랜드 ‘래;코드’. 사진 ‘래;코드’ 제공
‘2020 크리에이터스 그라운드’에 참여하는 맥주 브랜드 ‘핸드앤몰트’. 사진 핸드앤몰트 제공
―최근 몰두해서 그리는 소재는 무엇인가? 그라피티는 아무래도 시대상을 반영하는 대중 문화 아닌가.
“조금 힘을 뺀 그림을 그리고 싶다. 강하고 날카롭고 마니악한 게 원래 제 스타일이다. 대중이 좋아하지 않더라도 ‘이런 그림도 있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컸다. 그런데 직접 브랜드를 운영하며 여러 디자인, 캘리그래피 등을 옷에 적용하며 사람들의 반응을 피부로 느끼게 됐다. 예전에는 개인적으로 대중적인 작업 자체를 상업적이고 저급하게 봤는데, 막상 많은 사람이 좋아하니 그런 모습에 기분이 좋아지더라. 막 잘해야지 하면서 엄격하게 열심히 그린 것보다 그저 그리고 싶은 걸 쓱쓱 가볍게 그린 것에 더 지지를 보내는 걸 보면 그림 그릴 때 다 내려놓은 듯한 편안한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고, 그게 오히려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요소라는 생각이 들었다.”
제이플로우가 대중과 소통하는 힘이 “힘을 빼고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것”이었듯, 그가 몸담은 스트리트 문화도 오히려 힘을 빼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은 듯하다. 스트리트 문화에 대해 힙하고 다가가기는 어렵다고 여길 수 있다. 하지만 제이플로우는 “어렵지 않다”고 한다. 이번 행사에서도 많은 이들이 “자유롭고, 무엇이든 가능한 스트리트 문화의 감성을, 흘러나오는 음악에 자연스럽게 몸을 실으며” 즐기길 권했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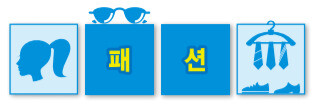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나만의 색깔로 버티며 일군 “꿈과 환상 파는 회사” [ESC] 나만의 색깔로 버티며 일군 “꿈과 환상 파는 회사” [ESC]](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3/0722/53_16899970121746_20230719503875.jpg)



![히말라야 트레킹, 일주일 휴가로 가능…코스 딱 알려드림 [ESC] 히말라야 트레킹, 일주일 휴가로 가능…코스 딱 알려드림 [ESC]](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4/0427/53_17141809656088_20240424503672.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