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박찬일 제공
[매거진 esc] 국수주의자 박찬일
남북관계가 이 모양이니 조만간 평양에서 냉면 먹기는 틀린 건가. ‘밀월’까지는 아니어도 어지간하면 통일부에다가 신청서를 하나 넣으려고 했다. ‘문화교류사업 신청평양냉면 현지 시식’ 이렇게 말이다. 초청장이 필요하면 이북의 담당부서에다가 부탁하면 되지 않을까. “난 말이요, 진짜 평양냉면을 먹고 싶어 미친 놈이오.”
평양에서 냉면 먹어본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다. 가까이는 <한겨레>의 고나무 기자가 먹어봤다고 자랑질이다. 그래, 어땠어? 그랬더니 기억이 안 난단다. 어떻게 진짜 냉면을 먹고는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을까. 그 무심한 혀로 어떻게 한때 음식담당 기자를 했을까. 진짜 냉면, 이라는 말을 했더니 이 방면의 전문가 한 분이 ‘노’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냉면은 서울 냉면이 따로 있는 거라고, 뿌리는 이북이지만 오랜 세월 서울에서 팔리면서 하나의 스타일을 만들어냈다고, 물론 이북도 세월이 흐르면서 과거와는 다른 냉면이 되었을 거라고. 기록을 찾아보니 이미 서울(경성)에서 1900년대 초반, 냉면집이 성업했다. 흔히 한국전쟁이 냉면의 남한 전파 시기로 알려져 있는데, 그 시간을 뛰어넘어 서울에서 이미 인기를 끌고 있었다는 말이다. 구한말 고종이 즐겨 먹던 냉면이 있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궁중 음식을 관장하던 관리 출신 안순환이 차린 요릿집 ‘명월관’(광화문네거리 동아일보사 자리)에 등장한다는 기록도 있다. 1915년에 나온 <부인필지>라는 책에는 아예 이 냉면을 일컬어 ‘명월관 냉면’이라고 부르고 있으니 서울 주류사회에서 널리 즐기던 요리였을 것이다.
냉면 좋아하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품는 의문점이 있다. 첫째, 함흥냉면집은 많은데 평양냉면집은 왜 적은가. 함흥식은 새로 생기는 집도 많다. 함흥식은 ‘노포’(오래된 가게)가 아니라고 해도 배척하지 않는 분위기다. 서울은 지역 어디나 한둘 잘되는 함흥냉면집이 있을 정도다. 그러나 평양식은 새로 생겼다면 ‘어디 얼마나 하나 볼까’ 하고 살짝 전투의욕(?)을 불러오는 모양이다. 웬만해서는 시장 진입이 어렵다. 새로 생기는 경우도 드물다. 봉피양냉면이 신규 브랜드로 충실하게 시장에 안착했는데, 우래옥에서 냉면을 뽑던 노주방장을 스카우트한 덕이 크다. 광명시장 근처에 정인면옥이라는 업소가 블로거를 통해 창업 2년 만에 알려졌다. 방문해서 인터뷰했더니 주방장이 오류동 평양냉면집 자손이다. 오류동 평양냉면은 중앙 무대(?)에서는 덜 알려져 있지만 지역에서는 노포로, 맛집으로 자리 잡은 집이다.
빨갛고 매우며 달콤한 양념이 주가 되는 함흥식실제 함흥과는 별 상관이 없는 남한 고유 레시피다. 이북에서는 함흥냉면을 시원한 육수에 만다은 맛을 내는 맥을 잡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다. 그러나 평양식은 그렇지 않다. 냉면광이라고 자처하는 내가 실험해봤다. 우선 메밀을 다루기 어렵다. 메밀 백퍼센트 면을 흔히 ‘순면’이라고 부른다. 순 메밀가루를 사서 반죽한다. 삶았는데 가관이다. 들어갈 때는 ‘면’이었는데 나올 때는 ‘수제비’다. 글루텐이 아주 적은 메밀의 특성 때문이다. 수분을 적게 해서 반죽, 압출식으로 강력하게 뽑아야 그나마 면이 된다. 이것은 기계로 해결할 수 있다고 치자. 그러나 육수가 문제다. 이북의 냉면 책무려 수령님이 인민의 복리를 위해 냉면을 널리 가르쳐주셨다는에 있는 대로 해봤다. 소, 돼지, 닭이 대략 ‘4-4-2’로 섞여 있는 레시피다. 그러나 4-4-2 전법은 실패다. 레시피에 당당히 써 있는 ‘맛내기’(MSG)를 넣지 않아서일까. 넣어보니, 음 비슷하긴 하다. 그러나 이것도 아니다. 우래옥이나 을지면옥식의 맑으면서도 순수한 느낌의 육수가 나오지 않는다. 명색이 이탈리아 요리사이니, 육수를 맑게 뽑을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한다. 계란 흰자를 풀어서 불순물을 흡착한다. 훨씬 나아진다. 그러나 그 ‘띵하고 찡한’ 육수는 안 나온다. 치맛살로 불리는 양지머리의 부위로 해야 한다고 해서 실행해본다. 맛이 좋다. 그런데 육수 재료비만 1인분에 2만원 정도 나온다. 겨울 동치미를 담가서 섞어도 본다. 동네 막국수 수준은 되는데, 고아한 평양냉면은 어림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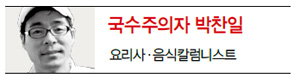 참 새로 생겼는데, 제대로 된 냉면집이 하나 있다. 분당의 능라(사진)다. 이미 소문이 나서 자리가 없다. 사장(김영철)의 로망이 냉면을 제대로 뽑는 것이었다고 한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냉면답게 만든다. 그는 요리사 출신도 아니다. 돈 잘 버는 회사 사장님에서 변신했다. 오직 냉면이 좋아서였다고 한다. 부친(평양고보 출신)의 핏줄 때문일까. 그의 냉면을 한 젓가락 들고, 육수를 들이켜니 ‘쩡’하다. 난 뭐야, 난 뭐냐고. 역시 냉면도 진골(평양 출신 내력)이 만드는 것일까. 능라(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031-781-3989).
박찬일 요리사·음식칼럼니스트
참 새로 생겼는데, 제대로 된 냉면집이 하나 있다. 분당의 능라(사진)다. 이미 소문이 나서 자리가 없다. 사장(김영철)의 로망이 냉면을 제대로 뽑는 것이었다고 한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냉면답게 만든다. 그는 요리사 출신도 아니다. 돈 잘 버는 회사 사장님에서 변신했다. 오직 냉면이 좋아서였다고 한다. 부친(평양고보 출신)의 핏줄 때문일까. 그의 냉면을 한 젓가락 들고, 육수를 들이켜니 ‘쩡’하다. 난 뭐야, 난 뭐냐고. 역시 냉면도 진골(평양 출신 내력)이 만드는 것일까. 능라(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031-781-3989).
박찬일 요리사·음식칼럼니스트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ESC] ‘생조당원’ 추천! 비싼 생선 이렇게 드시라! [ESC] ‘생조당원’ 추천! 비싼 생선 이렇게 드시라!](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0/1009/53_16022074481404_20201008503887.jpg)


![[ESC] 내게 맞는 단발머리는?···맞춤공식 알려주마 [ESC] 내게 맞는 단발머리는?···맞춤공식 알려주마](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resize/2018/0301/151981975651_20180301.webp)
![‘담뱃재와 소독약’ 아드벡의 강력한 풍미…호불호 갈리지만 [ESC] ‘담뱃재와 소독약’ 아드벡의 강력한 풍미…호불호 갈리지만 [ESC]](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4/0313/20240313503960.webp)
![[ESC] 에로영화, 패러디 제목 총정리 [ESC] 에로영화, 패러디 제목 총정리](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resize/2017/0803/00501968_20170803.webp)
